[소설기법의 인물스토리 人生劇場] 다큐영화 ‘바람커피로드’ 여행자 이담씨
|
| 통돌이 로스터로 직접 생두를 볶아 지인과 한잔의 커피담론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단다. 그에게 커피는 ‘자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
|
| 마산 스페이스 1326 갤러리에서 행한 커피토크 참석자와 기념촬영 장면. |
|
| 이담의 커피인문학적 기행담론이 담겨진 책 ‘바람 커피 로드’. |
세계 최고의 커피 나라인 에티오피아. 그들은 자기 집을 방문한 이에게 그들만의 커피 세리머니를 행한다. 바로 ‘분나 마프라트’다. 전통의상을 입고 생두를 화로에 올려 볶고 그걸 절구로 빻아 손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나도 풍만과 함께 주유천하하면서 이담식의 커피의식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남들 만큼만 살았던 청년기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서울서 나고 자라 2003년 미련없이 훌쩍
늘 나를 만든 건 9할이 바람이라 여겨
제2의 삶은 바람이 푸짐한 제주서 시작
그곳 바람에 영혼의 상처까지 아물 즈음
커피를 알게 되며 몇몇 카페도 운영해
2013년 트럭 마련…‘커피여행가의 삶’
현진식 감독의 다큐·허영만 만화에 소개
여행길 만난 사람들을 담은 책 내기도
“커피는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생각
쓰고 달고 신 오묘한 맛과 향으로 나눠”
◆난 원래 IT 1세대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양대 생물학과를 다녔다. 84학번이다. 실험에서 실험으로 점철된 내 학창시절. 쉬 지쳐갔다. 1학기 시험을 보고나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왜 대학에 왔지.’ 엉망진창이 된 내 성적을 본 학과장이 부모까지 호출했다. 어찌어찌 졸업을 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스 기능을 좀 잘 안다는 이유로 난 헬로우PC, PCWEEK, 웹비즈니스 등 몇몇 컴퓨터 전문 잡지사를 전전한다. 1991년부터 10년간 하이텔, 누리텔, 삼보컴퓨터 등 국내 IT 1세대와 눈높이 대화를 했다.
초기 인터넷 지식을 갖고 ‘솔트 앤 페퍼’란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업체를 창업했다. 사무실은 국내 IT기업이 몰려들기 시작한 강남 테헤란로에 있었다. 하지만 국내 벤처기업은 퇴조기. 투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데리고 있던 직원만 20여명.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3년간 버티다가 백기투항을 해버렸다. 2003년이었다. 서울은 내겐 더 이상 살 수 없는 공간이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난무하던 바람만이 나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 무렵 서울에 질려 제주도로 망명하는 드리머가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급히 입을 옷 정도만 챙겨 제주도로 떠났다. 처음에는 애월읍에 있는 곽지해수욕장 근처에 터를 잡았다. 무진장하게 불어오는 비바람은 내 상처를 예쁘게 치료해주었다. 당시엔 이렇다 할 만한 게스트하우스·올레길도 없었다. 홀가분한 여행자의 즐거움을 난 혼자서 만끽했다.
슬금슬금 몸이 근질거렸다. 그렇게 시작한 게 ‘제주뽐뿌’란 블로그 관리였다. 은둔의 글, 가끔 멋진 사진, 후미진 길에서 만난 맛집 정보 등을 올렸다. 하지만 제주도 토박이와 사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제주도는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육지것’으로 폄훼했다. 몇몇 제주도 토박이를 통해 제주도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제주 버킷리스트’란 책도 낼 수 있었다. 가끔 워킹홀리데이식으로 여행 오는 친구들이 그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애월읍 한담리에 ‘제주여행자센터’를 만들었다. 2006년이었다. 그 센터는 원래 카페 자리였다. 여행사 친구, 화가 등 3명이 ‘커핀그루나무’란 카페를 차린다. 인연의 복잡함을 모두 접고 나만의 다른 공간을 찾아다녔다. 제주시 아라동 5·16도로 입구, 제주대 근처에 있는 ‘산천단’이 눈에 들어왔다. 길가에선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다. 남도답사문화를 이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제주도에 와서 맨처음 봐야 될 공간으로 지목한 기운 드센 데가 바로 거기다. 거기 명물은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나무 군락과 대숲.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서울에서 상처 입은 내 영혼에겐 더없이 절실한 공간이었다. 3년간 그 기운과 동고동락하면서 점차 커피여행가로서의 삶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기본 수련이 끝남과 동시에 난 산천단 옆에 대담하게 ‘바람카페’를 오픈했다. 이 카페는 옐로그린을 주조색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테이블도 5개만 놓았다. 오직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커피머신 대신 통돌이란 자작 로스터기를 사용했다. 성스러운 곳에 차린 카페라서 토박이의 시선은 호의적일 수가 없었다. 나에 대한 험담도 난무했다. 하지만 이 또한 바람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통과의례라 여겼다.
정말 제주도 일은 멀리서 보면 천국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지옥이다. 영업이 그런대로 굴러가는 기간은 반년 정도. 나머지는 비수기라서 손님없이 혼자 커피와 뒹굴대는 게 다반사였다. 다행히 이렇다할 만한 핸드드립 카페가 없던 시절이라 제주로 오는 여행객한테서 먼저 입소문이 났다. 제주도 망명파들의 각종 모임장소로도 곧 정착된다.
◆제주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떠돌다
전북 진안에 사는 김현두라는 친구가 바람카페로 놀러왔다. 그는 나보다 앞서 커피여행자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커피트럭에 감동을 받았다. 나도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다. 인터넷을 통해 푸드트럭을 검색해봤다. 마땅한 게 없었다. 어렵사리 서울 여의도에 방치되고 있던 한 커피트럭을 1천만원에 인수할 수 있었다. 그 트럭은 1t급 봉고 프런티어 탑차였는데 조금 더 치장했다. 노랗게 덧칠했다. 바람의 이미지를 살려 로고와 이름을 그려넣었다.
내가 처음 풍만을 끌고 제주도를 떠난 건 2013년 7월10일. 인천항으로 향했다. 내 여정의 첫 행사는 서울 홍대 앞에서 펼쳐졌다. 통영에 있는 서점 ‘남해의 봄날’에서 펴낸 ‘서울을 떠난 사람들’(공저) 출판기념회를 겸했다. 나는 그 책에서 제주도편을 적었고 그 인연 때문에 그날 난 주자창에 트럭을 세우고 커피를 팔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커피트럭은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불법트럭으로 단속대상이다. 그래서 대로변에선 판매를 할 수 없다. 내 트럭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근처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커피여행은 8월 파주와 의정부·부천·광주, 9월에는 진주와 통영·거제·마산·창원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13년의 겨울을 맞았다.
2014년 봄까지 난 제주도에서 동면을 취했다. 풍만도 새롭게 단장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너굴양이 메뉴판 작업을 새로 해줬다. 나의 출발은 항상 쉽다. 일회용 종이컵과 볶을 10여종의 생두 리스트, 티셔츠와 속옷 정도만 챙기면 끝. 커피트럭에는 20㎏ 정도의 생두를 종류별로 싣고 다닌다. 커피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통돌이로 커피를 볶아서 사용한다. 한번 볶은 커피는 2~3주를 쓸 수 있다. 4월16일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진도로 갔다. 여행을 잠시 중단했다.
◆나의 다큐영화, 바람커피로드
대구는 유달리 커피가 강하다. 안명규 등 커피 고수가 수두룩하다. 커피명가, 다빈치, 시애틀의 잠못이루는밤, 핸즈커피, 모캄보 등 체인 브랜드도 짱짱하다. 하지만 커피도시로서의 인지도는 낮은 것 같다.
대구로 갔을 때 ‘더 스타일’이란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김성훈을 만났다. 그는 1층 공간을 내주고 모임도 열고 커피를 팔 수 있게 해줬다. 이후 수성구 두산동 ‘커피 커뮤니티’ 카페도 방문했다. 경주에서는 ‘딥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커피값은 얼마로 할까?’ 고민하다가 5천원으로 정했다. 트럭커피 치고는 비싼 편이다.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좋은 손님을 고를 수 있는 일종의 ‘관문’ 같은 것이다. ‘5천원 내고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아는 이’라고 생각했다. 하루에 10잔 팔면 5만원. 트럭에 기름 넣고 두 끼 식사, 잠을 잘 수 있다. 운이 좋아 30만원어치를 팔면 일주일 정도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어느 날 낯선 메일이 날아 들었다. 현진식 감독이 보낸 러브콜이었다. 커피여행을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현 감독은 제주도가 고향이다. 그도 내 제주도 바람카페의 손님. 그때 내 커피에 적잖이 감동했고 후에 내가 전국을 커피여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다. 그렇게 2년간 영화촬영이 진행됐다. 그 인연 덕분에 허영만의 만화 ‘커피 한잔 할까요’에도 소개된다. 이럭저럭 난 유명병에 감염되고 있었다.
누가 묻는다. 커피가 뭐냐고? 난 ‘코프리(COFREE)’, 아니면 ‘고프리(GOFREE)’로 본다.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 자유에 이르는 길. 커피란 말 안에는 뭐 대충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커피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담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처지와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극과 극이다. 시큼하기도 하고 향긋하기도 하고 떫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많은 맛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맛은 바로 ‘쓴맛’이라고 본다. 단맛만 섬길 수 없다. 그 단맛은 그 옆에 쓴맛이 섞여야 제 맛이 난다.
언제 내 여행이 끝날지 나도 모른다.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고 불러도 간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배울 수 없듯 커피란 것도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 그냥 찾아가는 그 어떤 것이다.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각자의 몫이겠지.
전국을 떠돌다가 폭염기·폭한기가 되면 난 ‘혈거인’으로 돌변한다. 제주시내에 있는 ‘커피동굴’이란 카페로 잠수 탄다. 이제 제주도는 개발의 도시로 전락한 것 같다. 최성원, 이효리, 장필순, 윤영배 등 유명가수가 진을 쳤고 올레 특수도 일었다. 숱한 리조트와 펜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겐 머물기 힘든 섬이다. 가난한 섬 제주도였으면 좋겠는데….
글·사진=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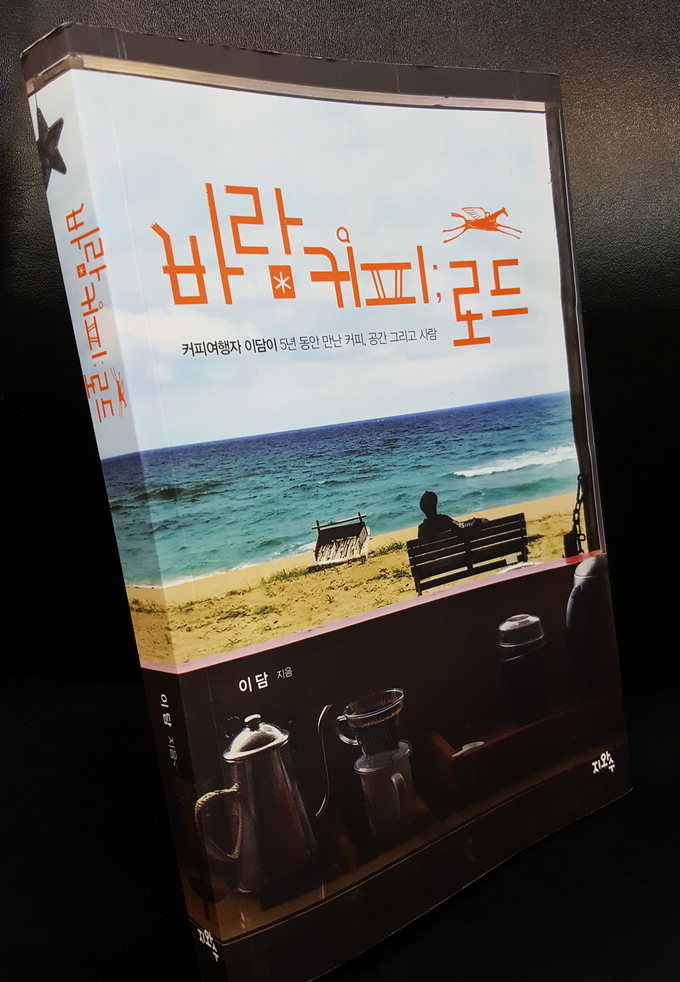






![[영상뉴스] 대구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등 4개 대규모 노후주택지 통개발](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1800153522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