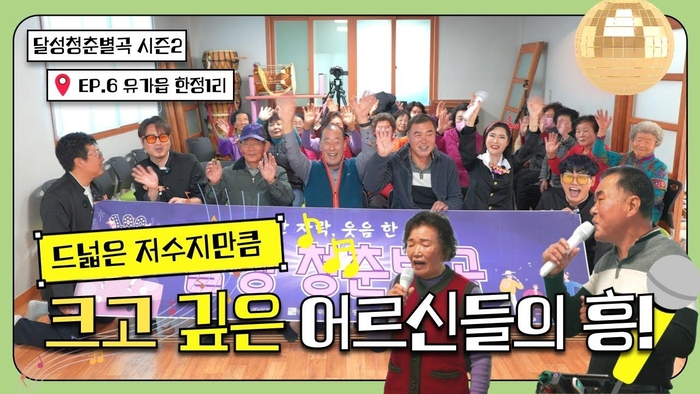|
|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1호)의 현판 ‘대웅보전(大雄寶殿)’. 이 현판 글씨는 신라의 명필 김생(711∼791)이 쓴 것으로 전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현존 우리나라 현판 중 가장 오래된 글씨 현판인 셈이다. |
우리의 옛 건물에는 건물의 이름이나 그 성격, 위상 등을 담은 현판(懸板)이 걸려 있다. 궁궐은 물론 서원이나 누각, 사찰 건물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양한 현판을 걸어놓고 있다. 사대부 집안의 고택도 마찬가지다.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판의 글씨는 역대 왕을 비롯해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이나 명필 등이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이다. 따라서 현판은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은 물론 예술의 정수가 담겨 있는 보고라 할 수 있다. 현판 중에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이 쓰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제대로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데다 서예에 대한 식견 부족으로 일반인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옛 현판들이 이처럼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현판, 이야기가 있는 현판을 찾아 거기에 담긴 흥미로운 사연, 건물과 글씨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격주로 연재할 이 연재기사를 통해 현판에 담긴 옛 사람들의 삶과 예술의 향기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대의 정신·예술의 정수 담겨 있는 寶庫
우리나라선 삼국시대부터 새겨 걸기 시작
공민왕·한석봉 등 당대 명필가 秀作 남겨
◆ 현판 의미와 역사
현판의 의미에 대해 사전에는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에 거는 편액(扁額)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편액과 주련(柱連)을 총칭한다. 간단히 말해 편액은 건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표지이고, 주련은 건물의 기둥에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거나 새겨 거는 것을 말한다. 주련은 글귀를 이어 기둥에 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렸다.
편액의 역사는 중국 진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진(秦)나라 때 문자를 통일하면서 글자체나 용도에 따라 8가지 서체(八書)로 정리했는데, 그중 여섯번째인 ‘서서(署書)’가 제서(題書), 방서(榜書) 등에 쓰인 서체였다. 즉 건물의 명칭 등을 쓰는 데 사용했던 편액 글씨였던 것이다.
한(漢)나라 고조(高祖·재위 BC 206∼BC 195) 6년에 소하(蕭何)가 ‘창룡(蒼龍)’ ‘백호(白虎)’라는 서서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서체는 전서(篆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晉) 이후에는 해서가 주로 사용되어 편액은 대해(大楷)로 썼다.
삼국 중 위(魏)나라의 위탄(韋誕)이 능운대(凌雲台)의 제액(題額)을 쓴 기록이나, 동진(東晋)의 왕헌지(王獻之)가 태극전의 액자(額字) 의뢰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고사 등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문선 등 각종 문헌에 편액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 건물은 물론 도성의 문루, 궁궐의 전각, 지방관아와 향교, 서원, 일반주택 등에까지 편액이 걸렸다.
현판은 주로 나무 널판지를 사용하고, 건물의 규모나 성격에 맞게 색채와 장식을 더하기도 했다. 글씨는 금니, 은니, 먹, 호분 등을 쓰며 바탕색은 글씨의 색을 고려해 칠을 하거나 그냥 두기도 했다. 현판 중 편액은 또한 보통 다양한 틀(테두리)을 만들어 거기에 문양을 새기거나 색채를 가하기도 한다. 편액은 대부분 건물의 명칭을 담은 건물의 얼굴이므로, 건물의 정중앙 처마 아래에 부착한다. 물론 누각이나 정자 등의 건물 내부에도 건물을 상징하는 글귀 또는 좋은 글귀 등을 담은 현판을 걸었다.
◆ 다양한 서체의 현판 글씨
 |
| 많을 때는 시판(詩板)을 포함해 300여개의 현판이 걸려 있었다는 영남루(경남 밀양시 내일동). 이런 누각은 누대에 걸쳐 많은 문인(文人)과 명필이 글씨나 시 현판을 남겨 ‘현판 경연장’이라 할 만하다. |
편액에 쓰이는 한자 글씨는 액체(額體)라고도 하는데, 굵은 필획으로 써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글씨 짜임새가 긴밀하고 필획은 방정하면서도 강건한 글씨여야 하기에 주로 해서(楷書)를 많이 썼다.
편액 글씨체로 원나라 승려 설암(雪庵) 이부광(13세기)의 글씨가 고려말에 수용된 이래 공민왕을 비롯해 많은 이가 설암 서법을 따랐고 편액에도 애용되었다. 설암은 안진경과 유공권의 글씨를 배워 특유의 해서 서법을 이루었다. 특히 그의 대자(大字)는 조맹부의 송설체와 더불어 편액 글씨로 널리 사용되었다.
명말청초의 학자 도종의(陶宗儀)가 지은 ‘서사회요(書史會要)’에는 설암 이부광에 대해 “글씨와 그림은 신품의 경지에 올랐다. 그의 서법 학문은 안진경(顔眞卿)과 유공권(柳公權)에서 나왔으며, 해서·행서·초서를 잘 썼다. 큰 글씨는 더욱 잘 썼다. 조정의 편액은 다 그의 글씨”라고 적고 있다.
설암체는 편액 글씨체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유행했다. 궁궐은 물론 전국 곳곳에 전하는 사찰, 서원 등 편액에서 설암체의 서법을 만나볼 수 있다. 설암의 대자 글씨 설암체는 그의 ‘병위삼첩(兵衛森帖)’‘춘종첩(春種帖)’ 등에 전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에는 “새로 간행한 ‘설암 법첩’을 종친, 의정부, 육조, 집현전 등의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조선 초기부터 설암의 대자 글씨가 널리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암헌(巖軒) 신장(申檣·1382∼1433)이 특히 편액 글씨에 뛰어났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장은 대자(大字)를 잘 썼다. 세종께서 예전에 설암이 쓴 위응물(韋應物)의 ‘병위삼화극연침응청향(兵衛森畵戟宴寢凝淸香)’이란 서첩을 얻었는데 ‘병위삼’ 세 글자가 떨어져 나간 것을 신장에게 명하여 보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의 편액글씨로 ‘임씨가묘(林氏家廟)’가 남아 있다. 공민왕, 이황, 한석봉, 송시열 등 많은 이가 설암체 편액글씨를 남기고 있다.
물론 현판 글씨로 해서 외에도 전서와 예서, 행서, 초서 등 다양한 글씨체가 사용되었다.
글·사진=김봉규기자 bgkim@yeongnam.com
뛰어난 사료적 가치에도 국가문화재 하나도 없어
 |
| 현판 중 유일하게 문화재(서울시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돼 있는 서울 봉은사 ‘판전(板殿)’ 현판. 추사 김정희가 별세 3일 전에 남긴 글씨 작품이다. |
역대 제왕이나 당대의 명필·문인의 필적이 담긴 편액은 건물의 품격을 높이는 화룡점정의 작품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가 없다. 현판에는 당대 예술의 정수가 담겨 있고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역사, 아름다운 일화 등이 담겨 있어 더없이 소중한 문화유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판은 건출물이나 그림, 도자기 등과는 달리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편액 중 가장 오래된 글씨로, 신라의 명필 김생(711∼791)이 쓴 것으로 전하는 공주 마곡사의 ‘대웅보전(大雄寶殿)’ 편액이 있다. 물론 현재의 편액 자체는 당초의 원본은 아니고 여러 번 복각을 거친 것일 수 있겠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그의 글씨를 집자했다는 ‘만덕산 백련사(萬德山 白蓮社)’ 편액도 강진 백련사에 전하고 있다.
공민왕 글씨로 전하는 부석사 ‘무량수전(無量壽殿)’과 안동 ‘영호루(映湖樓)’ 편액도 더없이 귀중한 유산이다. 이러한 왕의 어필 편액을 비롯해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창암 이삼만 등 당대 최고 명필의 편액 작품도 전국 사찰 건물 곳곳에 걸려 있다
누각과 서원, 정자, 명문가 고택 등에도 흥미로운 사연이 담긴 현판 문화재가 즐비하다. 영남루(밀양), 죽서루(삼척) 등 누각은 특히 현판의 경연장이라 할 정도로 누대에 걸쳐 수많은 명필과 시인묵객의 오랜된 필적이 전해오고 있다. 시대별로 현판의 모양이나 장식 등도 차이가 있어 그 시대의 특징을 잘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 현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판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 지방문화재로도 유일하게 추사 글씨인 봉은사 ‘판전(板殿)’만이 서울시유형문화재 제84호(1992년)로 지정돼 있다.
옛 현판은 목재여서 오래 보존되기가 어려운 문화재이나 다행히 역대 왕과 명필 등의 소중한 필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선조들은 그 귀중한 가치 때문에 해당 건물이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소실되거나 파괴될 때 우선적으로 현판만이라도 구하고 보전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덕분에 당시의 건물은 없어져도 현판만은 지금까지 보전해 올 수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현판 글씨, 특히 편액 글씨는 금석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자 글씨의 특별한 서체와 서풍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어 더욱 소중한 문화재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체계적 분석·정리가 되지 않아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봉규기자 bg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