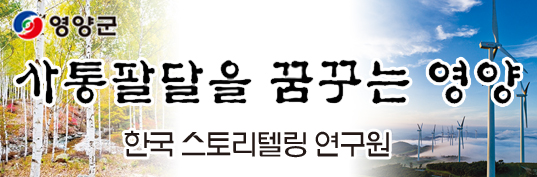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16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삼성-두산전을 앞두고 삼성 치어리더 조정영(왼쪽)과 이소영(오른쪽)이 팀 동료 이연주의 머리 매무새를 다듬고있다. |
치어리더가 없는 한국 프로야구는 상상하기 힘들다. 흔히 치어리더를 ‘그라운드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경기장 분위기를 살리는 ‘그라운드의 산소’에 더 가깝다. 프로야구 9개 구단 중 최고 명문인 삼성 라이온즈 소속 치어리더는 역시 최고의 프로들일까? 대답은 예스다.
삼성 치어리더는 <주>놀레벤트 소속의 4명이 전부다. 8년차 베테랑인 조정영씨(27)를 비롯해 이연주(28)·이소영씨(24), 막내 장혜원양(19·경신정보과학고)으로 구성돼 있다. 이소영씨만 제외하고 모두 대구 출신이다. 소수정예로 구성된 만큼 팀워크가 탄탄하고, 최강 삼성의 치어리더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하지만 마냥 화려하고 밝을 것 같은 치어리더의 세계는 땀과 고난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애환을 듣다 보면 눈물겹기까지 하다. 삼성 치어리더,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춤으로 시작해 춤으로 끝나는 일과
삼성 치어리더의 일과는 녹록지 않다. 경기가 있는 날엔 정오까지 사무실(두산동 TBC 건물)로 출근해 3시간 정도 안무 연습에 열중한다.
한 경기당 평균 15곡을 소화하는데 방송댄스가 10곡, 응원가가 5곡 정도다. 다른 치어리더팀에 비해 2~3곡이 많은 만큼 준비할 것도 많다. 또한 시즌 중에도 인기 있는 신곡이 나오면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새로운 안무도 준비해야 한다.
팀의 리더인 조정영씨는 “관중이 싸이의 젠틀맨이나 포미닛 등 걸그룹 노래를 좋아해서 신곡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며 “개막 전에는 새로운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습을 마치면 바로 경기장으로 향한다. 보통 경기 시작 2시간30분 전에는 야구장에 도착해야 한다. 야구장에서도 할 일은 많다. 화장을 하고 안무도 다시 맞춰 보고 옷매무새도 정리한다.
무대 의상은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입는다.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보통 의상은 경기당 한 번 정도 갈아입는데, 특별공연이 있는 날은 세 번까지 교체하기도 한다. 홈경기 땐 대기실이 있어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지만, 원정경기에 나서면 별도 공간이 없어 모든 게 여의치 않다. 때론 사람들이 북적이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야간 야구경기가 끝나도 공식적인 일과는 밤 11시가 넘어야 마무리된다. 관중이 모두 떠난 뒤 각종 소품과 의상 등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밤늦게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새벽이다. 잠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야구시즌이 끝나면 다시 농구나 배구에서 치어리딩을 또 이어간다.
 |
|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왼쪽부터 이연주·이소영·조정영·장혜원)와 김상헌 응원단장이 최근 서울 잠실구장 원정석에 앉아 응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삼성 제공> |
◆치어리더로서의 애환과 보람
야구는 실외 경기다. 날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물론 치어리더도 예외는 아니다. 응원석 단상에서 비바람과 추위, 더위와 싸운다.
베테랑인 조정영씨조차 “4월이나 10월엔 추울 때가 많다. 하지만 더운 것보다는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워낙 운동량이 많다 보니 체온도 금방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난다. 더울 때가 가장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프로스포츠 중 야구는 응원단상이 좁아 늘 불편하다. 농구·배구의 경우 넓은 코트 위에서 치어리딩을 하기 때문에 애크러배틱이나 스트레칭 등 큰 동작의 안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면, 야구는 동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무가 방송댄스 위주로 짜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몇몇 구장의 원정석 단상은 좁고도 높기까지 해 위험하다. 실제로 치어리더가 단상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치어리더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남성의 부담스러운 시선에서부터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까지 ‘진상’도 많다.
조씨는 “술을 과하게 먹고 추태를 보이거나, 욕을 하는 관중도 있다. 그럴 땐 정말 힘들다. 또 우리팀이 4명뿐이라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단상에 서야 할 때는 서럽다”고 털어놨다.
치어리더가 힘든 직업이지만 좋은 점도 있다. 조씨는 “운동량이 많아서 따로 몸매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긴 시즌 동안 체력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잘 먹어야 한다. 잘 먹는 게 체력 관리의 비결”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삼성 치어리더로서의 자부심도 높았다. 2005년 치어리더로 입문했다는 조씨는 “치어리더가 되자마자 그해 삼성이 정상에 올랐다.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했는데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다. 물론 2011년과 2012년에 2연패했을 때도 자랑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경기장에 갈 때마다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새로운 얼굴들
지난해까지 SK 와이번스 치어리더였던 이소영씨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를 삼성으로 옮겼다. 경기도 포천이 고향인 이씨는 “평소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라서 오게 됐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 생활도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었다”며 소속사를 옮긴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한양여대 입학 당시 치어 시범단 특기생으로 합격했고, 2010년 넥센 히어로즈에 스카우트됐다. 넥센 시절엔 학업을 병행해야 했기에 무대에 서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듬해 그는 ‘치어 콕’이란 걸그룹 멤버로 데뷔해 디지털 싱글 앨범도 냈다.
초등학생 시절에 테니스 선수를 꿈꿨다는 그는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해 입상할 정도로 끼가 넘친다. 야구 치어리더 외에도 전주 KCC 이지스 응원단, LIG 손해보험 그레이터스 응원단, GS칼텍스 서울 KIXX배구단 응원단 등을 두루 거쳤다.
좋아하는 삼성 선수로는 오승환과 안지만을 꼽았다. 이씨는 “오승환은 무심하면서 무뚝뚝한 게 매력이며, ‘힙합보이’ 안지만은 귀여운 구석이 있다”고 그들의 매력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구 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대구까지 내려온 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소영씨와 함께 올 시즌 삼성에 합류한 장혜원양은 보기 드문 여고생 치어리더다.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 야구장에 자주 갔다는 장양은 “아직 치어리더란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특히 개막전 때는 연습할 때와 분위기 자체가 틀리다 보니 떨렸고 조금 무서웠다”며 “지금 다니는 학교와 응원단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아직은 배울 것도 많고 서툴러서 힘들지만, 치어리딩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야구팬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달성청춘별곡] Ep.04 달성군 옥포읍, 101세 어르신 계신 행복한 장수마을에서 노래 한바탕 부르고 왔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7/news-m.v1.20250725.84d4b47427214394bde4ddf3ba743efd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