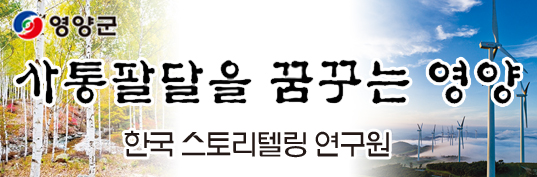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박재락의 풍수로 본 명당] 성묘(省墓)와 이장(移葬)의 발복차이](https://www.yeongnam.com/mnt/file/201409/20140905.010360802280001i1.jpg) |
올해는 9월에 ‘윤달’이 들어있기에 10여일이나 이른 추석을 맞게 됐다. 이맘때면 선영의 벌초나 묘소관리로 이장을 종종 거론한다. 신문광고란에도 연일 윤달에 이장을 하면 자손들에게 해가 없다는 식의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이장(移葬)은 산소를 옮기는 것이다. 윤달이 있는 해에는 파묘를 하거나 산소를 옮기면 자손에게 해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낭설이다. 옛부터 이장은 신중을 기했다. 산소는 선조가 영면하고 있는 공간이며 영혼이 후손을 반기는 상징 공간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벌초와 성묘, 또는 묘사 때마다 후손들과 조상을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예로부터 묘역 공간을 이장해야만 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한정돼 있었다.
첫째는 왕릉 터를 조성하는 공간에 편입되는 경우, 둘째는 읍성의 공간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묘역공간으로 도로가 계획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국사의 일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현실적으로 매장보다 화장이 대세이므로 차후 관리차원에서 납골당에 모시기 위한 경우이고, 지금의 산소가 수맥(水脈)이 지나가는 흉지(凶地)이므로 집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술사들이 부추겨서 하는 경우다. 다음은 묘역공간이 멧돼지 등에 의해 자주 허물어지는 경우다. 묏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상의 영혼이 자손에게 이장을 하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술사들이 부추긴다. 이장의 필요성과 묘역 공간의 상태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변하는 추세이므로 관리 차원에서 납골당으로 옮기는 경우다. 이것은 자신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 선영의 벌초와 성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묘역 공간은 조상의 영혼이 편안히 머무는 유택인데, 이곳을 허물어 버리고 자신들은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겠다는 것과 같다. 선영을 가진 문중은 우리나라에서 불과 5% 내외다. 이장을 고집한다면 발복을 걷어차는 꼴이다.
둘째, 수맥이 흘러 광중(壙中)의 시신이 물에 차기 때문에 후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다. 묘역의 공간이 경사면에 있는지, 수풀이 다른 묘역보다 많이 자랐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곳이라면 수기(水氣)가 많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수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풍수비보를 해야 한다. 제례 공간의 앞쪽 경계면을 이루는 경사 공간에 백일홍이나 향나무를 3m 간격으로 심으면 좋다. 이것은 목극토(木剋土)의 오행상극에 의해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종은 수기를 빨아들인다. 오행상 토극수(土剋水)가 되면서 물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백일홍과 향나무는 관목 형태로 식수해야 하며, 4월 청명~8월 처서 전이 좋다.
셋째, 산소의 주변 묘역 공간에 잔디가 물기를 머문 것처럼 축축하게 나타나는 경우다. 이때 맥문동을 깔아주면 한 해가 지나 뽀송뽀송해진다. 풀이 잘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두세 번 벌초를 해야 한다.
넷째, 봉분 윗부분과 옆부분이 훼손된 경우다. 산짐승 중에서 주로 멧돼지가 주범인데, 성묘를 한 뒤 봉분 주변으로 음복주(주로 막걸리나 소주)를 뿌렸기 때문이다. 멧돼지는 감자나 고구마를 좋아하기에 밭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에도 전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술을 뿌리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나프탈렌(일명 ‘좀약’)을 묘지 주변과 봉분에 골고루 뿌려주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장만이 대세가 아니다. 왜 가만히 있는 묘를 옮기려 하는가. 조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는지를 벌초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격랑의 대선, 어디쯤 와 있나··후보별 급소 전격 해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20.676d024eeb09422197dfc37303a8e9ab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