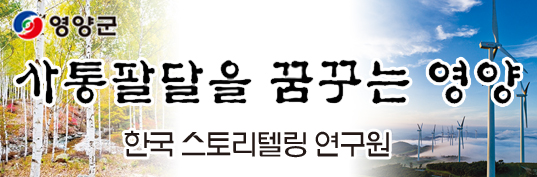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간이역, 그곳’은 중부내륙 관광열차(O-트레인과 V-트레인)가 경유하는 경북지역 주요 간이역의 변천사와 서민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이다.
 |
| 영주역 플랫폼으로 열차가 들어서고 있다. 영주역은 지금도 경북선과 영동선, 제천, 안동, 부산, 강릉, 청량리 방면으로 가는 여객열차의 중간역이자 시종착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
#1. 물길을 돌려라!···신영주의 탄생
그(박정희 소장)가 떠난 며칠 뒤, 영주수해지구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성가 장군이 도착했다. 쑥대밭 같던 시가지의 길들과 농지들이 복구되었고 향교골(행짓골)에는 수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건주택이 지어졌다.
동시에 서천수로 직강공사가 시작됐다. 공사에는 육군 제133공병대대와 해병대 제1상륙사단 공병대 등 군인 700여명이 투입되어 262일 만인 1962년 3월30일 역사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31일에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송요찬 내각수반, 주한 유엔군 사령관과 외교 사절단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
| 1962년 3월30일 서천수로 직강공사 준공식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 1961년 7월 영주 전역을 휩쓴 대홍수 이후 수해복구를 위해 직강공사가 시작됐고, 이날 준공식에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해 내각수반, 주한 유엔군 사령관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옆에 앉은 이성가 소장과 버거 주한미국대사, 멜로이 유엔군 사령관을 돌아보며 “민간공사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그것도 공기를 1년 앞당겨 군이 해냈다”며 웃음을 지었다.
“박 장군이 그래 활짝 웃는 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본적이 없는 기라.”
그날을 기억하는 한 노인에게 수해복구는 ‘그의 웃음’으로 기억된다.
1962년 5월에는 경북선의 구 노선을 바꾸어 점촌과 예천, 영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한다. 경북선은 1966년 10월10일 완공, 11월9일 영업을 시작했다. 이로써 중앙선과 영동선이 경북선을 통해 경부선과 연결되었다.
사람들과 물류 이동의 대부분을 기차에 의존하던 50∼60년대.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이 교차하는 그 중심에 영주역이 서게 된 것이다. 물길의 이동은 길을 변경시켰고 도시의 중심을 바꿔놓았다. 원래의 물줄기 자리에는 새로운 시가지, 신영주가 탄생했고, 1967년 12월20일에는 새로운 영주역이 휴천동에 준공되었다.
#2. 영주동···역전통의 전성시대
 |
| 1941년 영주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영주역은 새로운 시가지가 생기면서 1973년 12월 23일 지금의 휴천동 자리로 옮겼다. |
영주동의 영주역은 1973년 휴천동으로 역사를 이전하기까지 호황을 누렸다. 열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역 마당은 인근 식당들과 지게꾼들의 호객소리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를 광고하는 영주극장 하꼬차의 확성기 소리가 뒤섞여 북새통이 되었고, 일거리를 찾아 흘러들어온 뜨내기 일꾼들과 토박이들 사이의 알력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인근의 안동, 상주, 단양의 목수들은 달랑 장도리 하나만 들고 와 목돈을 벌어 떠나기도 했지만 도회지에서 막노동이나 식모라도 해보겠다며 도망치듯 밤차를 타고 떠난 이들도 있었고, 가솔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암면(광산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탄 이들도 많았다.
‘개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탄광 지역의 호경기 덕을 가장 톡톡히 본 곳이 영주였다. 당시 영주의 부자들 대다수는 탄광 지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부를 이루었고 영주역은 그 중심에서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탄광에서 소모되었던 갱목과 철물, 카바이드부터 광부들의 생필품과 쌀까지 영주의 상인들이 공급했던 것이다.
“영주역의 화물담당은 한 달 만에 집 한 채씩 산다는 소문이 짜했어.”
이러한 공공연한 소문과 함께 이권을 둘러싼 힘들도 커져 영주 깡패는 한강 이남의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다. 유리컵을 우적우적 씹어 뱉었다는 ‘흰 장갑’, ‘007가방’에 새 돈을 가득 넣어 다녔다는 ‘영국신사’, 발을 기막히게 잘 썼다는 이모(李某)씨 등은 역전통의 전설로 남아 있다.
역전을 중심으로 읍내 전역에는 식당, 술집, 다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희망’ ‘고향’ ‘길손’ ‘돌채’ ‘봉봉’ 등의 다방에서는 짙게 화장한 아가씨들이 손님을 맞았다. 전화가 귀했던 시절이라 다방은 단골손님들의 사무실이 되기도 했고, 아침부터 진을 치고 앉아 계란이 동동 뜬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하고 허세를 부리던 남자들은 모두가 “김 사장니임~ 박 사장님~”이었다.
역 주변의 작은 골목들에는 여인숙이 빼곡히 들어섰다. 홍등이 켜져 있던 작은 방에는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가련한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때 300∼400명에 이르렀다.
음악이 흐르는 제과점도 생겼다. 정훈희의 ‘안개’라든가 ‘철없는 아내’ 같은 가요가 흐르던 ‘일미당’에는 시를 쓰던 만화방 주인, 문학을 좋아하던 중국집 청년, 길가에서 설탕 뽑기를 만들어 팔던 나이든 작가 지망생 등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청춘들이 모였다. 버터향이 풍기던 ‘나폴리 다과점’에서는 ‘House of rising sun’이나 ‘Maria Ellena’와 같은 팝송이 흘렀다.
1970년대에는 포장마차도 나타났다. 시린 겨울날 바람에 펄럭이는 포장마차에 앉아 붉은 카바이드 불빛에 젖어 마시는 뜨거운 정종 한 잔은 꽤 이국적인 낭만이었다. ‘태백식당’ ‘은정’ ‘호수장’ ‘고려원’ 등 요정들도 있었고, 일미당 골목에는 ‘황제’라는 룸살롱도 생겨났다. 어쩌다 한 잔 맥주 맛을 보면 “삐루 마셨다!’고 사나흘은 자랑하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가장 많고 만만한 곳은 막걸리 집이었다. 때때로 육두문자에 멱살잡이로 난장판이 되곤 했지만 고달픈 날들에 기댈 언덕이 되어 준 따뜻한 선술집들이었다. 고추전 골목의 ‘영성루’를 시작으로 ‘동화장’ ‘홍성루’ ‘송죽루’ 등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30원 했던 짜장면은 환상적인 음식이었다. 가게에는 치파오를 입고 전족을 한 중국 여인도 있었다. 역전통의 송죽루가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고 중국집과 함께 포목점과 지물포를 하던 화교들은 1980년대에 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아이들은 기찻길을 따라 한없이 걸으며 철도 직원들의 삽질에서 빠져나온 조개탄을 주웠다. 어른들이 속도를 늦춘 기차에 올라 분탄이나 코크스탄을 퍼 던지면 부리나케 쓸어담아 나르는 일도 아이들의 몫이었다. 아낙들은 증기 기관차에서 타고 남은 갈탄 잿더미 속에서 아직 덜 연소된 탄을 골라내기도 했다.
1941년에 세워져 1973년 말까지 33년. 사연 많았던 그 세월동안 영주역은 숱한 사람들의 숱한 사연들을 껴안고 있었다. 무궁화나무 울타리 쳐져 있던 영주역은 지금 그 자리에 없다. 영주역은 1973년 휴천동으로 이전했고 역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다. 이제 옛 영주역 터에 서 있는 기념비만이 잊혀가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서기 1941년 7월1일 중앙선 개통과 함께 개설되었던 본래의 영주역 자리이다. 시가지 확장으로 1973년 12월23일 휴천동 지금의 자리로 옮기기 까지 33년간 교통 대동맥을 이룩한 지역 발전사에 길이 기억되어야 할 곳이다. 1999년 12월 영주시 영주지방철도청.’
#3. 1973년~영주역 ‘휴천동 시대’
1960대 이전의 영주는 인구 12만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큰 수해 이후 1970년대까지 영주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복구 과정에서 계획적인 도시건설이 가능한 시가지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새로운 시가지에는 철도청과 세무서, 태백산 국토 건설국, 노동청 등의 기관이 들어서 행정기능의 중심성을 갖춘 도시로 변화했고 1968년 말에는 전국 200개 대학 중 여덟째로 영주전문학교(현 경북전문대학교)가 들어서면서 고등 교육기능이 강화되었다.
1973년 12월23일, 영주역은 이러한 신영주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영주역의 휴천동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영주역은 지하자원과 임산물, 농산물의 집산지 및 유통지로 영남 북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한국 철도의 대명사로 활약했다.
“한 달 월급이 5만∼6만원이었어. 쌀 2∼3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지. 석유를 되로 팔던 시대였어. 영주에서 안동으로 가는 철도운임이 250원이었어. 그때 아리랑 담배 한 갑도 250원이라 생생하게 기억하지.”
“1970년대 영동선을 따라 영주와 강릉을 오가던 열차에는 곡물과 식료품 등이 많았어. 여기서 구하기 힘든 생선과 건어물 등이 강원도에서 왔지.”
1979년 영주의 인구는 8만명에 이르렀고 이듬해 4월 시로 승격되었다. 1984년에는 원당천 물길이 완전히 외곽으로 돌려졌다. 천이 흐르던 자리는 넓은 아스팔트길인 원당로가 되었다. 중앙통 육전거리의 상권은 지금의 영주역 앞 번개시장으로 이동했다.
지금 영주역은 경북선의 종착역이자 영동선의 분기역이며 제천, 안동, 부산, 강릉, 청량리 방면으로 가는 여객열차의 중간역이자 시종착역으로 여전히 철도 십자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중부내륙 관광열차가 지나면서 전국 각지의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글=류혜숙<작가·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진=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공동기획:경상북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격랑의 대선, 어디쯤 와 있나··후보별 급소 전격 해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20.676d024eeb09422197dfc37303a8e9ab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