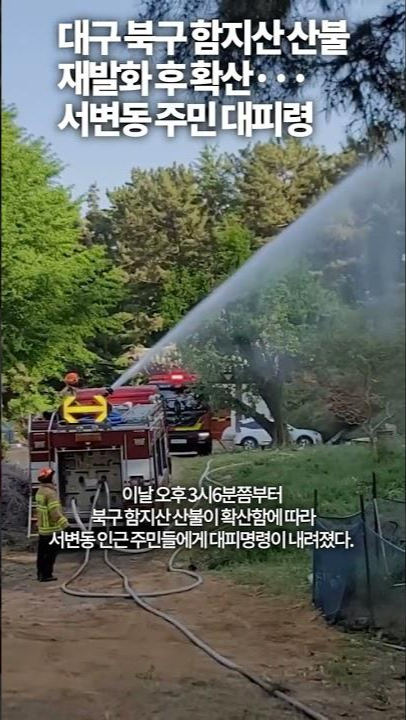|
| 지난 40년간 광주의 포크문화를 리드해온 싱어송라이터 박문옥. 그는 평생의 음악적 도반인 최준호·박태홍과 함께 광주의 트윈폴리오로 불렸던 ‘전남대트리오’를 거쳐 ‘소리모아’ 시대를 열었다. 그는 지금도 한 아파트 상가의 스튜디오에서 광주의 정서를 세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곡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
지난 10월. 내 생애 가장 벅찬 한달이었다. 10~11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고운 음악으로 칼끝 같은 시대를 보듬다’란 타이틀의 ‘박문옥 음악인생 40년 콘서트’ 때문이다. 다들 40년간 단 하루도 통기타를 놓치 않았다는 사실, 직수굿하게 오직 고향언저리에 퍼질러 앉아 광주정서를 노래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치기 어렸던 몇 해를 제외하곤 난 평생 광주(光州)를 떠나지 않았다. 그건 능력이자 무능력이었다. 다소 꼰대질 하고픈 포크아저씨? 난 나를 그 정도로 평가한다. 아무튼 난 이 음악회를 포크뮤직으로 밥 먹고 살기 불가능해진 시대를 향한 통쾌한 ‘한방먹임’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유명해져야 성공이라고 믿는 천박한 한국음악문화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 믿고 싶다.
광주. 남도소리의 총사령부 같은 데다. 시민 모두가 ‘소리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 도시에서 포크음악이라니? 누군 남도소리의 한 지류로 광주포크를 이해하려 한다. 나는 정색하며 선을 긋는다. ‘광주포크’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서울 미사리 통기타촌이 붕괴될 즈음 광주의 사직골은 전국 유일의 통기타거리로 부상했다. 한때 광주소리는 자탄적이고 안분지족적인 한의 소리였다. 하지만 광주포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항거정신의 대명사로 진화했다. 광주정신의 한 파생물이 바로 광주포크다. 무등산 풍경소리·오월 거리음악제·오월 창작가요제를 잉태한 광주포크는 지난해 대구포크와 손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달빛통맹’(대구·광주 통기타 동맹)이 잉태됐다. 이는 영·호남 포크문화의 신지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0주년 행사 뒤풀이 직후 나는 쉬 잠을 들 수가 없었다. 지난 40년이 한편의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1972년 유신헌법 탄생으로 한국 포크정신이 가장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내 가슴은 포크에 감금된다. 송창식의 노래 ‘나의 기타 이야기’ 가사와 흡사했다. 서양의 율조와 한국적 감성이 고루 섞인 한국 첫 포크트리오, 내 사춘기는 트윈폴리오를 벤치마킹하면서 개막된다.
◆예술가였던 형제들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에서 태어났다. 8남매의 막둥이였다. 음악적 DNA는 부모보다 형들로부터 거의 물려받은 것 같다. 큰형은 수학교사이면서 트럼펫을 잘 불었다. 둘째형은 임방울이 불러 대박냈던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쑥대머리’를 잘 불렀다. 셋째형은 광기어린 천재였다. 요절했는데 한때 불가에도 몸을 담았고 신학교도 기웃거렸다. 경계의 유전자를 가진 그는 산천유람에 능했고 그림, 건반, 노래, 시 등에 능했다. 물리치료사이기도 한 넷째형은 연극에 일가견이 있었다. 현재도 현역 연극인으로 광주 연극계의 원로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인 다섯째형은 노래를 아주 잘 한다. 시인인 누나는 중학교부터 소설을 창작했던 문학소녀였다.
셋째형 때문에 통기타를 치게 된다. 학다리고교를 졸업한 후 1974년 전남대 미술교육학과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물로 들어온 형의 기타를 내가 품어버렸다. 교과서보다 당시 우리에겐 경전처럼 보였던 세광출판사 가요집을 펴놓고 세월을 낚았다.
이때 내 의식을 좀더 세련되게 치장해준 친구가 있었다. 서울에서 광주로 온 과 동기인 최헌주였다. 그는 서울식 기타주법을 지녔다. 나보다 한수 위의 기타실력이었다. 둘이 전남대 첫 포크 듀엣을 결성한다. 생각해 보면 이때가 광주포크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당시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 대학가에선 싱어롱문화가 캠퍼스를 장악한다. 웬만한 잔디밭은 통기타패가 점령하고 있었다. 우리는 광주관광호텔 7층 라이브카페 전속 그룹사운드 막간에 알바무대를 가졌다. 출연료는 뒷전이었다. 우린 흥분했다. 그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 여겼다. 멤버가 두 명 더 늘었다. 1년 뒤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 색깔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박태홍과 최준호다. 헌주는 훗날 서울로 올라가버리고 우리 셋만 남았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질긴 인연 같았다. 셋은 광주 포크삼국지를 위한 도원결의(桃園結義)였다. 나는 본의 아니게 유비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글·사진=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