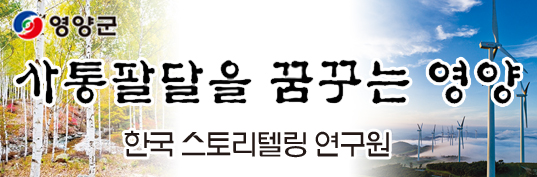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중고레코드숍에서 산 LP음반을 옆구리에 끼고 첫 데뷔한 코리아음악감상실이 있었던 코리아백화점 골목 입구를 지나가고 있는 김윤동 DJ. 그 시절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렇게 많았던 음악다방이 이젠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
날 보면 ‘1급보호종’이라며 놀려대는 친구가 있다. 그래, 난 멸종 직전의 DJ(Disk Jockey), 김윤동(51)이다. DJ에 대한 추억이 살갑다면 그는 분명 ‘음반세대’. 하지만 지금 10~20대에겐 더이상 DJ가 무용지물.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이다. 쥐꼬리만 한 월사용료만 지불하면 원하는 곡을 무궁무진하게 감상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음반은 돈 주고 구입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젠 ‘음원시대’. 그렇다면 DJ는 마땅히 멸종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난 월~금요일 밤 10시부터 2시간 대구교통방송(TBN)에서 ‘김윤동의 낭만이 있는 곳에’를 진행한다.
나는 한국DJ 2세대의 막내다. 내가 다운타운DJ가 됐을 때 한국 DJ시장은 내리막길이었다. 황금기는 1964년 10월 동아방송(DBC) ‘탑튠쇼’에 최동욱이 한국 첫 DJ로 등장하고 1년6개월 뒤 MBC가 이종환을 스카우트해 ‘탑튠 퍼레이드’로 맞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박원웅, 한인용, 김기덕, 김광한…. 그 시절 청춘문화는 DJ가 독점하다시피 했다. 지금 지역 방송DJ는 딱 3명. TBN에 있는 김병규, 그리고 대구MBC FM의 이대희 선배, 그리고 나다. 부산교통방송에는 최동욱의 아들 최성원이 대를 잇고 있다. 서울은 전멸이다. 유명인이 우리 자릴 다 먹어버렸다. 더 이상 새내기 DJ는 없다. 우리들이 사라지면 방송DJ시대도 마감될 것이다.
음악은 인간의 오욕칠정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게 바람이라면 맘과 맘을 연결해주는 건 ‘음악’이라고 믿고 산다. 멸종가도를 걷는 음반세상인데도 어찌 된 셈인지 ‘음반의 추억’은 더 초롱거리며 피어난다. 다양한 색깔의 LP카페. 대지레코드 등 중구 교동시장에 남은 중고LP가게 등을 통해 빛바랜 음반은 더 빛나게 거래된다. 자본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더 고독해지고 그럴수록 추억은 최고의 치료제다. 그 추억의 정수가 바로 낡은 음반인가 보다.
난 중구 대봉동 수도산 언저리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날 무렵 최동욱, 이종환 등과 같은 거장 DJ가 뮤직방송을 리드했다. 71년 지방에선 처음으로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한국FM(BBC)이 태동한다. 그 방송국이 대구 DJ문화의 견인차였다.
아버지는 군인이면서 음악광이었다. 마니아가 아니면 건들지 않는다는 쇼스타코비치 전집까지 구비할 정도였다. 오직 클래식, 재즈 등만 품었다. 외국 연수를 다녀올 때면 꼭 음반을 수북하게 사왔다. 난 그 음반에 수록된 음반 해설서를 교과서보다 더 탐독했다.
남산동 악기골목 근처로 이사했다. 남산초등 4학년 시절이었다. 이때 내 생의 행로도 결정된다. 마당이 무척 큰 집이었다. 남들이 부러워한 전축이 뮤직룸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운동이지만 나는 음악에 심취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길 닮는 날 싫어했다. 뮤직룸은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아버지 못지않게 두 형의 영향도 컸다. 모두 기타를 능수능란하게 쳤다. 하지만 뮤지션의 길로 가지 않았다. 난 당시 또래처럼 기타보다 음악감상이 더 좋았다. 한 곡씩 각개격파하면서 심층·체계적으로 파고들었다. 고시공부하듯 음악을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오지 않는 날 뮤직룸은 친구들과의 파티장소로 돌변했다.
하늘이 넓다고 하지만 음악세상에 비하면 오히려 좁다고 생각했다. 비틀스, 퀸, 롤링스톤스, 핑크플로이드, 레드제플린…. 브리티시팝의 명곡 속으로 걸어들어가면 난 밥을 먹지 않아도 허기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스토리를 약장수처럼 여러 번 우려먹었다. 마지막엔 꼭 이 질문을 던졌다. ‘지미 페이지, 에릭 클랩튼, 제프 벡. 셋이 함께 속해 있었던 밴드는?’ 정답은 63년 결성된 영국의 록 밴드, ‘야드버즈(Yardbirds)’. 그럼 다들 날 보고 ‘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냐’라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엄지 척’해줬다. 하지만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그 셋이 아니다. 벨기에 출신인 유럽 재즈의 거장, 장고 라인하르트. 그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 화재로 두 손가락을 잃어버렸다. 예술은 정말 불행과 고행을 먹고 자라는 모양이다.
우리 가족은 참 이상했다. 유랑가족이었다. 아버지는 보헤미안이었다. 두 형과 누나까지 아웃사이더였다. 날 챙겨주는 건 오직 음악뿐이었다. 난 고아 아닌 고아였다.
글=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사진=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달성청춘별곡] Ep.04 달성군 옥포읍, 101세 어르신 계신 행복한 장수마을에서 노래 한바탕 부르고 왔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7/news-m.v1.20250725.84d4b47427214394bde4ddf3ba743efd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