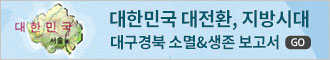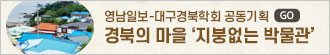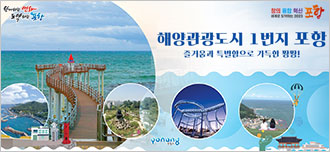|
| 박진수 소장이 첨성대 맨 위에 올려진 백구정을 만들고 있다. 실제 첨성대 위에 백구정이 있었고 그 글씨를 설총이 적었다는 걸 입증하는 경주 순창 설씨 집안 문헌 기록도 있다. |
가끔 홀연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어른이면 당연히 해야 될 밥벌이가 아니다. 남이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남들이 '그것도 일이냐'면서 폄훼하고 무시하고 핀잔을 줄 만한 사명(使命) 같은 일, 그게 전혀 밥벌이와 상관이 없을 때, 그런 일에 목숨을 걸자면, 십중팔구 그 집안은 그런 사람 때문에 거덜이 날 확률이 높다. 동의보감과 대동여지도에 투신한 허준과 김정호도 그런 길을 걷지 않았겠는가. 고흐한테서 그림을 빼앗아 가버리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박진수. 예순다섯 해를 살아오는 동안 나는 솔직히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었다. 남달리 감이 빠른 아내는 일찌감치 자기 남편이 곧이곧대로 살아갈 작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녀도 배수진을 친다. '당신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된다'는 주의였다. 그렇다. 지금 우리 집 가장은 아내다. 지금도 궂은 식당일 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나를 아직 내다 버리지 않는 걸 보면 전생에서의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 청춘은 일찌감치 윷과 성혈(性穴·Cup-mark)에 송두리째 헌납된다. 그리고 35세 무렵, 내 생애 최대 화두가 생겨난다. 전반기 윷과 성혈 연구에 힘입어 나름 쾌거를 이루는 과정에 우리 사학계는 물론 천문학계까지 난제 중 난제로 남겨진 경주 첨성대의 비밀을 내 방식대로 풀기로 결심한 것이다. 첨성대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퍼즐 하나가 있다. 나는 내가 그걸 발견하고 싶었다.
부귀공명과 무관한 첨성대 연구, 그게 박진수의 길이었다. 대체 누가 그 길을 자청하겠는가? 천지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신념을 주기 위해 무수히 많은 난관도 함께 선사한다. 그 흐름이 공적이면 공적일수록 그 난관의 강도도 배가된다. 무당을 만들기 위해 신병(神病)이란 고난의 행로가 필수조건으로 주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도 '미스터 첨성대'가 되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궁핍, 고독 그리고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 퍼붓는 빈정거림과 멸시, 모멸감 등을 감수하며 걸어왔다. 단 두 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첫번째는 놀랍게도 아내였고 두 번째는 예천 천문대 천문관을 지낸 나모 박사였다. 두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북망산천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감지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첨성대, 그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거에 파괴하고 가공할 만한 발견을 내 가슴에 비수처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맞다. 내가 이 지면에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다.
나의 연구는 전적으로 선덕여왕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첨성대에 대한 비밀은 결국 선덕여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첨성대는 국사 교과서에 적힌 그 천문관측대가 아니다. 그게 내 확신이다. 신라의 첫 여왕인 선덕여왕만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뇌, 그것에 부합되는 상징물이 바로 첨성대였다. 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지만 후사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초월적 힘을 불러올 수 있는 제의(祭儀)적 상징물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첨성대였다.
나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태어났다.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라서 내 학력은 동구 해서초등 졸업이 전부다. 어떤 스님은 향후 닥칠 기구한 삶을 엿봤던지 날 스님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는 타고난 목공예가인 종형(석희)의 문하에 들어가서 나무 다루는 일을 조금 배웠다. 이후 건축업을 하는 자형(김찬규)을 만나 안목을 키웠고 이후 북구 침산동 성북건구사에서 창호 전문가로 전국을 돈다. 웬만한 물건은 다 나무로 만들 수 있었다. 숱한 목공품 중 나를 단숨에 사로잡은 게 있다. 바로 윷이었다. 윷은 성혈을 불러들였고 그걸 연구하면서 나는 천문대를 연구하는 귀신으로 젖어 들어갔다.
글·사진=이춘호 전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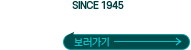




![[영상 뉴스] 대구대공원에 판다 들어오나?···홍준표-싱하이밍 중 대사 면담](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M20240531001516299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