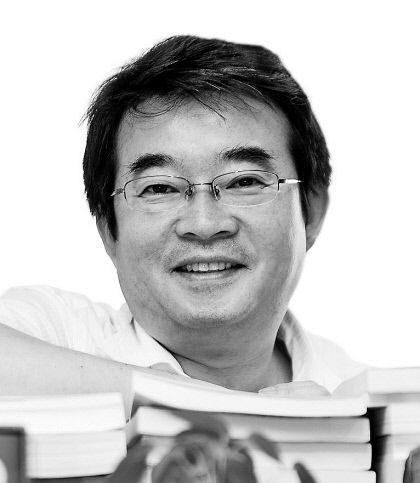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오후가 되면 강바람이 거칠어진다. 장갑을 끼고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걷는다. 입춘이 지났건만 강물 위에는 살얼음이 둥둥 떠다닌다. 봉화 선달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내성천. 나는 내성천 가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내성천이 보이는 강변에 산다. 읍내로 나가려면 내성천 강변길을 십리쯤 따라가야 한다.
겨울은 모든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쉬는 계절이지만 겨울에 유난히 눈에 띄는 식물도 있다. 강변길에서 반갑게 만나는 친구 중의 하나가 박주가리 씨방이다. 덩굴식물로 한여름에 하얀 꽃이 피며 줄기를 자르면 우유 같은 액이 나오는 박주가리. 박주가리 열매는 표면이 우둘투둘하며 오동통한 모양으로 열리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껍질을 까먹으면 제법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에 감돌곤 했다.
박주가리 씨방은 1월 이후 박처럼 갈라져 그 속에 든 씨앗들을 천천히 세상에 내보낸다. 박주가리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이때다. 성냥 알만 한 씨앗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 거기 품위 있게 달라붙어 있는 솜털들은 신비롭고도 고혹적이다. 이들이 허공을 부유하는 모습은 쫓기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때로는 치솟았다가 때로는 부드럽게 하강했다가 자유자재로 바람을 탄다. 이 박주가리 씨앗의 비행을 두고 자유로운 영혼의 환생이라면 과한 표현일까.
마른 나뭇가지를 감고 있는 마 씨방을 발견하는 것도 산책의 즐거움 중 하나다. 엄지손톱만 한 씨방의 껍질이 오종종 맞붙어 있는 텅 빈 마 씨방은 자식들을 대처로 떠나보낸 마을 노인들의 쓸쓸한 방처럼 보인다. 또 가지 끝에 눈송이처럼 매달려 있는 사위질빵 씨앗도 반갑다. 이들이 마지막 씨앗 하나까지 다 날려 보내야 봄이 올 것이다.
내성천 모래톱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갯버들이 제법 부풀어 오르고 있다. 갯버들이 연두를 데리고 오려면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 작년 여름 며칠 폭우가 내린 뒤 내성천 중심부의 버드나무들이 상당수 뽑혀 사라졌다. 상류의 영주댐 건설 이후 급성장한 버드나무가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고꾸라진 것이다. 댐 건설로 풀숲으로 변하던 모래톱이 제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가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천 준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은 불길하다. 준설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삽질한 모래를 팔아 이득을 취할 게 뻔하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성천에 포클레인과 트럭이 들어와 또 준설작업을 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의 홍수가 아니라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이 아까운 청춘을 떠나보냈다는 걸 나는 기억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속해 있던 해병대 부대는 사고 전날인 작년 7월18일 우리 마을 앞 내성천 강변길을 운동복 차림으로 열을 맞춰 이동했다. 그다음 날 19일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강에 투입되었다가 실종, 순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 수해 현장을 방문한 지 이틀 지나서였다. 그 이후 내성천으로 나가는 일이 그리 유쾌하지 않다. 강은 말이 없고, 억새는 무심하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뉴스와이]미리 보는 5월21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M2024052000174954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