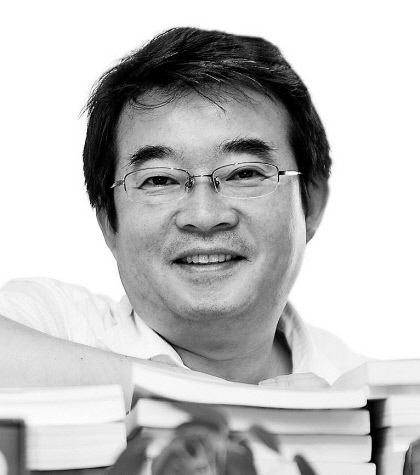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매화와 살구꽃이 섬광처럼 피었다가 졌다. 바야흐로 벚꽃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산에는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지천이다. 꽃은 해가 떠야 눈에 들어오지만, 나는 요즘 해 뜨기 직전 귓속으로 들어오는 새소리에 푹 빠져 있다. 아침 5시30분에서 6시까지는 창을 열어 놓고 새소리를 듣는다. 이때 새소리는 방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 이때 새소리는 고르고 선택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때 새소리는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리다.
보통 새가 지저귀는 이유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구애의 표현이라고 한다. 짝짓기를 통해 종족 번식을 완성하기 위해 지저귄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물의 본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내 귀에는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얼릉 일어나그라. 출근할 때 됐다카이. 오늘 벚꽃 보러 가시더. 아침밥 단디 챙겨 묵어래이. 식전부터 와 이리 잔소리가 많노. 니 사전 투표했나? 누구 찍었노? 새의 대화가 사람의 귀에는 울음소리나 노랫소리로 들릴 뿐이다.
안타깝게도 각양각색의 새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는 없다. 치료가 불가능한 난청이거나 청각장애 수준이다. 한때 카메라에 망원렌즈를 끼우고 새를 촬영하러 다녀볼까 궁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포부는 게으른 탓에 일찌감치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그렇다고 무거워진 몸으로 나뭇가지 끝에 날아갈 수도 없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일컫는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는 꾀꼬리 암수의 정다운 사랑과 꾀꼬리 소리에서 탄생한 시다. 나는 유리왕이 '꾀꼴꾀꼴'하고 단조롭게 우는 꾀꼬리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의성어는 소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약점이 있다. 일찍이 권정생 선생님은 안동 지방에서 꾀꼬리가 '동 달아매용' 하고 운다고 동시에 썼다. 김용택 시인은 어머니의 말을 빌려 꾀꼬리가 '덕치 조서방 삼년 묵은 술값 내놔'라고 운다고 했다.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다. 내 귀에는 느티나무 가지 끝에서 우는 꾀꼬리 소리가 멋지게 휘파람을 부는 소리 정도로 들리는데 말이다.
4월의 아침에 새소리에 자주 귀를 기울이다 보니 최근 들어 몇 가지 소리는 겨우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슴이 붉은 휘장을 두른 딱새 수컷은 가창력이 대단하다. 나뭇가지 끝에 꽃등을 거는 소리 같다. 아침저녁으로 듣는 새소리 중에 가장 영롱한 것은 노랑턱멧새 소리다. 영특한 아이가 또랑또랑 책 읽는 소리 같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자기 몸만큼 울음소리가 작고, 요즘 부쩍 눈에 띄는 박새는 꽤 부지런하게 운다. 휘파람새의 휘파람 실력은 전국노래자랑 본선에 나갈 정도는 된다. 덩치 큰 새들일수록 소리가 과격하다. 직박구리 소리는 '찌익찌익' 무언가 훼방을 놓는 듯한 욕심이 깃들어 있고, 떼 지어 날아다니는 물까치는 선거판의 바람잡이처럼 막무가내다. 알록달록하게 생긴 어치는 대놓고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후보 같다. 새소리를 표현하는 내 능력이 여전히 낮은 직유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안다.
머지않아 벚꽃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출 것이다. 꽃이 진다고 아쉬워할 것 없다. 벚꽃 지고 나면 복사꽃 보면 되고, 복사꽃 지고 나면 찔레꽃 보면 된다. 그때쯤이면 산에서 소쩍새가 울고 뻐꾸기도 소리를 마을로 내려보내 줄 것이다. 주말에는 내성천에 나가 흰목물떼새 소리를 찾아봐야겠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뉴스와이]미리 보는 5월21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M2024052000174954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