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문고(琴)는 봉황처럼 태평성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중국 산시성 기산에 있는 봉황탑. |
상서로운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 태평성대를 상징했는데, 거문고도 그 출발부터 정치와 관련이 있다. 주자는 '봉황은 신령스러운 새로, 순임금 때 내려와서 춤을 추었고, 문왕(文王) 때 기산(岐山)에서 울었다'라고 했다. 오동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는 봉황. 천자(왕)가 천하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나타나 운다는 봉황은 성군(聖君)을 상징하기도 한다.
봉황의 전설이 시작된 곳 중 한 군데가 중국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에 있는 기산(岐山)이다. 기산은 봉황산(鳳凰山)이라고도 한다.
기산은 중국 태평성대의 대표적 왕조이자 이상국가로 평가받는 주(周)나라의 발상지로, 중국문화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주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 주공(周公)이다. 그는 고대 중국의 최고 성인인 '원성(元聖)'으로 추앙받고 있다.
주나라 문왕이 성덕(盛德)을 베풀자 봉황이 기산에 날아와 울었다고 한다. 중국 고대 시집 '시경'에 '봉황이 우네 저 높은 산언덕에서, 오동나무가 서 있네 저기 산 동쪽에(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고 하고, 역사서인 '국어(國語)'에는 '주나라가 일어나니 봉황이 기산에서 울었다(周之興也 鳳凰鳴于岐山)'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산에 가면 이런 주공과 봉황에 관련된 다양한 유적들을 만날 수 있다. 기산 남쪽 아래 주공묘(周公廟), 즉 주공사당이 있다. 사당 뒤로 기산에 올라가면 근래 건립된 건물과 시설들이 펼쳐져 있다. 주공 상을 모신 원성전(元聖殿), 주공과 관련된 글을 새긴 비석과 정자, 커다란 봉황모습을 설치해놓은 봉황탑 등이 있다. 봉황탑 몸체에는 '봉명기산(鳳鳴岐山)'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태평성대 때만 운다는 봉황과 함께
중국 전설서 최고 제왕 표본 순임금
오현금을 타면서 불렀다는 '남풍가'
어진 정치 대명사로 뜻 이은 시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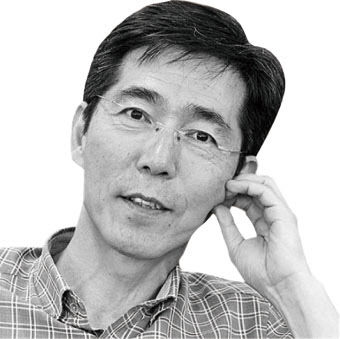 |
'서경'에 '소소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는 구절이 나온다. 태평성대를 상징하는데, 소소는 순임금의 음악을 말한다.
봉황이 내려와 노래를 불렀던 순임금 시절은 백성을 위한 정치가 잘 이뤄져 대표적 태평성대였다. 중국 금(琴)인 칠현금은 원래는 오현금이었고, 오현금은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한다. 순임금이 이 남훈전(南薰殿)이라는 궁궐에서 오현금을 타면서 남풍가를 노래했다고 한다. '남풍의 훈훈함이여, 우리 백성들의 근심을 풀 만하도다(可解吾民之온兮). 남풍이 제때 불어옴이여, 우리 백성들 재물을 많이 쌓으리라.'
순임금은 중국 전설에서 가장 훌륭한 제왕의 표본이고, 오현금을 타면서 불렀다는 이 '남풍가'는 어진 정치의 대명사가 되어왔다. 이런 뜻을 이은 우리나라 시조가 전한다. 작자는 누군지 모른다. '남훈전(南薰殿) 달 밝은 밤에 팔원팔개(어진 신하) 데리시고/ 오현금 일성(一聲)에 해오민지온혜(解吾民之온兮)로다/ 우리도 성주(聖主) 모시고 동락태평(同樂太平)하리라'.
중국 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편찬한 '설원(設苑)'이라는 책이 있다. 고사·격언 등이 망라된 교훈적 설화집인데, 이 책 '정리편(政理篇)'에 거문고 연주만으로 지역을 잘 다스린 복자천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복자천은 공자의 제자로, 노나라 사람이다. 지금의 산둥(山東)성 어는 지역의 재상 벼슬을 지냈는데, 백성들이 그를 몹시 존경했다.
'거문고 하나 갖고 부임지 간다'는 말
거문고 연주만으로 지역을 잘 다스린
공자의 제자인 노나라 복자천서 유래
심의겸 등 조선 선비들 사이에도 유행
'복자천(宓子賤)이 선보(單父) 땅을 다스리면서 그저 거문고(칠현금)만 탈 뿐, 직접 당(堂)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그 지역은 잘 다스려졌다. 한편 무마기(巫馬期)가 역시 선보 땅을 다스릴 때는 별이 지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 다시 별이 떠야 들어와 쉬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보를 다스렸을 때도 역시 선보는 잘 다스려졌다. 무마기가 복자천에게 그렇게 해도 잘 다스려지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고, 그대는 힘에 일을 맡겼기 때문이오. 힘에게 맡기면 수고스럽지만, 사람에게 맡기면 편안하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복자천을 군자라 하였다. 사지를 편안히 하고 눈과 귀를 온전히 하면서 심기를 편안히 하고도 백관을 다스렸으니, 이는 그 운수(運數)에 맡겼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무마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성정을 피폐하게 하고 교조(敎詔)를 수고로이 하였으니, 비록 다스려졌다고는 할지라도 지극히 잘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거문고를 통해 바른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며, 그런 정치는 거문고의 음악처럼 도를 밝히고 덕을 펼치는 데서 이뤄질 수 있다는 동양적인 정치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선비들도 좋아했다. 그래서 부임지에 가면서 '거문고 하나 가지고 간다'라고 소문을 내고, 친구가 부임하면 글을 지어 그 뜻을 격려하기도 했다. 심의겸(1535~1587)이 전라 감사로 부임하면서 거문고를 가지고 가자, 후배 최립이 글을 지어 보냈다.
'거문고를 가지고 부임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번거로운 일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직무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거지요. 종종 나무 아래 휴식할 틈 있을 때 거문고를 어루만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문고를 진짜 연주할 줄 아시는가요. 설마 연주하지 못하면서 거문고를 품고 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꼭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연주도 빨라지고, 좋은 소리는 오직 조화로운 기운에서 나오는 것이니,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융통성 있게 연습해 보십시오. 부임지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멋진 곡을 완성해 임금님께 들려주시길 빕니다.'
거문고를 잘 연주하는 마음으로 조화롭게 정사를 돌보라는 조언을 한 것 같다. 전통적인 음악 이론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연주하는 악기 소리에 표현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좋은 정치라는 것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감동이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화평한 마음만 있다면 군자가 정무에 직접 끼어들지 않고도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온 마을에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주자(주희)가 자신의 금(琴)인 '자양(紫陽)'에 쓴 '자양금명(紫陽琴銘)'이 전한다. '그대 중화의 바른 성품을 길러서/ 분노와 탐욕의 삿된 마음을 금하라/ 천지는 말이 없고 만물에는 법칙이 있으니/ 내 오직 그대(거문고)와 더불어 그 심오함을 찾으리'.
글·사진=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