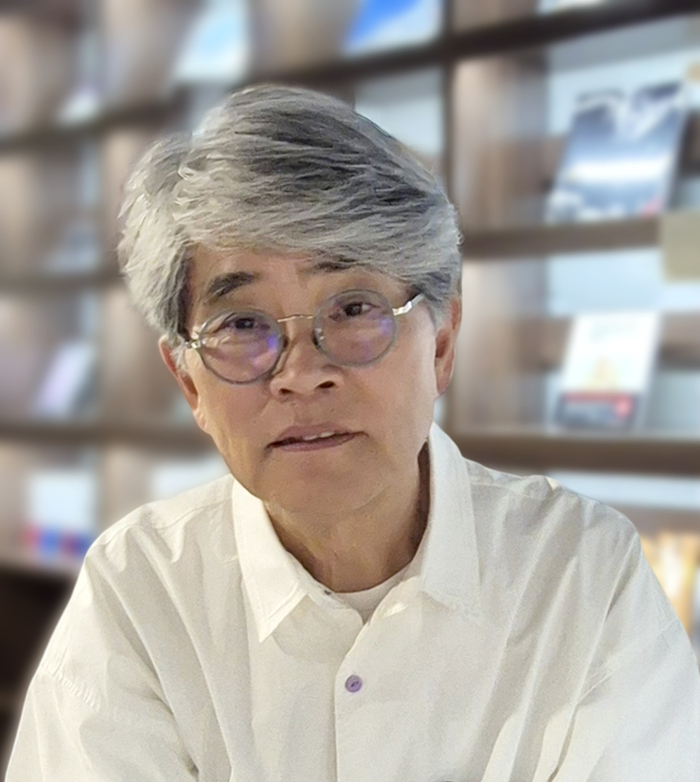
김중순 계명대 명예교수
중세의 화가들은 세상을 눈으로 본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속 느낌대로 그렸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은 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을 지배하던 시선도 신의 세계를 향해 있었다. 빛은 신의 은총이었고, 인간은 그 은총의 수혜자였을 뿐이다. 자신의 시각을 갖지 못했으니 인물과 배경은 불균형했고, 가까운 것과 먼 것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이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였다. 시각의 본질과 공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클리드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가 물체에 닿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위 '방출설'(放出說)이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 빛은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체에서 나와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10세기 이슬람 황금기의 이븐 알하이삼(Ibn al-Haytham)이다. 방 안에 비치는 빛을 따라가 보았더니 창문을 통과해 바닥에 부딪혀 굴절되고 반사되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사물에서 나오는 빛이 눈에 들어오는 과정이었다. '광학의 서'에서 밝힌 '입사설'(入射說)이다.
이슬람 문명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제공하는 빛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 속에는 이미 신의 빛이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도 그 빛이 마음의 거울에 비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로고스가 비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클리드가 인간의 눈이 갖는 시각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했다면, 이븐 알하이삼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과 경로를 실험과 계산으로 확인했다. 빛의 움직임을 따라 그 속에서 수학적 질서와 조화를 발견해낸 것이다.
원근법은 빛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태어났다.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직선은 소실점으로 수렴된다. 거기에는 시각과 공간의 객관적 법칙이 숨어있었다. 화가들은 드디어 세계를 단순히 맘속으로 재현하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원리를 회화 속에서 완전히 구현해 낸 사람이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희미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것은 깊이와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림 속 장면은 이제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인간의 시각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와 공간과 빛을 총체적 표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가 걸작인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시점을 정교하게 계산해 인물과 공간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원근법, 그것은 인간의 시선이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리스에서 이슬람을 거쳐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문명적 의식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세계'가 분리되면서 드디어 근대적 주체의 인식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카메라,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은 모두 '눈의 수학'이 확장된 결과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던 데카르트의 선언이 있기 전에 회화는 이미 "나는 본다, 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슬람이라는 문명의 다리가 르네상스로 향하는 길을 안내한 덕택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