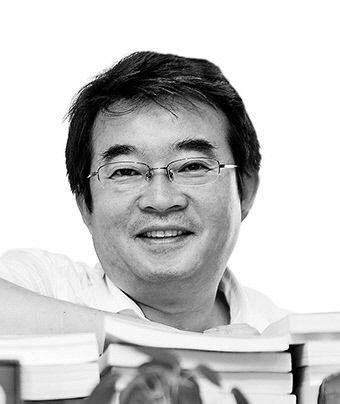
안도현 시인
울릉도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포항 영일만 여객선 터미널에서 밤 11시에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면 새벽 6시에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한다 했다. 동남아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보다 길군. 나는 유치환이 왜 "동쪽 먼 심해선(深海線)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근래 언론은 울릉도의 바가지요금과 상인들의 불친절을 증폭시킨 바 있고, 주민들은 울릉공항 활주로의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세차게 하고 있을 때였다. 11월12일이었다. 배를 타기 전부터 피곤이 몰려왔다.
유치환은 울릉도를 "장백(長白)의 멧부리 방울"로 표현했다. 굽이쳐 내려오던 백두대간의 우람한 산꼭대기 중 한 봉우리가 동해 한가운데로 물방울처럼 톡 튀어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육지의 입장에서 지도 위의 울릉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꽤 그럴싸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정작 울릉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곳이 왜 옛적에 우산국이라는 나라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무 때문이었다.
사람은 다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만 울릉도에 사는 식물들은 제각각 독립적인 영토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너도밤나무, 섬노루귀, 섬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쇠, 쪽동백나무, 큰두루미꽃…. 울릉도는 자생 식물들의 독립 국가였다. 울릉도에 도착하면 숙소 사정부터 살필 게 아니라 수령이 2천300년에 달한다는 도동항 향나무를 향해 먼저 경배할 일이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 향나무에게 큰절을 드리는 자리라도 만들면 어떨까. 일본 야쿠시마의 삼나무 조몬스기를 보기 위해 비행기와 배와 버스를 타고 가서 10시간 가까이 산악 트래킹을 마다하지 않던가.
울릉군 숲길 안내센터에 차를 세우고 나리분지 숲길로 첫 발걸음을 옮길 때의 경이를 나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평생 그날처럼 단풍에 넋을 빼앗겨본 적이 없다. 그것은 육지의 가을 숲에서 만나는 단풍과 느낌이 달랐다. 십여 미터가 넘는 알록달록한 나무들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햇살이 땅바닥의 초록 잎사귀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숲속에서 젊은 산림연구원들이 쪼그려 앉아 무슨 씨앗을 줍고 있었다. 너도밤나무 씨앗을 채취하는 중이라 했다. 세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손톱만 한 씨앗을 나도 한주먹 주웠다. 오로지 우리나라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너도밤나무 씨앗을 나도.
성인봉 가는 길 신령수 약수터까지 걷는 길은 1.7㎞다. 이 숲길은 가파르지 않고 평지에 가깝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았고 야자 매트 같은 바닥 설치물도 없다. 아주 드물게 벤치가 놓여 있고 자생식물 안내판이 몇 개 서 있을 뿐이다. 원시림 속에 만들어진 이 숲길은 울릉도에 대한 내 비좁은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이 숲길은 요란하지 않고 홀로 고요하며, 손때가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듯하였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아름답다는 그 흔한 형용사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숲길.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좋았다. 섬노루귀를 만나려면 봄에 한번 가야 할 것 같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꽃을 보려면 시월에 또 가고 싶은 숲길이다. 어린 아이와 맨발로 그냥 걸어도 좋을 길이다.
나는 더 이상 울릉도를 '애달픈 국토의 막내'로 여기지 않을 생각이다. 오징어내장탕과 부지깽이나물밥과 홍합밥도 좋지만 울릉도는 식물들의 독립 국가, 나리분지 숲길에 주저앉아 있어도 좋은 섬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