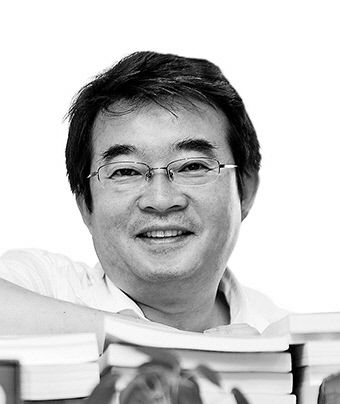
안도현 시인
시인 박기영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감지 않은 더부룩한 곱슬머리의, 구레나룻이 유난히 검은, 경상도 사투리와 서울말을 섞어 쓰면서 열변을 토하던, 말할 때는 입에서 툭툭 튀어나온 침이 내 얼굴에 닿기도 하던, 양말을 벗으면 발뒤꿈치가 연탄처럼 새까맣던 사람"이라고. 장정일이 첫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을 내면서 "나의 스승이신 박기영 형께"라고 적었던 그 사람.
1978년쯤이었을 것이다. 박기영 형은 고등학생이었던 내게 서점으로 가서 계간 '세계의문학' 가을호를 한 권 사서 오라고 부탁했다. 나는 주머니를 털어 잡지를 사다 주었으나 그는 거기 실린 이성복 시인의 신작시를 읽어야 한다며 책값 따위는 알 바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이성복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1977년 계간 '문학과지성' 겨울호에 이성복이 처음 발표한 시 '정든 유곽에서'를 읽으면서 '유곽'이라는 말의 낯선 의미를 곱씹고 있을 때였다.
이후 이성복은 1980년에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를 출간했고, 이 시집을 우리는 교과서처럼 끼고 다녔다. 무지막지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을 통과하던 이들에게 이 시집은 한 권의 예언서와도 같았다. 나는 삶의 고통과 치욕에 주목해 그것을 문장으로 쓰는 일도 시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단정한 문법과 기계적인 상상력이 왜 시의 적인지도 알게 되었다. 불규칙한 시행 배치는 건달의 발걸음 같았고, 뜬금없는 이미지의 돌출과 충돌은 너무 자유로워서 섬뜩했고, 가끔 튀어나오는 비속어는 미간이 아프도록 통쾌했다. 이 시집은 그러니까 아름답고 충격적인 사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성복 시인은 계명대 불문과와 문예창작학과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시인의 원래 고향은 경북 상주다. 상주남부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일찍이 여러 차례 백일장에 참가해 상을 받았다고 한다.
상주의 이승진 시인이 열한 살 이성복 어린이의 동시 한 편을 보여주었다. 제목은 '학교 가는 길'. <학교 옆까지 갔다.// 시작 종이,/ "땡 땡 땡"// 힘껏 뛰었다./ "탁 탁 탁"// 숨소리는/ 다드미 소리 같다.// 아이들의 머리엔/ 진땀이/ "송송"> 1962년 경향신문 상주 총국에서 주최한 백일장에서 차하를 받은 작품이다. 뛰어가는 발소리를 다듬이 소리에 비유하는 솜씨 하나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작품이다.
이 동시는 1963년 10월 10일 상주글짓기회가 편집하고 서울의 배영사에서 발행한 상주 어린이 현장 당선 작품집 '동시의 마을'에 수록되어 있다. 최춘해, 김종상, 신현득, 박두순, 하청호 같은 젊은 아동문학가들이 상주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어린이들에게 세심하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그리하여 상주가 '동시의 마을'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성복이라는 한국문학의 큰 봉우리가 상주에서 첫발을 뗐다는 점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주시에서 이성복 시인의 문학을 상주의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
작년에는 상주교육청에서 주최한 '동시 연수'가 낙동강문학관에서 몇 차례 열렸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에는 이안, 김륭, 임수현, 유강희, 송선미 등 젊은 동시인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동시의 마을' 상주를 다시 살리고, 나아가 이성복 시인의 문학을 고향에서 다시 비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