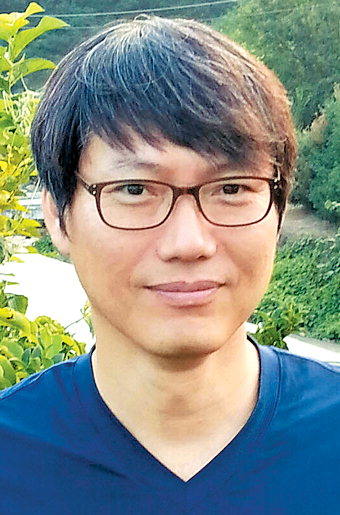 |
늦은 점심을 먹으러 보리밥집에 간다. 점포에 주방시설이 있고, 방에는 밥상 네 개가 놓여 있는 작은 식당. 방에 들어서니 주인 아주머니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주방으로 나간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중인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들떠있다.
TV에선 한 남자가 목청을 높이고 있고 사회자는 맞장구를 친다. 나머지 출연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 식당이나 가게에서 저런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나는 평화로운 식사를 위해 화면을 등지고 앉는다.
다행히 아주머니가 전화하느라 TV 볼륨을 아주 작게 줄여 놨다. 그저 앵앵거리는 소리로만 들리고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높고 급한 어조와 분위기는 생생하게 전달된다. 출연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당신이 미처 모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사람들의 동의와 경청을 바라고 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말을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다.
저렇게 화난 것 같은 어투로 확신에 차서 떠들어 대는 말의 대척점에는 문학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불현듯 문학의 말도 그 구조는 저 말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말이 문학이며,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말을 문학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문학이란 마치 몽골의 ‘후미’ 창법처럼 두 가지 소리가 뒤섞여 함께 나오는 것, 그래서 적어도 몸의 두 군데 이상이 떨리고 있어야 발성되는 것, 그리고 그 떨림이 독자들 몸으로도 이어지는 것,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떨고 제대로 공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굽는가 보다. 기름 튀는 소리가 들린다. 가방에서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 ‘고백의 형식들’을 꺼낸다. 책갈피 테이프가 붙어 있는 곳은 ‘비망록·1984’. 지금의 나보다 스무 살 어린 스승이 죽비로 정수리를 내려친다. “너는 조만간 이곳에서 홀로 떠나야 한다. 이제 너의 날들은 반절도 남지 않았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 TV의 앵앵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떨림의 순간을 위해, 짐승처럼 털을 고르며 깨어있어야 한다고 되뇌며 야무지게 보리밥을 비빈다. 그런데 입 안에 들어간 보리밥과 나물이 따로 논다.김광재<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