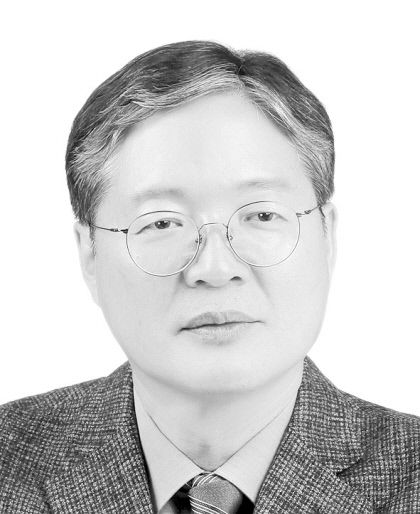 |
| 김정수 대구대 교수 |
기성세대 다수는 MZ세대가 통일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여긴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 미래를 우려하면서 MZ세대에게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논리와 체계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MZ세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통일의식을 조사하는 설문 문항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통일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만다. 설문 문항에는 이외에도 '북한 행동에 대한 응징'과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입장 청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자의 설문에는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결과도 여럿 있다. 둘째, 기성세대도 20~30대 때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당시의 50~60대보다 낮게 응답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MZ세대의 통일의식이 쟁점화되었던 계기는 2018 동계올림픽 때였다. 당시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 MZ세대의 반대가 기성세대보다 약 10% 높게 나타났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여 남북이 동시 입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MZ세대의 반대 여론이 전체 국민보다 약 15% 정도 높게 나타났다. 비슷한 또래의 대표팀 탈락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반대한 목소리에 한 칼럼니스트는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멀리 보자"며 설득하기도 했다.
MZ세대가 통일문제에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다'라고 평가한다면, 그 해결방안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통일교육이 MZ세대로부터 외면받아 온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단이 잘못되었기에 대안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는 MZ세대가 개방적이고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위에 적극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틀을 바꾸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MZ세대를 통일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이들이 참여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식전달식 교육을 실행하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MZ세대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야 한다. 이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평화나 민족문제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 홀로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영끌로 인해 경제적 불안감에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특정 과목이나 세미나 등에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통일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통일부에 통일 관련 석사를 졸업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길도 다시 열어주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MZ세대는 20~30년 뒤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다. 이들이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하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자 의무다. 통일문화 창달에 MZ세대의 적극적 참여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희망을 일구는 길이며, 남북한 화해협력의 융성한 기운은 우리 겨레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최고의 묘책이다.김정수 대구대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