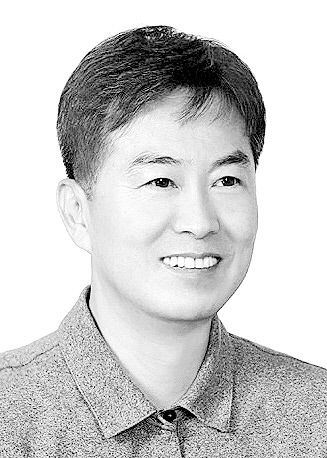 |
'...김모 군이 집단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하여….' TV 뉴스 앵커가 이와 같이 말한다. 집단따돌림이라는 말은 일본어 '이지메'의 의역이다. '이지메'는 다수가 패를 지어 약한 소수나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킬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말 '따돌리다'의 명사형 '따돌림'에다가 '집단'을 붙여서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를 형성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에는 은어로써 '왕따'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었다. '왕'의 의미는 '최고' 또는 '가장 심한'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고 '따'는 따돌림의 준말인 것이다. 앵커가 단순히 집단따돌림이라고만 말하자니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에는 미흡하고 왕따라는 말만 쓰자니 방송용어로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번거롭긴 하지만 궁여지책으로 '집단따돌림'과 '왕따'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하여 위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음직하다.
그런데 집단따돌림, 이른바 왕따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은 없었던 것일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배돌이'라고 한다. 따돌리는 행위는 '배돌리다',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은 '배돌림을 당하다'라고 표현한다. '배돌림'의 '배' 는 등을 뜻하는 한자어 배(背)다. '배돌림'은 한자와 한글의 합성어다. 언어는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사물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을 중복하거나 유행어나 외래어를 다소 섞어서 쓴다고 해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까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귀에 거슬린다. 집단따돌림, 왕따에서 보듯이 적절한 말이 없다면 신조어를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옛말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적절하게 쓸 만한 말이 있다면 되살려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자주 썼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쓰지 않게 된 말을 죽은 말, 사어라고 한다. 그 자리에도 많은 외래어가 대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통'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외래어 '타이어'가 자리 잡은 것 등이다. 어느 홈쇼핑 방송에서 쇼 호스트가 식탁을 소개하면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면 될 것을 우드로 만들었다고 한다. 세련되어 보인다는 착각으로 외래어를 억지조합 하는 것은 오히려 저속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배층의 문자로 한자를 써 왔다. 그 후 한글이 창제되어 피지배층도 쉽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 구한말이 되자 서양 문물이 밀물처럼 유입되었다. 지배층의 문자인 한자는 점차 고리타분함의 상징이 되었고 피지배층과 부녀자가 주로 사용한 한글의 위상은 더욱 낮아졌다. 유학파니 하여 외국물 먹은 사람들, 소위 우월의식을 가진 신지식층을 통하여 구미 외국에 대한 동경이 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외국어와 외래어는 '세련된' 것으로, 우리말은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요즈음 문화콘텐츠산업의 발달과 세계화로 우리나라와 한글의 위상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이 전에 없이 우리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는 세련된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도래했다. 격세지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러할진대 우리말과 글을 더 이상 촌스럽게 여길 때가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창제된 우리말 우리글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환경을 만드는 사명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있다.
소설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