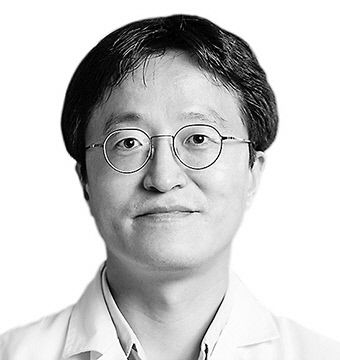 |
|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
얼마 전 'Just Stop Oil'이라는 환경단체가 주도한 미술관 시위가 주목을 받았다. 이전부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쳐온 단체로 알려졌지만, 유명 작품에 케이크를 던지거나 토마토 수프를 뿌리고 접착제로 손을 작품 주변에 붙이는 시위는 큰 주목을 받기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시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도 석유에서 나온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사실 많은 일반인은 석유를 단지 연료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각종 수송 수단, 플라스틱, 의류, 식품첨가제, 농약, 페인트, 전기, 전자 산업 등의 핵심 소재인 동시에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등 의식주를 중심으로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개월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천연가스 및 각종 곡물, 원자재 등의 수출입 제약이 엮이면서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석유를 우리 삶에서 단칼에 완전히 단절시키자는 것은 인류 문명의 공멸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다. GDP 기준으로 세계 제조업 부문 중 화학산업이 15%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장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각종 운송 수단의 연료를 대체하기 어렵기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물론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이 상당한 제약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이러한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후 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배출량 기준으로 약 87%가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내 발전량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화석 연료가 거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약 5%가 줄었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5% 정도 증가했지만, 동시에 가스 사용 비중이 5% 증가했다는 점은 여전히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많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 석유화학에서 유래된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석유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2차전지 및 연료전지의 상당수는 석유화학 유래물질들이 각종 첨가제, 전해질 및 분리막 등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전선의 피복재만 해도 석유화학 유래 물질이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또한 전주기적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에서 과연 친환경적인가를 고려한다면, 제한적인 광물의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와 사용 연한이 지난 후 폐기 혹은 재활용 문제를 고심해야 하는 점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제 각종 분야에서 LCA를 통해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문제를 동시에 고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의 등장으로 지난 150여 년간 인류가 누려온 편리에 대한 의존성과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심각한 생태 교란 문제 해결은 긴 시각의 체계적인 화석연료 사용 전략과 심각한 후폭풍을 줄이는 현명하고 상보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