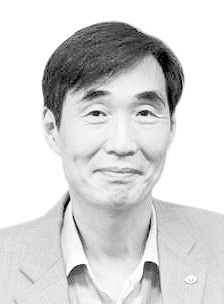 |
|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
베토벤(1770~1827)은 음악의 선구자였다. 그가 남긴 138개 공식작품(Opus)은 어떤 작곡가보다 장르가 다양하며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다. 학자들은 출판되지 않은 작품을 후세에 WoO(Works without Opus number)로 정리했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엘리제를 위하여(WoO 59)'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명곡이다.
독일 본(Bonn)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았다. 아들을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 음악가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 요한은 베토벤이 17세였을 때 빈으로 연주여행을 보냈다. 당시 빈은 음악의 중심지였기에 최고의 음악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4년 뒤 모차르트를 만나기 위해 베토벤이 다시 갔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하이든이 건재했기에 그의 문하로 들어갔다.
1년 뒤 22세에 발표한 첫 공식작품(Op.1)은 고전적 틀을 갖추면서도 개성을 담은 피아노 3중주였다. 3곡으로 구성된 베토벤의 첫 작품을 보고 하이든은 앞의 두 곡은 인정했지만, 마지막 곡은 "대중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출판에 반대했다. 스승이 궁정음악 중심의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한 베토벤은 1년 만에 하이든 문하를 떠난다.
어렵게 출판된 첫 작품 중에서 세 번째 곡 c단조에 대해 청중들은 열광했다. 당시 사람들은 청중의 음악적 수요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하이든은 틀리고 베토벤이 옳았다'고 평했다. 이 곡은 틀에 매인 작곡법에서 벗어나 템포 변화와 극적 요소를 더했다. 게다가 첼로 파트를 살려 악기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기에 청중이 호응한 것이었다.
베토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내악은 후원하던 귀족계급의 붕괴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 20세기에 접어들어 하이페츠와 카살스, 루빈스타인 등 전설적인 대가들의 활약과 음반의 발명으로 실내악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다양한 대중음악의 등장으로 청중으로부터 점차 멀어져만 갔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실내악의 부흥은 주목할 만하다. 개성만을 주장하는 솔로 중심의 음악과는 차별성이 있고 특성을 살리면서도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성부의 구성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지휘자가 없이 연주자와 청중이 이야기하는 듯한 구성은 '친구들의 음악'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다른 요인도 있다. 관현악단의 선곡은 고전음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내악은 다양한 악기와 폭넓은 선곡이 또 다른 매력이다. 일부 연주가들이 공연장소를 실내에서 거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유럽에서는 거리나 지하철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시애틀에서는 쇼핑센터, 커피숍, 노면전차에서 연주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2009년부터 실내악 축제를 열고 있다. 시민들에게 음악적 편식에서 벗어나 고전음악의 향기를 맡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하고, 실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미술관·병원·거리 공연 등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발상 전환과 지원이 중요하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청중에게 다가간 베토벤은 선각자였다. 실내악을 반석에 올린 베토벤의 열정은 지금도 옳다.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