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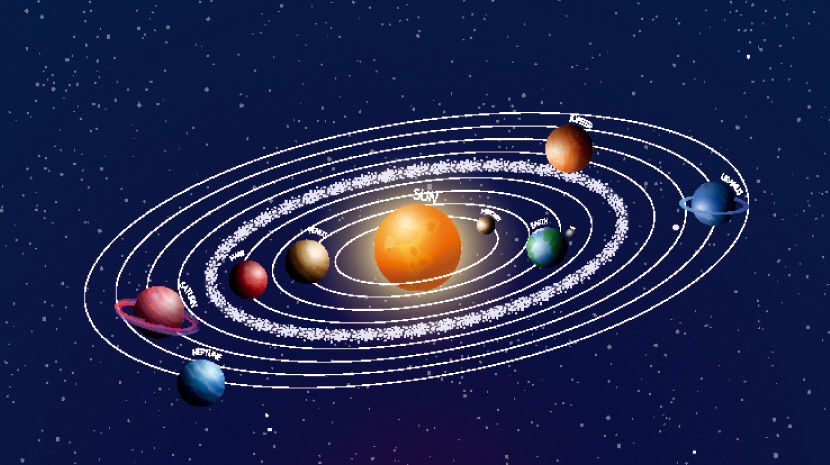 |
사주해석엔 고법(古法)과 신법(新法)에 의한 접근법이 있다. 고법은 당나라(618~907) 때의 풀이법인데 신살(神殺), 즉 별자리에 근거해 좋고(神) 나쁜(殺) 기운을 살폈다. 별자리라 함은 태양계가 아닌 밤하늘 북두칠성 주위를 도는 별들의 배치 그리고 그 배치의 변화에 따른 길흉적 판단을 의미한다. 태양계 행성과 달리 북극성 주위 별들은 무수히 많은데, 별들의 위치에 따라 인간의 삶도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 그것을 신살(神殺)이라는 도구로 설명코자 한 것이다. 지금도 쓰는 '삼재(三災)' 신살도 고법에서 나왔다.
특히 삶의 모습을 추론하는 '12신살'이라는 풀이법이 있는데, 자신의 띠를 다른 띠들과 묶은 특정 그룹(三合)에 묶어 사용한다.
예컨대 돼지띠(亥)라면 토끼띠(卯)와 양띠(未)가 한 그룹이다. 이들의 목적은 목(木) 기운을 생성하는 거다. 이 띠들은 동일 그룹이므로 들어오고 나가는 삼재의 시기도 같다. 참고로 삼합(三合)은 신살을 보기 위한 잣대이기도 하지만 명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체계이기도 하다. 길흉을 살피는 신살 중심의 풀이법은 체계화된 이론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에선 보조적 수단으로 주로 활용한다.
별 위치 따라 삶 영향 '신살 풀이'
현대에선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태양계 구성원으로서 '나'를 상징
60갑자로 된 사주팔자 보는 '신법'
음양·오행·육친·탄생월 격의 관점
길운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
신법은 송나라(960~1279) 초기 서자평(徐子平)이 개척한 해석법이다. 구법과 차이점은 사주풀이를 별자리가 아닌 태양계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별자리는 개인 중심이고 태양계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태양계는 태양 중심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성이 공전하는 시스템이다. 태양은 국가 혹은 군주를 상징하고 목화토금수 오행은 백성을 의미한다. 이는 송나라 때 강조된 유교철학과도 맥락이 닿는다. 당나라 때는 도교가 번성하면서 개인의 영생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별자리 이론과 결이 닿는다. 즉 사주팔자는 여러 별자리의 조합이고 세월 따라 다른 별과 만드는 새로운 배합 조건이 자신의 삶이라고 여긴 것이다. 실제 신살론은 밤하늘 별들의 배치와 인간사 사건 사고를 정리한 일종의 빅데이터에 기반해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래전 그 시절엔 전쟁과 기근이 심했던 탓인지 신살의 내용은 대부분 흉하다. 명리학을 신살론부터 배운 술사의 입이 꽤나 거칠다는 속설도 있다.
신법은 띠가 아니라 태어난 날(日干)을 자신으로 보고 푼다. 일간이라 할 때 일(日)은 태양임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름 모를 별이 아니라 태양계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상징한다. 내가 태어나면서 60갑자로 된 사주팔자를 가진다는 것은 하늘의 명령도 잘 수행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것이 신법의 핵심이다. 신법에서 사주를 푸는 기준점은 대체로 네 가지 정도다. 고수의 여부도 이 네 가지의 융합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첫째는 음양(陰陽)의 관점이다. 기후적 특성, 즉 한난조습(寒暖燥濕)의 상태를 말한다. 사주가 춥거나, 뜨겁거나, 습하거나, 건조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조화의 부족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거다. 예컨대 건조함이 지나치면 매우 고지식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살면서 스타일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 사주팔자 자체만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반대로 습기가 많다면 대류작용이 나타날 것이므로 타인과 잘 섞임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주원국상의 한난조습은 하늘의 명령이므로 수정이 불가하지만 치우침을 중화(中和)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거나 혹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둘째는 오행(五行)의 관점이다. 팔자에 특정 오행이 과다하면 문제로 봐서 병(病)이라 하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오행이 있는 것을 약(藥) 혹은 병약용신(用神)이라고 한다. 술사 중에는 병약 잣대 하나로 사주를 기막히게 푸는 경우도 많다. 고수들 대부분 사주의 병부터 파악하기 마련이다. 사주에 병이 있고 이를 치료하는 약용신이 있다면 당연히 좋다. 다만 용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돕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사회와 국가라는 무대에서 귀함을 얻는다는 뜻이고, 그것이 없거나 훼방하는 요소가 있다면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 특기 개발로 부(富)를 추구하는 사주로 본다. 과거엔 국가의 녹(祿)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
| 이재호 사주공학연구소장 |
셋째는 육친(肉親)의 관점이다. 육친은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총칭하는 용어다. 전문용어로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등이다. 이 부분은 좀 전문영역이므로 참고만 하시라. 팔자 구조상 정관과 정인이 혹은 편관과 편인이 상생(즉 조화)을 이루면 국가조직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식신과 편재 혹은 상관과 정재가 그러하면 사업 분야에서 탄탄한 대인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그런 조합이 없다면 대인관계가 대체로 단기적이어서 성공을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운에서 상생 조합의 글자가 들어온다면 한결 쉬워진다.
넷째는 태어난 달, 즉 격(格)의 관점이다. 신법에선 태어난 월을 하늘의 명령이 내려온 자리로 본다. 사주팔자 전체의 기후를 주관하는 것은 태어난 계절이기 때문이다. 명리학은 자연과 계절에 기반하고 있다. 천지자연이 순환상생하기 위해선 계절별로 인간이 해야 할 고유의 임무가 있다는 사유다. 따라서 사주팔자 구조가 태어난 계절에 잘 부합할수록 즉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글자가 잘 구비될수록 상급으로 친다. 신법의 대표 고전인 '자평진전(字平眞詮)'에서는 용신을 반드시 태어난 월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월지는 곧 하늘의 명령이므로 이 명령에 부합하는 글자가 바로 사주의 격을 결정한다는 원리다. 해당 글자가 팔자 내에 있다면 이 사주는 공직, 즉 사회에서의 귀를 추구하는 삶이고 없다면 개인기를 통한 부를 추구한다고 푼다. 실제 현장에서의 사주풀이 방법론은 이런 내용 외에도 자의(字意), 궁성론(宮星論) 등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어긋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
사주공학연구소장 logoswater@hanmail.net
필자 이재호는 미국 뉴욕대(NYU)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래에셋증권 상무, 숙명여대 취업 멘토교수 등을 역임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