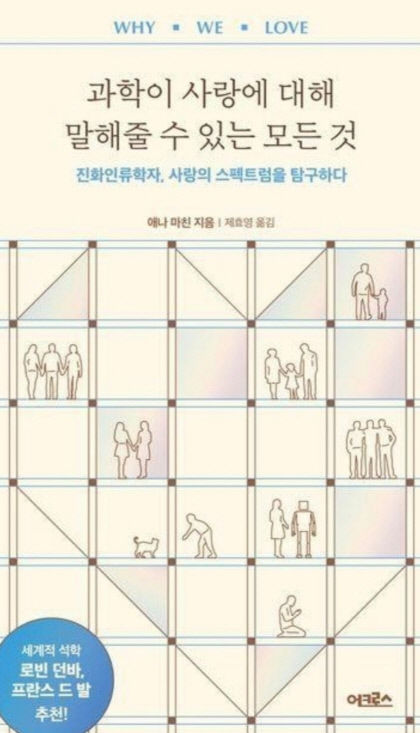 |
| 애나 마친 지음·어크로스·2022·390면·1만8천800원 |
이 책의 저자 애나 마친은 진화인류학자로서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성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로빈 던바 교수와 함께 부모자식이나 연인과 같은 가까운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인간의 행동과 문화,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독특한 학자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신비로움 속에 묻혀있던 우리 마음속의 '사랑'이란 감정을 과학이 어디까지 파헤쳐서 분해해 버릴지 두려움마저 느껴졌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엄청나게 큰 뇌를 가진 덕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지만 번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이 협력에서 비롯되고, 협력은 인간의 생존 수단이라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했다. 이 필요성의 반복으로 타인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공감집단'으로 불리는 15명의 사람들과, '친밀한 집단'이라 불리는 45명의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좀 더 확장하여 가족과 친척, 알고 지내는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 중 일부까지 포함하여 150명 정도의 사람을 '던바의 수'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생물학적 뇌물이라는 것이다. "인체의 신경화학물질은 우리가 살면서 협력해야 하는 대상인 친구, 가족, 연인, 더 넓게는 공동체와 맨 처음 관계를 맺고, 힘을 모으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려는 동기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려는 자신감이 생기고 신기할 정도로 평온하고 자신만만하게 상대를 향해 다가간다는 것이다. 또한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마다 도파민도 함께 분비된다고 한다. 도파민은 뇌에서 보상감을 주는 화학물질로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일을 할 때 분비된다고 한다.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싱글인 사람보다 체내 옥시토신 농도가 높다는 것이다.
사랑에 관여하는 세 번째 신경화학물질은 행복감, 불안감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다. 친구 사진을 볼 때와는 달리 연인의 사진을 볼 때 '비활성'되는 뇌 영역도 있어서,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150명 영역에 속하는 친족의 관계일 때는 단번에 믿음이 생기고 친구보다 친밀도가 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정은 언어, 성장한 장소, 교육과정, 관심사, 음악 취향, 유머 감각, 세계관의 7가지 기둥으로 구성되며, 이 기둥이 많을수록 우정이 돈독해진다고 설명한다.
 |
| 전진문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사) 대구독서포럼 이사) |
분노, 행복, 슬픔, 두려움, 자부심, 사랑 등 모든 감정을 통틀어 문화적 특이성이 가장 큰 감정이 '사랑'이다.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유독 사랑은 표현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다. 사랑에 관한 규칙은 사회마다 달라서 72개 국가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굶주림, 갈증, 피로와 더 비슷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허기를 느끼고 음식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을 때는 갈망하게 되고, 이 감정은 사랑을 찾아 나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생물 종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하고 그 유전자는 점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종 내에서 고정되며 이것이 '적자생존' 현상이다.
생각만 해도 볼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는 '사랑'이 결국 적자생존을 위한 뇌물로 내뿜는 뇌 속의 세로토닌 때문이었다는 과학의 분석은 섬뜩하다.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사〉 대구독서포럼 이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