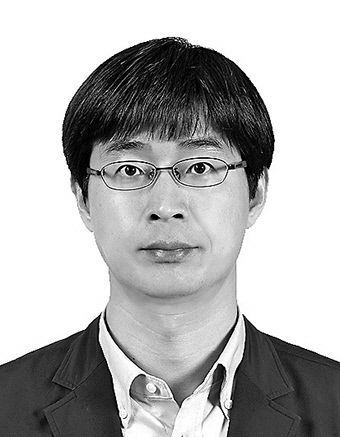 |
| 최범순 〈사〉경북시민재단 이사장 영남대 교수 |
얼마 전 학생들의 광주행에 동행했다. 이번 광주행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지원으로 소속 대학에 개설한 세계시민 교육강좌 '공존과 평화로 가는 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강좌를 진행하는 동료가 정성껏 준비한 일정에 숟가락만 얹은 동행이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출발 시각에 늦지 않으려고 버스로 달려오는 학생들 모습이 싱그러웠고 하늘도 청명했다.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유네스코 '5·18세계기록유산'이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으로 이어진 일정에서 광주 오월학교 교장 선생님의 안내 덕분에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남대-조선대 학생 교류회는 양교 학생들 이외에 광주의 청년 활동가들까지 어우러진 뜻깊은 교류 행사였다. "내게 광주는? 내게 대구·경북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꽉 찬 강당 강의실 끝줄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희망을 느꼈다. 그 자리에는 환대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
광주행에서 확인한 희망 가운데 학생들의 눈물이 있다.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눈물이 뭉클한 희망을 주었다. 묘역을 돌면서 묘비 뒤에 적힌 유족들의 말과 글을 읽던 학생이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나에게도 전해졌다. 2-22번 '전재수의 묘'가 나를 사로잡았다. 1969년 5월에 태어나 1980년 5월에 생을 마감한 11살 소년의 사진 속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다. 묘비 뒤에는 "고이 잠들거라"는 짧은 말이 크게 새겨져 있었다. 저 말은 누구의 말일까를 생각했다. 11살 소년이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했다. 그가 온전히 생을 이어왔다면 50대 중반의 중년이겠지만 그에게 11살 이후의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더 어린 희생자가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이상 묘비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번 광주행에 참가한 37명 학생 가운데 이전에 광주를 가 본 학생은 단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학생은 광주 출신 학생이었다. 광주 출신 학생을 제외하면 한 명도 광주를 가 본 경험이 없었다. 나도 2002년 가을에 방문한 것이 유일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와 학생들 사례가 특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도전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182㎞ 편도 1차로 고속도로를 전 구간 편도 2차로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데에 3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대구와 광주의 정서적 거리감을 시간의 수치로 드러낸다. 망월동 묘역 입구에서 '영호남 사랑과 우정의 기념비'를 발견하고 다가갔다가 부산의 한 로타리클럽이 세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못내 씁쓸했다. 그런 만큼 처음 와본 광주에서 타인의 상처에, 도시의 역사적 상처에 공감하는 학생들 모습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두 지역 미래세대 사이에 가로놓인 단절은 영호남과 한국 사회 기성세대가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다. 더 이상 가로막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선거 득표를 위해 두 지역 미래세대의 관계를 왜곡하는 비천한 정치 행위는 더더욱 안 된다. 주변에서 "왜 광주에 가냐?"며 걱정 혹은 조소 섞인 말을 들었다는 어느 학생들 간의 대화는 마음에 날카롭게 꽂혔다. 단절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차별과 혐오를 낳는다. 미래세대가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고 서로 보듬으며 따뜻한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서울·수도권 중심 종(縱)의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횡(橫)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월에는 광주를 생각하자.
최범순 〈사〉경북시민재단 이사장 영남대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