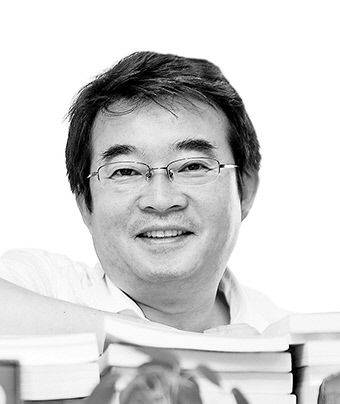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그단새' 5월이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집 뒷산에는 이맘때 아까시 꽃이 만발하였다. 지금은 국가식물표준목록에 '아까시나무'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 나무를 어른들은 '아카시아나무'라고 불렀다. '아카시아'라는 외래어는 우리말 '아가씨'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 나무가 국내에 들어온 후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아카시아'로 부르며 그 향을 맡으며 자랐다. 영어 이름은 'False Acacia'다. 즉 '짝퉁(False) 아카시아'라는 뜻. 여기에서 '짝퉁'의 의미를 떼어내고 아카시아라고 잘못 부르게 된 것. 실제 아카시아는 열대에서 자라는 전혀 다른 식물이라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군것질감이 흔치 않았다. 우리는 5월이면 매일 산발치 아까시나무 아래로 가서 꽃을 따먹었다. 햇살이 따끈해지는 계절에 주렁주렁 달린 흰 꽃송이를 움켜쥐면 아까시 꽃은 손바닥 안에서 찰랑거렸다. 우리는 아까시 꽃을 입에 욱여넣었고 그 달콤한 향기는 순식간에 잇몸 가득 퍼졌다. 가시를 조심하라는 어른들의 당부에도 아랑곳없이 우리는 가시를 똑 떼어 침을 묻힌 뒤 이마에 붙였다. 그러면 이마 가운데 작고 귀여운 뿔이 달렸다. 아까시 잎사귀를 떼어 가지런하게 달린 잎들을 손톱으로 튕겨 떼어내며 놀기도 했다. 손가락 끝에 밴 아까시 잎사귀 냄새는 싫지 않았다.
한때 아까시나무가 귀화식물이어서 우리 산림을 망친다는 오해가 있었다. 심지어 그 뿌리가 무덤의 관을 뚫는다는 해괴망측한 낭설이 퍼진 적도 있었다. 아까시나무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생겨난 오해일 것이다. 아까시 뿌리는 옆으로 뻗으면서 땅을 움켜쥐어 경사면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뿌리혹박테리아는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게다가 나무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산림녹화 수종으로는 그보다 나은 게 없다.
아까시나무를 전공하는 분에 의하면 아까시나무의 수명은 대개 50년 전후라고 한다. 50년이 넘으면 나무의 속부터 썩어 스스로 땅에 눕는다는 것이다. 산림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험한 수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산의 정상이나 깊은 골짜기에서 아까시나무를 본 적이 없다. 국도변이나 마을 가까운 산 아래에서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마치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제비처럼.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80%를 아까시 꽃에서 얻는다고 한다. 남쪽에서부터 북상하는 아까시 꽃의 개화는 양봉업자들의 이동 궤적과 일치한다. 그 길은 남쪽 바닷가에서부터 강원도 양구와 인제까지 이어진다. 최근 들어 꿀벌의 급격한 개체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기후변화, 휴대폰의 전자파, 과도한 농약 사용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기미가 없다. 꿀벌이 예전처럼 찾아들지 않는 아까시나무는 얼마나 심심할까.
남북 간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던 십수 년 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순안공항 활주로 주변은 온통 아까시나무로 채워져 있었다. 묘향산 가는 길 청천강변에도 아까시나무가 즐비하였다. 북측 안내원은 헐벗은 민둥산을 가리키며 아까시를 심었다고 알려주었다. 작년에 강연을 다녀온 경남 밀양의 동강중은 교목이 아까시나무다. 학교 건물 뒤에는 지름이 50㎝쯤 되는 아까시나무들이 마치 조경수를 심은 듯이 수십 그루 식재되어 있다. 5월이면 꽃이 장관을 이룬다는데, 멀리서도 벌들이 윙윙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