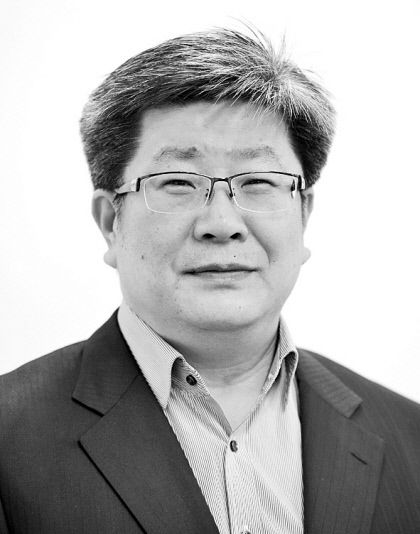 |
| 장준영 논설위원 |
'386세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들어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나이가 30대이면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1960~1969년생은 846만7천여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698만7천여명 보다 약 150만명이 더 많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127만명의 16.5% 정도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맏형인 1960년생이 내년부터 법적 노인인구에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격동의 시대'와 '낭만의 시대'를 두루 겪으며 치열한 삶을 살아온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미래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앞만보고 달려오느라 별다른 노후대책도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은퇴 전후의 낯선 삶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386세대는 스스로를 '마처세대'로 부른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세대'라는 자조적 뉘앙스가 강한 신조어다. 먼 옛날 '출필곡 반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습관처럼 안부를 여쭙고 식사와 건강을 챙기는 생활방식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길들여졌다. 행여 조금 소홀했다는 느낌이 들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자기검열이 강했던 세월이 평생 반복됐다. 이와 함께 대가족 개념이 빠르게 옅어지면서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자식사랑을 쉬이 드러내지 못했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표현이 넘쳐났다. 물심양면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성공은 그 간의 노력과 희생을 보상받을 만큼의 기쁨으로 다가왔다. 여기까지는 일말의 의심이나 후회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겼고 지속될 것으로 지레 짐작했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세대 간 입장차이가 선명해지면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서글픔·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책임감과 도리 등에 겹겹이 둘러싸여 직진 에너지가 넘칠 때는 미처 몰랐다. 부모와 자식에게 공을 들이는 인생에 익숙해질수록 '자신'을 돌 볼 시간과 여유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누구나 은퇴 즈음에는 생각이 많아진다. 흔히, '인생 2막의 시작'이라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처해있는 경제적·육체적 상황에 따라 장르가 달라진다. 희극이 될 수도, 비극이 될 수도 있지만 장삼이사들에겐 설레임이기 보다는 두려움과 생소함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386세대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다소 충격적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최근 전국의 19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30% 정도가 고독사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여지껏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느라 노후준비를 거의 못했지만, 나이 들고 아픈 부모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살기 바쁜 자녀들로부터 돌봄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계속 해야하는 386세대가 수두룩하다. 법적 노인으로 분류될 즈음이면 대개 아픈 곳도 많아지고 지갑 또한 얇아지게 마련이다.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준영 논설위원

장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