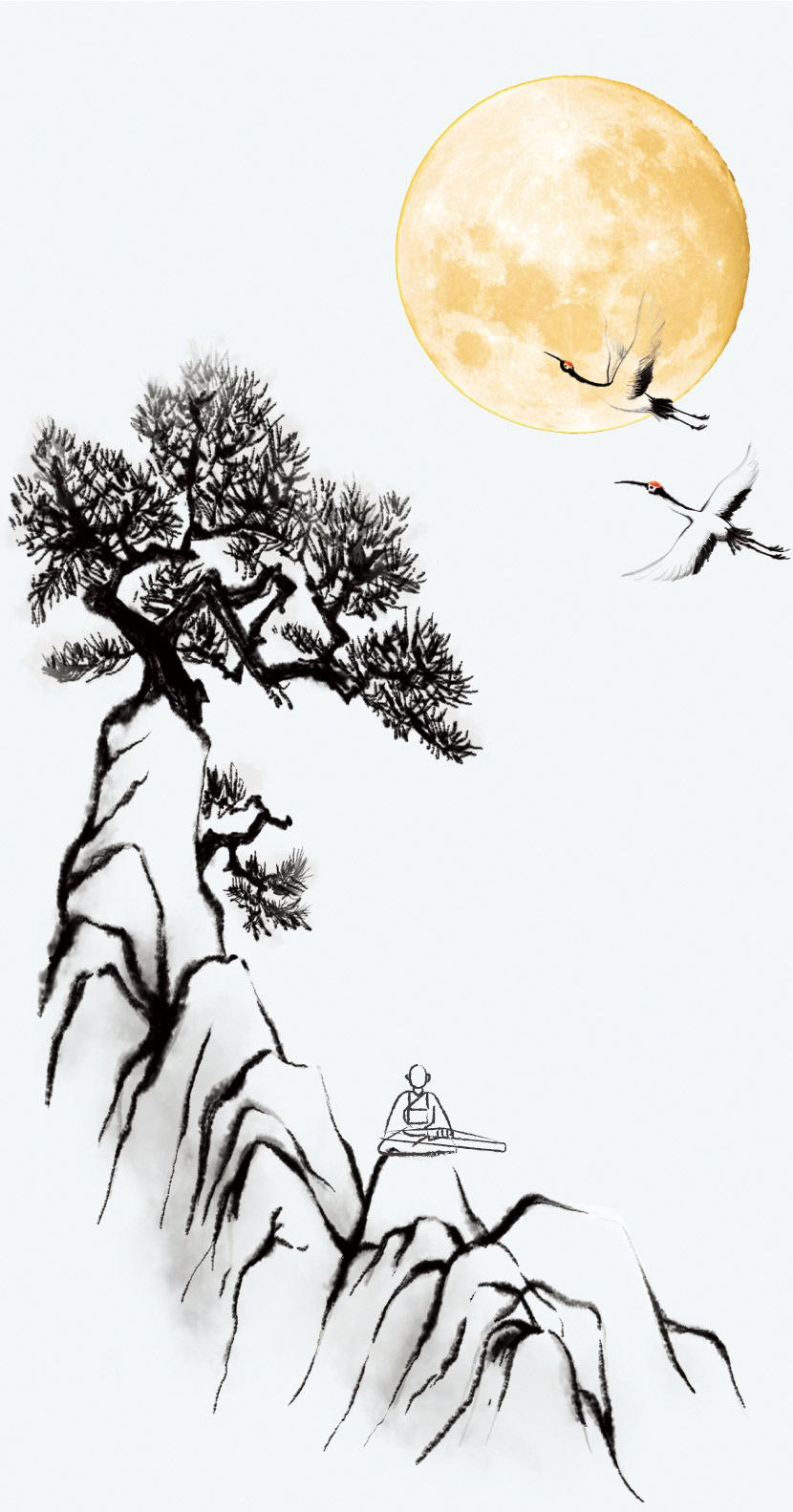 |
|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장윤아기자 |
길이 164㎝, 너비 20㎝인 이 거문고 뒷면에는 서화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육교(六橋) 이조묵(1792~1840)이 새긴 '공민왕금(恭愍王琴)'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거문고의 원래 주인은 고려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그가 사랑했던 노국공주가 죽자 신령한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그녀의 초상 앞에서 연주하며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공민왕 거문고는 고려 말 삼은(三隱) 중 한 사람인 야은(冶隱) 길재(1353~1419)에게 전해졌다. 길재가 세상을 떠난 후엔 조선 왕실의 보물로 전승되어 오다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소장했다. 그 후 의친왕 이강이 보관했고 1930년대에 의친왕이 만공 선사에게 이 거문고를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노국공주 잃은 공민왕의 슬픔 달래주던 악기
왕실보물로 전해지다 의친왕이 신표로 전해
풍류가객 만공, 달 밝은 밤이면 산 올라 연주
뒤판엔 그간 내력 알 수 있는 이조묵의 찬문
 |
| 예산 수덕사에 있는 만공탑. 만공 스님을 기리기 위해 1947년에 조성한 이 탑에는 만공 스님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글귀인 '세계일화(世界一花·세계는 한 송이 꽃)'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백 가지 풀은 모두 부처의 어머니) 등의 글귀를 새겨놓았다. |
◆만공 스님과 의친왕
이 거문고가 어떻게 만공 스님의 손에 들어가게 됐을까. 1930년대 중반, 운현궁을 찾은 만공과 문답을 나눈 의친왕은 크게 감화를 받았다. "내가 비록 출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옷을 벗고 불법에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며 불문(佛門)에 귀의하게 됐다.
이를 기리기 위해 이강은 만공에게 뭐든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신표로 드리겠노라 제의했다. 그러자 만공은 주저 없이 운현궁의 귀물인 거문고를 달라 했다. 이에 이강은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전해 받은 그 귀한 거문고를 밤중에 궁궐의 수챗구멍으로 몰래 빼돌려 만공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만공은 이 사연 깊은 악기를 자신이 머물던 수덕사 소림초당에 걸어두고 애지중지했으며, 수시로 현을 뜯어 노래를 불렀다. 만공의 뜻을 받들어 제자 벽초 스님이 지은 소림초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곡 위에 걸린 갱진교(更進橋)라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갱진교의 '갱진'은 불가의 경구인 '백척간두(百尺竿頭) 갱진일보(更進一步)'에서 가져온 말이다.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발자국 나간다'는 의미로, 지극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공은 휘영청 달 밝은 밤이면 이 갱진교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곤 했다.
만공은 선사였지만 풍류가객이기도 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은 그의 오랜 지기였으며, 만해 한용운을 일컬어 '나의 애인'이라 하기도 했다. 서화가나 소리하는 예인들이 만공을 찾기도 했다. 남농 허건, 의제 허백련 같은 화단의 귀재들이 만공과 교유했고, 만공은 흥이 오르면 공민왕 거문고를 타며 풍류를 즐겼다.
만공이 생시에 갱진교에서 읊었던 시한 수가 전한다. '마침 세상을 희롱하는 나그네 하나 있어(適存弄世客)/ 갱진교 다리 위에서 즐기나니(遊興更進橋)/ 흐르는 물소리는 조사의 서래곡이요(流水西來曲)/ 너울거리는 나뭇잎은 가섭의 춤이로다(樹葉迦葉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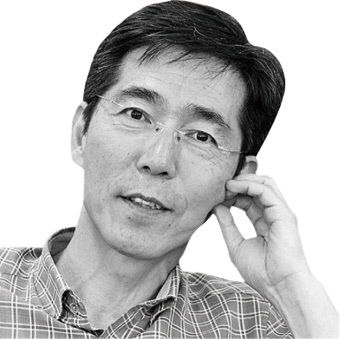 |
공민왕 거문고 뒤판에는 '공민왕금'이라는 글귀와 함께 이 악기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이조묵의 찬문(撰文)이 새겨져 있다. 시인이자 서화가인 이조묵은 오세창이 '조선의 으뜸'이라고 평했을 정도로 당대를 대표한 컬렉터였다. 거문고의 원주인이 공민왕이라고 말한 이도 바로 이조묵이다. 그는 이 사실을 확신한 듯 1837년 거문고의 뒷면에 유래를 읊은 글을 새겼다.
'공민왕이 신령스러운 오동을 얻어 이것을 만들었으니, 그 후 야은이 보배롭게 여겨 잘 간직하고 명현고사들이 그 맑고 상쾌한 소리와 음운을 특이한 것으로 삼아서 다투어 켜지 않음이 없었다. 택당 이식 등과 더불어 진실로 아꼈으니 이제 거의 마멸되었으나 그 질(質)은 세간에 증명하기 충분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정유년(1837)에 대를 쪼개는 날 육교는 이에 적어 찬한다.'
거문고는 공민왕(1353~1419)이 만들었으며 고려 후기의 문신 야은 길재에게 전해졌다고 이조묵이 정유년에 새겨 놓은 것이다. 해학(海鶴) 이기(李沂)가 1892년에 지은 이조묵의 전기가 '해학유서'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관련 내용이다.
'그의 부친은 판서를 지낸 이병정이다. 이병정은 재산이 아주 많은 갑부였다. 죽을 때 이조묵에게 말했다. "네 관상을 보니 틀림없이 아비의 재산을 지킬 수 없겠구나. 네가 하루에 쓰는 돈이 10만 전을 넘지 않는다면 70살까지는 추위에 떨거나 굶주릴 걱정 없을 것이다." 이조묵은 성격이 돈을 잘 쓰고 골동품을 좋아했다. 누군가 못 쓰게 된 거문고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전에 공민왕이 연주하던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조묵은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다.'
거문고 뒤판에는 불기 2964년(1937년)에 새긴 만공스님의 거문고 관련 게송(偈頌)의 글도 있다.
'한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체(體)의 현현한 곡이로다(一彈云是甚曲, 是體玄曲也)/ 한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일구의 현현한 곡이로다(一彈云是甚曲, 是句玄曲也)/ 한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현현하고 현현한 곡이로다( 一彈云是甚曲, 是玄玄曲也)/ 한번 퉁기고 이르노니 이는 무슨 곡조인가? 이는 돌장승 마음 가운데 겁 밖의 곡이로다(一彈云是甚曲, 是石女心中劫外曲也). 호서 덕숭산 금선동 소림초당에서(湖西 崇德山 金仙洞 小林草堂). 불기 2964년(佛紀 二九六四年)'.
만공의 제자들은 만공의 거문고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으며, 달 밝은 밤이면 계곡에 나가 거문고를 탔다고 증언했다. 이 거문고는 마지막 소장자였던 만공스님이 1946년 별세하자 노승들에 의해 수덕사 암자인 정혜사에 보관되어 왔다. 1998년 1월 수덕사에 경허와 만공의 유품을 중심으로 소장한 근역성보관이 개관되면서 이곳에 공민왕 거문고가 전시되게 됐다.
이 거문고가 실제 공민왕 때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현존 가장 오래된 거문고이다. 술대를 내려칠 때 나는 잡음을 방지하거나 거문고 머리 부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대모(玳瑁)와 향낭(香囊)이 공민왕 거문고의 특징이다. 이 거문고의 대모는 오늘날 거의 볼 수 없는 거북이 등가죽을 말린 것을 붙인 것이며, 향낭은 연주할 때마다 은은한 향내가 퍼질 수 있도록 향낭을 학슬(鶴膝)에 매단 것이다.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