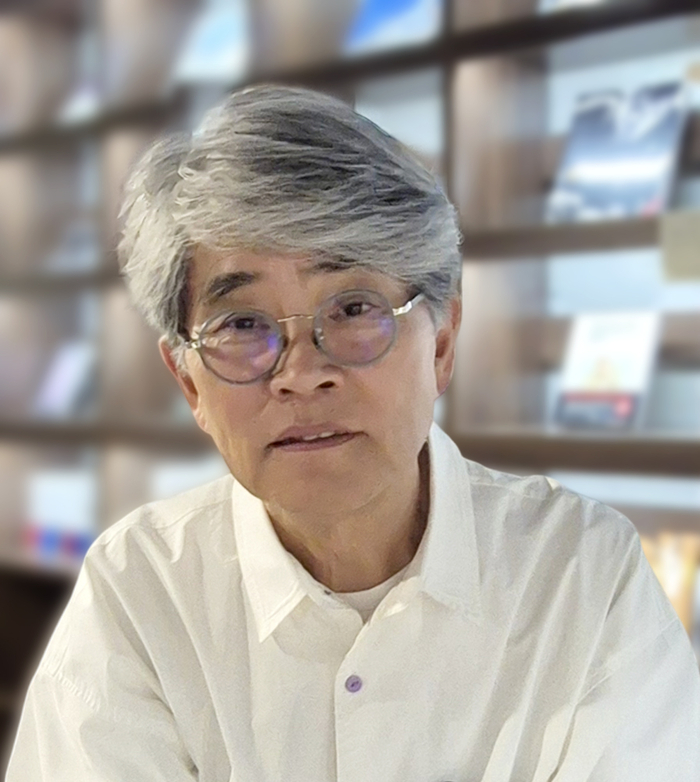
김중순 계명대 명예교수
백남준은 서울·뉴욕·동경을 잇는 글로벌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그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쌍둥이!"라며 건방을 떨던 키플링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키플링은 백인이야말로 문명과 근대적 가치를 전파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라고 했다. '백인의 짐(White Man's Burden)'이라는 시에서는 피지배 민족을 미개한 존재로 타자화했다. 그에게 식민지 지배는 단순한 경제적 착취나 군사적 지배가 아니었다. 그들을 교화하고 보호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도덕적 의무이며 백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1907년, 41세에 영어권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그의 작품 '킴'은 제국주의 모험소설의 결정판이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그레이트 게임'을 배경으로 한다.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사이에 두고 벌인 패권경쟁이었다. 그곳에는 사마르칸트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로 꼽히는 부하라가 있었다. 러시아의 남하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부하라에 외교 사절을 보냈다. 그러나 거들먹거리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부하라의 반감을 사고 말았다. 1842년, 영국이 3년이나 끌던 아프간과의 전쟁에서 퇴각하다가 2만여 명이 몰살당한 때였다. 영국의 패전 소식을 전해 들은 부하라는 외교 사절을 공개 처형했다. 영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하고자 함이었다.
부하라에는 2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역사와 문화의 경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영국인 외교관이 처형당한 곳은 부하라의 악명 높은 진단(Zindon) 감옥이다. 햇볕이 들지 않는 좁고 음습한 지하 공간, 환기 시설도 없는 이곳에는 오물과 독충들이 이글거려 일단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 부하라 감옥의 전설과 공포는 실크로드의 아름다움이나 역사적 중요성보다 중앙아시아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러시아든 영국이든, 부하라를 무너뜨리고 호라즘과 코칸트 마저 해체시켜 중앙아시아로 침략한 것은 제국이 행해야 할 마땅한 수순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동양에 대한 왜곡된 시선 때문이 아니었다. 폭력을 도덕적 사명으로 바꿔치기하고 서구 자신을 스스로 역사의 구원자로 여기는 메시아 신드롬의 결과였다. 동양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키플링의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백인의 짐'을 지고 축제를 벌이는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울고 있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중앙아시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처절했던 고통과 눈물은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작가 압둘라 코디리가 '아팠던 시간들'(김중순 역, 2025)이라는 작품에서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100년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그레이트 게임에서 겪은 '상처의 서사'를 다시 읽어내야 한다. 키플링이 노래한 '정복의 서사'만으로는 문명의 교차로 부하라에 감추어진 속살을 읽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로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4주년을 맞는다. 일그러졌던 동서양의 어울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40년 전 백남준의 외침에 지금도 울림이 있는 이유다. "바이바이 키플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