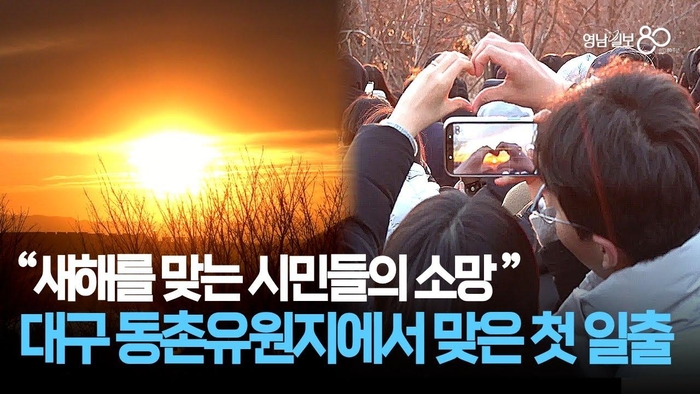이하석 시인
#"섬돌에 오동잎 지네"
갑자기 단풍이 밀려들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지난 주말까지도 남쪽의 산야는 푸른 색깔이 좀체 가시지 않은 채였는데 말이다. 지난주 글 친구들과 포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강릉 여행을 했을 때 비로소 단풍다운 단풍을 만났다. 북상하는 내내 열심히 창밖을 내다보았는데도 단풍의 본격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풍경마다 이미 고운 빛깔이 활짝 물들어 있는 것이었다. 허초희(난설헌)의 생가에 들렀는데, 집을 둘러싼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너무 고왔다. 모두 탄성을 질렀다. 때맞춰 보름달이 떠서 저녁의 몽환적인 단풍에 휩싸여 모두는 비로소 가을의 복판에 선 듯한 느낌을 받은 듯했다.
선교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밤중에 올려다본 달과 단풍의 조화가 기막혔다. 인터넷을 뒤져서 허난설헌의 가을 시(「가을 날의 한<秋恨>」) 한 편을 찾아 읽었다.
"비단 창문 사이에 두고 등 밝은 밤/ 꿈에서 깨어보니 비단 이불 한 곳이 비어 있네/ 서릿발은 차갑고 옥 초롱에 앵무새 저 혼자 지저귀고/ 불어오는 서풍에 섬돌 가득 오동잎이 지는구나."(縫紗遙隔夜燈紅 夢覺羅衾一半空 霜冷玉籠鸚鵡語 滿階梧葉落西風)
그 뒤로 일주일이 못 되어서 거짓말처럼, 경상도와 전라도 전역에 걸쳐서 단풍 세계가 되어버렸다. 내가 사는 가창의 산야는 이미 붉으레하니 짙은 홍조를 띠고 있다. 비슬산 기슭 곳곳이 단풍나무의 붉음과 은행나무의 노란 색이 한껏 어우러졌다. 단풍 구경 가는 이들도 는다. 전국의 단풍 명소가 붐빈다. 설악산과 소백산, 지리산, 오대산, 치악산, 팔공산, 가야산, 백양산, 무등산은 물론, 속리산과 주왕산의 단풍 소식에 모두는 귀를 세운다. 경기 가평의 남이섬도 절정의 단풍 풍경이 황홀할 지경이다. 서울의 경복궁과 덕수궁 등 도심의 단풍을 만끽하는 이들도 많다. 불국사와 대흥사 등 단풍으로 유명한 사찰은 평일에도 붐빈다.
#'바람에 떨어질 잎같이'
이참에 단풍 관련 시들을 새삼 찾아 읽는다.
"단풍이 지오/ 단풍이 지오// 핏빛 저 산을 보고 살으렸더니/ 석양에 불붙는 나뭇잎같이 살으렸더니// 단풍이 지오/ 단풍이 지오// 바람에 불려서 떨어지오/ 흐르는 물 위에 떨어지오(피천득의 '단풍')
수필가로 널리 알려진 피천득의 시다. 짧은 시지만, 단풍을 통해 삶의 황홀과 유한성을 애잔하게 떠올린다.
"신이 주신/ 마지막 황금의 가사를 입고/ 마을 뒤 언덕 위에 호올로 남아 서서/ 드디어 다한 영광을 노래하는/ 한 그루 미루나무"(유치환의 '단풍'),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지처럼 하늘이/ 한 칸씩 비워가고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맑은 영혼의 잉크 물로/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성선의 '가을 편지' 부분)
단풍 관련 시는 대개 애틋한 정서에 휩싸이는 듯하다. 이별의 정서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의 '변화'와 '순응', 그리고 '끝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깊은 인문학적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일까? 그런 정서가 먼 옛날에도 여전했던 듯하다. 신라 경덕왕 때 월명이 지은 향가 '제망매가'에도 이별의 서러운 정서가 펼쳐져 심금을 울린다. "죽고 사는 길 예 있으매 저히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하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다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누나/ 아으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내 도 닦아 기다리리다."(양주동 풀이)
골육인 누이의 명복을 비는 시인데, 사후 세계를 오히려 만남의 기원으로 전환하면서 서방극락정토를 희구한다.
#'무상의 미학'
단풍은 가을 이미지의 대표격이다. 여름의 짙은 초록에서 가을의 붉은빛으로 바뀌는 변화는 장엄하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들은 가을의 계절감으로 언어를 벼리는 게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문학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40% 가까이가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가을 시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마음도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고도 전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조율(emotional attunement)' 효과 때문일까? 가을을 대전환의 계기로 보고 단풍을 찬탄하는 것도 그런 사유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들어 문학치료 분야에서 가을 시 모음집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별난 조사 결과도 보인다.
나무는 다가올 겨울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린다. 그 버려지는 옷이 곱다. 말하자면 나무는 가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이다. 자연 순환을 수용하는 겸허한 몸짓이다. 덧없어 보이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순응을 두고 단풍을 '무상(無常)의 미학'이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봄에 싹 트고 여름에 무성히 확장한 다음 겨울을 견디어 다음 봄을 맞기 위해 가을에 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단풍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새로운 환원의 미학이기도 한 것이다. 김소월의 시 '산유화'나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이 이를 의식하여 이별을 서러워하면서도 새로운 안정과 만남을 기약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가을이 깊어간다. 지금 한반도는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어졌단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도 시월 말로 잡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서 11월 중순인 지금에사 절정을 맞고 있다. 늦더위 등 이상기후 탓이다. 기후 변화로 가을이 짧아진다고도 한다. 단풍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애틋해지는 이유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