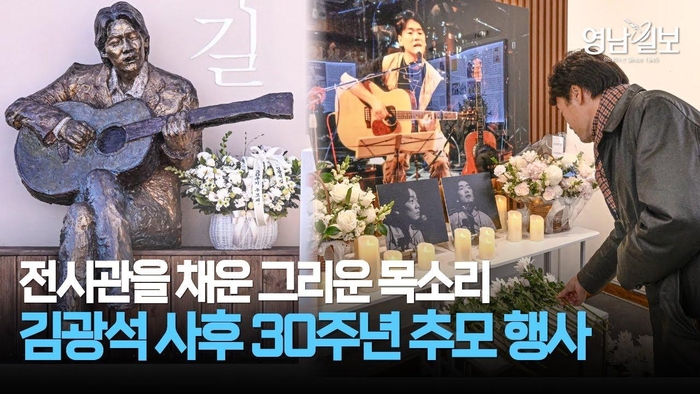경북은 건국훈장 수훈자를 2천522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聖地)'입니다. 2천522명은 전국 건국훈장 수훈자 1만8천258명의 13.8%입니다. 2.6%(483명)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 견줘 5.2배나 많습니다. (국가보훈부 공훈록 2025년 8월1일 기준)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 창간 80주년을 맞는 영남일보는 1945년 8월15일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현창하기 위해 경북이 낳은 독립운동가들의 '길'을 뒤따라 함께 걸어보는 '경북독립운동가의 길'을 연재합니다.
성주, 고령, 구미, 안동, 경주, 의성, 청송, 영양, 칠곡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상하이, 베이징, 충칭, 도쿄,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 머나먼 이국만리를 목숨을 걸고 걸었던 선열들의 마음을 삼가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승희.
이승희(李承熙, 1847∼1916) : 경북 성주→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중국 봉밀산→서간도→ 성주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회연서원. 이승희에게 회연서원은 아버지 이진상과 함께 38여 년 시간을 바친 학문과 구국 활동의 공간이다. 이진상은 당시 회연서원 주강(主講)이었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성주 회연서원.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에 있는 한강 정구(鄭逑:1543~1620)를 모신 서원이다. 이승희에게 회연서원은 아버지와 함께 38여 년 시간을 바친 학문과 구국 활동의 공간이다. 이진상은 당시 회연서원 주강(主講)이었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성주출신 한주학파 계승한 학자로
국권 회복을 위한 구국 운동 주도
매국 5적 처단 주장하다 옥고 치러
헤이그에 日만행 규탄 서한도 보내
고종 강제 폐위되자 러시아로 이주
황무지 개간해 마을 조성 학교 세워
환갑 넘은 나이에 국외서 독립운동
망명 8년만에 서간도서 쓸쓸히 별세
'살아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참으려 해도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에게도 결코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맹서했건만, 얼굴을 감싸 쥔 두 손 사이로 유황천 같은 기운이 쉼없이 용솟음쳐 올랐다.
'이허, 이 무슨 경거망동인고! 선비를 자임하는 자가 도를 만나러 들어가는 누각 아래에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1908년 4월17일, 61세 노학자는 신음을 내뱉으며 털썩 현도루 아래에 주저앉고 만다.
현도루(見道樓)는 경북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 입구 누각이다. 노선비는 이승희로, 50리 떨어진 한개마을에서 왔다. 별빛이 초롱초롱할 때 집을 떠나 지금까지 여섯 시간 이상을 걸었다.
스물셋 된 맏아들이 마침 잠에서 깨어 "아직 길이 어둡습니다?" 하며 걱정스레 물었지만 "미처 마무리 못한 일이 있구나. 일몰 전에는 돌아올 테니 염려말고 너는 짐을 꾸리고 있도록 해라"라고만 답했다.
이제 이틀 뒤면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행 배를 타야 한다. 길이 아득하고, 낯선 이국땅이라 생각하니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벌써 열흘째 온 가족이 매달려 행장을 꾸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승희는 매국5적 처단과 을사늑약 파기를 주장하다가 대구감옥에 갇혀 1905년 12월부터 1906년 4월까지 극악한 고문을 당했다. 1904년에는 국채보상운동 경남 지역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일제를 규탄하는 서한도 보냈다. 하지만 결국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위당하는 망국 직전의 참담한 현실에 닿고 말았다.
'이대로 왜놈들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전쟁을 겪어 일제와 감정이 좋지 않은 러시아로 가서 국외 독립운동을 펼쳐야겠다!' 그런 결심이 섰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를 부산항에서 승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혼미한 정신을 가까스로 가다듬은 이승희가 누각 기둥을 부여잡고 일어선다. 장남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신새벽의 판단이 옳았다 싶지만, 퉁퉁 부어오른 눈을 생각하면 남몰래 쑥스러움이 밀려드는 것도 사실이다. '자사께서는 신독(愼獨)하라 하셨다. 지켜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언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는 존재가 참된 선비이거늘… 내가 이순(耳順)은커녕 불혹(不惑)에도 이르지 못했단 말인가!'
이렇게 눈물을 쏟게 될지도 모른다 싶은 짐작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걱정 탓에 오늘 회연서원을 방문한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개마을과 회연서원 중간쯤에 있는 김창숙의 집도 그냥 스쳐 지났다. 이처럼 약한 모습은 제자에게도 보일 수 없다.

이승희의 고향 성주 한개마을 전경. 이승희는 다섯 살부터 '국내에서 손꼽히는 책문가(策文家)'로 일컬어지는 아버지 이진상에게 배웠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이승희는 다섯 살부터 '국내에서 손꼽히는 책문가(策文家)'로 일컬어지는 아버지 이진상에게 배웠다. 이진상은 당시 회연서원 주강(主講)이었는데, 사람들은 곽종석, 이두훈, 장석영, 허유, 윤주하, 이정모, 김진호에 이승희를 보태어 한주학파의 '주문팔현'이라 불렀다. 한주(寒洲, 이진상)의 문하에서 배출된 8명의 현자라는 뜻이다.

이승희 생가인 성주 월항면 대산리 한개 마을 한주 종택. 1767년 건립된 것으로 택호인 한주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이진상의 호이다. 이승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유서 깊은 저택이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이승희 생가인 성주 월항면 대산리 한개 마을 한주 종택. 1767년 건립된 것으로 택호인 한주는 조선 후기 유학자인 이진상의 호이다. 이승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유서 깊은 저택이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이승희에게 회연서원은 아버지와 함께 38여 년 시간을 바친 학문과 구국 활동의 공간이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면 아버지의 삶이 송두리째 서려 있는 이곳 성주를 살아서 다시 올 수 있으리라 기약 못한다. 아버지께서 생애를 보내신 이 강학과 제향의 공간을 어쩌면 오늘로 마지막 거니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문팔현을 이곳에서 만나지 않는 것은 꼭 눈물 때문은 아니다. 그들과는 삼봉서당(三峯書堂)에서 회동하게 예정되어 있다. 삼봉서당과 한개마을은 백천(白川)을 사이에 두고 불과 3리(1.3㎞) 떨어져 있다.

성주 삼봉서원. 곽종석 등 제자들이 이승희의 아버지인 스승 이진상을 기려 건립한 서원이다. 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삼봉서당은 주문팔현이 1897년에 세웠다. 주문팔현은 이진상 타계 6년 후인 1892년 스승을 제향할 서원 건립을 결의했고, 5년 만에 완공했다. 처음부터 서원 승격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강학 공간인 심원당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기숙시킬 동재와 서재도 함께 준공했다. 삼봉서당기(三峯書堂記)는 곽종석, 심원당기(心源堂記)는 이승희, 상량문은 장석영, 동재의 성존실명(誠存室銘)은 허유, 서재의 경거재명(敬居齋銘)은 윤주하가 지었다.
바야흐로 서원 승격을 허가받아 사당 현도사(見道祠) 건축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었다. 하지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시행 뒤에 서당으로 건축됐고, 게다가 서양 문물이 마구 밀려들어오는 정세 탓에 더 이상의 추진은 불가능했다.
4월18일 오전 삼봉서원 뜰. 이승희보다 한 살 연상의 곽종석이 말한다. "스승님 공사가 11년째 멈춰 있는 상황에 대계(大溪, 이승희)께서 이렇게 노령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국권회복을 위해 망명하시다니…. 그것도 환갑을 넘긴 고령에… 현도사도 짓지 못하고…." 곽종석의 눈가가 촉촉하게 물기로 젖어 있다.
"허허, 면우(俛宇, 곽종석)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제자이자 자식된 도리로써 오직 면구할 따름이외다." 이승희의 발음이 생생하다. 회산서원 현도루 아래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토해낸 당사자의 목소리로 짐작되지 않겠다는 기운이 감도는 음성이다. 전날 한없이 눈물을 쏟은 덕분인지 울컥한 마음이 아주 가셨다.
주문팔현은 물론이고 그 아래 한주학파의 젊은 선비들까지 삼봉서원 뜰을 줄지어 거닐고 있다. 망명을 떠나는 이승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그의 건승을 희구하는 환송식 겸 자신들의 항일 의지를 독려하는 걸음들이다. 이승희는 생각한다.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회연초당에 백매원(百梅園)을 조성하셨던 한강(寒岡, 정구) 선생을 본받아 나도 이곳에도 매화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리라.'
이튿날 4월19일, 이승희가 가묘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한다. "소자가 계미(1883)년에 향약으로 대포의사계(大浦義社契)를 만들고,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천자문을 대신할 정몽유어(正蒙類語)를 저술해 어린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아버지께서는 가이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자는 한개마을을 떠납니다. 삼봉서원을 비롯해 이곳의 여러 일들은 심산(心山, 김창숙) 등에게 당부해 두었으니 염려놓으소서. 지금 비록 망극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사오나, 물려주신 혼과 백을 성심껏 돌보아 이곳에서 다시 절을 올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를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길에 동행할 이수인, 정인하 등 한주학파의 문인들이 눈시울을 붉힌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내년, 다시 그 내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할 장남 기원과 차남 기인도 애써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부인은 아예 가묘에 나오지 않았다.
이승희는 가묘 앞에서 선친께 맹약했던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이후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글자 '한(韓)'을 넣어 호를 한계(韓溪)로 바꾼 그는 헤이그에서 돌아온 이상설과 의기투합해 러시아와 중국 접경 봉밀산 일대 황무지를 개척했다. 그는 이곳에 유랑 중인 겨레들의 공동체 한흥동(韓興洞)을 조성하고, 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약(民約)을 제정했으며, 한민학교(韓民學校)을 열었다.
그 이후 '독립에 뜻을 둔 사람 중에 이승희를 찾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박은식).' 그러나 나라를 떠날 때 이미 고령이었던 탓에 이승희는 망명 8년 만인 1916년 2월27일 서간도에서 69세를 일기로 하세하고 말았다.
그는 경술국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통곡하며 '나라를 잃은 몸으로 타국을 떠도는 신세가 됐으니 죽으면 낯선 땅에서 독수리 밥이 되겠구나. 나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가지 말라. 내 혼은 독립된 조국이 아니면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사실상 유언을 지키지 않았고, 5월29일 성주에서 유림장을 거행했다. 한개마을 뒤에 버티고 선 채 백천 너머 삼봉서원을 지켜보며 영세불망의 배산임수 역할을 자임해온 영취산(靈鷲山)도 그날은 하염없이 울음을 토하고 말았으리라. '내 이름에 어찌 독수리[鷲]가 들어 있단 말인가!'
글=정만진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박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