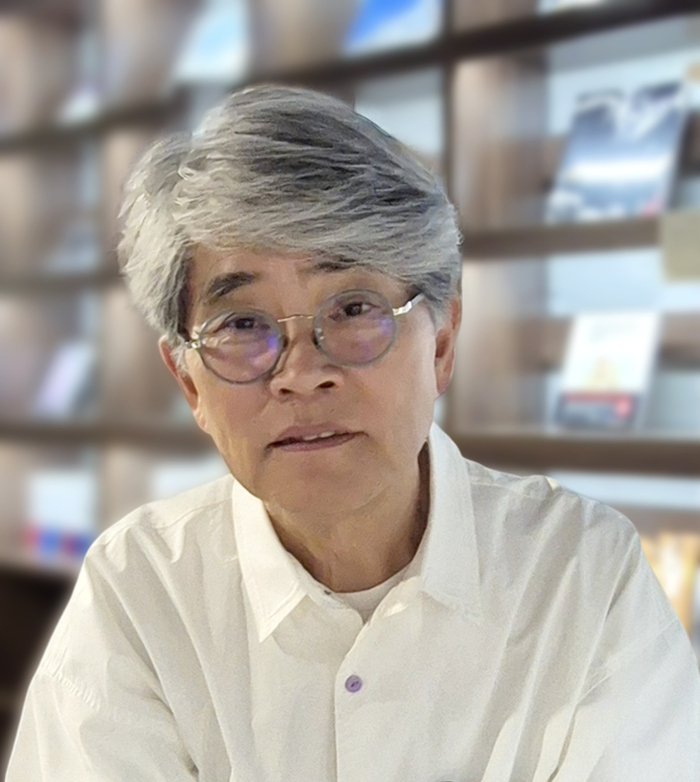
김중순 계명대 명예교수
뉴욕 맨해튼의 중앙우체국 파사드에는 "눈, 비, 더위, 밤의 어둠도 이들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약 2천700㎞에 달하는 고대 페르시아 '왕의 길'에 대한 기록에서 따온 말이다. 우편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과시지만 읽어내지 못한 게 있다. 그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차파르 하네라는 쉼터가 있었다. 전령들이 오가며 말을 바꾸어 타게 하고, 잠시 쉬어가게 하는 기술이었다.
이런 멈춤의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이들은 몽골이었다. 13세기 초, 그들은 하루에 300㎞를 달렸다. 날씨도 지형도 무시한 채 수많은 도시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냈다. 유라시아 대륙은 그들의 엄청난 속도에 진동과 공포를 느꼈고, 세계는 질주하는 몽골을 파괴자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들은 파괴자라기보다 수십 세기 동안 따로 고립되어 있던 땅들을 한줄기 속도로 꿰어 낸 문명의 중개자였다. 몽골이 내달린 질주의 끝은 단지 영토의 확장이나 파괴가 아니라 문명의 연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개발한 멈춤의 기술은 '얌'(Yam) 혹은 '참(zhàn)'이라고 하는 역참(驛站)제도였다.
이 제도는 초원과 사막과 산악에 30~40㎞마다 멈춤의 자리를 설치하여 피로한 말을 갈아타게 하고, 도로를 안내하고 숙소를 제공했다. 관리나 사신들에게는 마패에 해당하는 '패찰'을 발급하여 물자와 통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기술은 송나라와 원나라에도 전해졌고, 오스만 제국과 고려나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우리가 일정한 거리나 속도를 표현할 때 쓰는 '한참'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역참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몽골은 극한의 질주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멈춤의 질서를 창조한 것이다. 시간은 그들의 말발굽 아래서 압축되었고, 거리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속도는 언제나 멈춤과 함께였다. 모든 지나감에 멈춤의 자리를 마련했고, 속도 사이에는 리듬을 놓았다. 역참은 정복의 도구가 아니라, 속도의 한계에서 문명이 스스로를 구원케 하는 기술이었다. 그것은 쉼 없는 제국이 멈춤을 통해 문명을 얻게 하는 전환의 구조였다.
속도는 멈추는 법을 배울 때 길이 되었다.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와 비잔틴의 사절들이 그 길을 걸었고, 페르시아의 의사와 아랍의 과학자들이 몽골을 방문했으며, 티베트의 승려들이 바그다드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속도가 길을 열었다면 멈춤의 기술은 그 길을 문명으로 이끌었다. 멈춤의 기술은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와 지식이 서로를 바라보게 했다. 그것은 질주를 멈추게 하는 쉼표였고, 피로해진 제국에게 내리는 숨 고르기였으며 교류를 이끌어낸 마법이었다. 정복은 빠르지만, 문명은 느리다. 정복은 밀어붙이지만, 문명은 질문한다. 멈춤의 기술은 제국의 혈류를 조절하는 심장의 리듬이었다.
속도만 있고 멈춤이 없는 문명은 쉽게 소진된다. 멈출 수 없으면 방향도 잃는다. 쉼 없이 달리지만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도달하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멈춤의 기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진 속도의 문명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단군 이래 이처럼 질주한 적이 있었던가? 방향을 잃기 전에 잠시 멈춤의 기술을 발휘할 때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