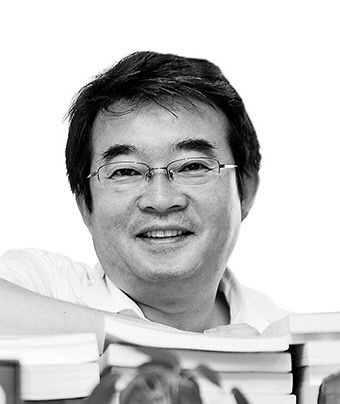
안도현 시인
대구 YMCA 2층 복도는 어둠침침했다. 봄날, 그 복도 양쪽 벽에 시화를 거는 시화전이 열리면 흐릿한 어둠이 단번에 걷히고 우울한 공간은 생기를 얻었다. 1970년대 후반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자주 'Y'를 들락거렸다. 다른 학교 문예반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만나 키득거리던 곳이 거기였고,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학생들과 심심찮게 어울리던 장소도 거기였다. 1층에는 아루스제과라는 빵집이 있었다.
프랑스의 모리스 블랑쇼는 '문학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말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것의 메아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글쓰기가 의미와 정보 전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웅얼거림'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명확한 문자의 의미로 단정할 수 없는 이 메아리는 그 어떤 규범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쓴다는 것은 매혹이 위협하는 고독의 긍정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지배하는 시간의 부재의 위험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자신의 글쓰기가 언젠가는 타인에게 전이되며 언어를 그 전이의 매혹 아래 둔다는 것이다. 이 매혹을 블랑쇼는 "그것을 저버리지도 피하지도 못하고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앞에 멈춰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벗어나 빠져들게 되는 데서 오는 해방"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Y'의 복도에서 우리가 그랬다. 우리는 거기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교감했고 문학소년으로서 서로 경쟁했고 그리고 협력했다. 어느 여학교의 시화전을 둘러보기 전에 선배들이 우리를 불러 모아 놓고 지시했다. 시화전에 출품한 한 사람을 붙잡고 집요하게 질문하라, 그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게 문학을 수행하는 어떤 절차로 여긴 우리는 스스럼없이 악동이 되었다. 시화 액자 밑에 누군가 장미꽃이나 메모를 붙여 놓거나 방명록에서 작품을 칭찬하는 문장을 발견하면 날아오를 듯이 기뻐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삶의 경험과 생각의 조각들을 모으면서 자신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 창작자는 소재를 물색하고 구성하고 문장을 조직하는 동안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려는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된다.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대면하게 되고 미지의 독자가 자신의 글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는 블랑쇼의 말은 글쓰기의 효과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글을 쓰는 순간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며 글쓰기의 결과물이 개인의 성과를 떠나 공동체의 어떤 지침이나 전형이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YMCA 2층 복도에서 이루어졌던 열광은 1990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구 출신으로 문단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복도에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 듣자 하니 대구문학관에서 '동인, 다시 만나는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펼쳐진 대구의 고교문학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조명할 모양이다. 무슨 고등학교 문예반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동인의 이름을 하나씩 내걸고 몰려다녔다. 대륜고의 '씨알', 대구고의 '계단', 대건고의 '태동기', 대구상고의 '소라', 경북여고의 '햇살', 제일여상의 '코스모스'….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십대 후반의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