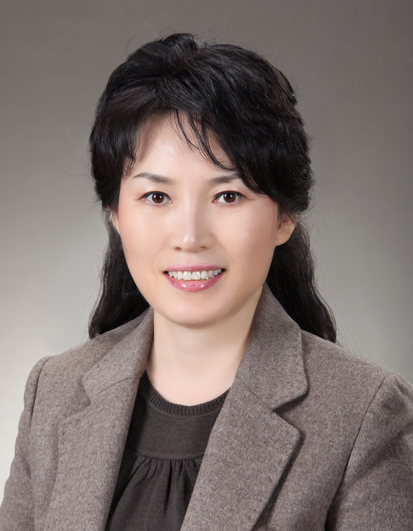 |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구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늘 생각하게 된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 적절히 잘 대처하는 사람을 ‘예절 바르다’ 혹은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한다.
예전엔 부모가 예의바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밥상머리 교육’을 생활화했다. 밖에 나가서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 꼭 하거라,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드려라,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는 쩝쩝 소리를 내지 말고 맛난 음식만 가려서 먹지 마라 등을 수시로 가르쳤다.
필자가 학창시절엔 선생님이 앞서가면 감히 먼저 지나가지 못해 선생님 뒤만 졸졸 따라갔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수업시간에 무엇을 먹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요즘 학력 중심 사회가 되다보니 똑똑하게 키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부모의 최대 관심사다. 식사 중에도 영어단어를 테스트하고, 문제집을 가져다 놓고 한 문제라도 더 풀리려고 애쓰고 있다.
대부분 가정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학생은 학교에서도 자고 싶으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배고프면 수업시간이라도 부스럭거리며 먹는다. 어려운 수학문제도 저만 풀 줄 알면 되지, 학업이 부진한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 성적을 올리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분위기를 흩트리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인지는 관심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이다. 훈계를 해도 듣지 않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부모에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말한다. 이를 들은 부모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학교로 달려간다. 교사에게 지식 전달 이외에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일선 교사의 ‘가르치기 어렵다’는 말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요즘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예절체험학교가 늘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예절이 사회를 밝고 원만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본 가치관으로 마음에 자리잡으려면, 자라나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돼야 한다. 제대로 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된 예절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서정임 <대구차문화원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