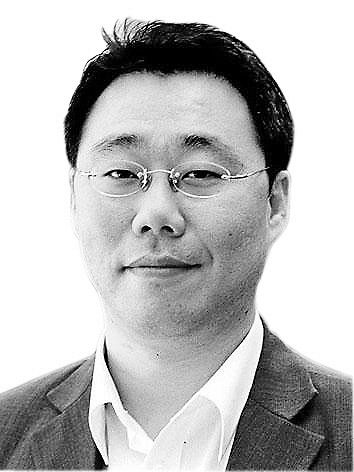 |
| 진식 사회부장 |
'팁(tip·봉사료)'은 한때 해외에 나가서 호텔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에티켓이었다. 아침에 호텔 방을 나설 때 베갯잇에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얹어 놓는 것. 해외로 가는 사람한텐 누군가 꼭 예의범절이라며 일러주곤 했다. 호텔 방을 청소해 주는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종의 문화다.
전 국민 해외여행 자유화(1989년) 이후 '호텔 방 베갯잇 1달러'는 팁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그 시절(1990년대) 우리는 그렇게 팁이란 문화를 받아들였다.
요즘 팁 문화는 주로 식당에서 접한다. 고깃집이나 횟집에서 고기를 구워주거나 음식을 서빙해 주는 이에게 팁을 날리곤 한다. 폭탄주(소주+맥주) 문화와 곁들여지면서 팁을 술잔에 말아주는 경우도 다반사로 볼 수 있다.
골프장에서도 팁은 흔하다. '버디'(기준 타수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일)를 잡고 나면 '버디 값'이라며 캐디(경기 보조원)에게 건넨다. 요즘 골프장에선 이 버디 값을 주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규정화됐다.
베갯잇 1달러나 폭탄주 팁, 버디 값은 모두 소비자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손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면 그만인 것이다. 받는 이의 입장에서도 주면 좋지만 안 줘도 뭐라 할 수 없다.
기분 좋아서 주는 팁을 이제 의무화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맨해튼의 식당가에서는 음식값의 20%가 팁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팁은 10% 수준이었고, 고객의 자율에 맡겼는데 지금은 옛말이 됐다. 계산서에 음식값의 20%를 팁으로 합산해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미국 언론은 무분별하게 팁을 올리자 '팁플레이션(tipflation)', '팁피로증(tip fatigue)', '팁크립(tip creep)'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며 심각한 증후군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선 카카오택시(카카오T)가 지난달 '팁 지불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면서 팁 문화를 둘러싼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휴대폰 결제창에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1천원' '1천500원' '2천원'의 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전적으로 자율이다.
서울의 한 유명 베이커리 카페는 '팁 박스'를 내놓았다가 '직원이 손님을 대하는 건 계산할 때랑 크림치즈 고를 때뿐인데 팁을 줘야 하나'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팁 박스는 인테리어였다'며 슬그머니 치웠다고 한다.
온라인상에선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팁을 줘도 된다'는 의견과 '가격에 이미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팁을 추가로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분명한 건 팁은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베푸는 '호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팁을 강요하는 건 물론 팁을 주지 않으면 체면이 깎일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된다. 팁을 강요하면 '고용주가 줘야 할 보수를 왜 손님이 부담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바야흐로 팁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웃자고 시작했는데 죽자며 달려드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다.
진식 사회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영·호남 공동선언…균형발전 위해 한목소리](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1/news-m.v1.20260117.4cf4c263752a42bfacf8c724a96d3b46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