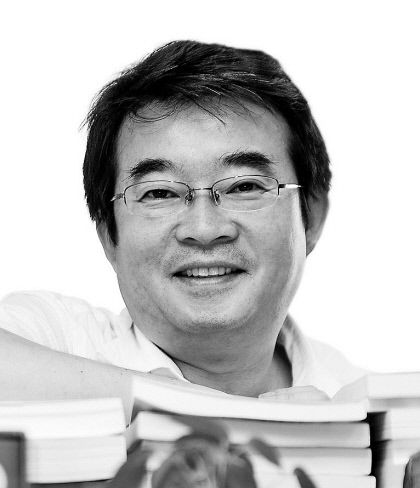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새소리가 궁금해서 한때 꽤 값나가는 카메라를 장만한 적도 있다. 망원렌즈를 장착하고 새를 눈앞으로 끌어당겨 볼 작정이었다. 카메라는 망원렌즈를 한번 끼워보지도 못하고 책상 서랍에서 몇 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 내가 게으르고 굼뜬 탓이었다.
경북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3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다. 박진관은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새에 꽂힌 사람이다. 그는 틈만 나면 대구와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새를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는 어지간한 조류학자 못지않은 조류 전문 사진가가 되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그가 말했다.
"모든 피사체는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 과거가 됩니다."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의 기능을 이처럼 명쾌하게 정리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사진은 시간의 기록이며 생명의 일기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07년 그는 형산강 하구에서 낚싯줄을 몸에 감고 있는 괭이갈매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괭이갈매기는 납덩이 추를 몸에 매단 채 떼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 감긴 낚싯줄 때문에 날아올랐다가 지상에 내려올 때는 왼쪽 다리만 세울 수 있는 외다리 괭이갈매기. 먹이활동을 아예 할 수 없었으니 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 사진은 그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이후 그 사진은 몽매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을 때리는 회초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지런히 촬영한 새의 사진을 모아 박진관은 '새는 고향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은 단순한 사진집이나 조류도감이 아니라 지역에 날아와 사는 70여 종 새의 인문학적 보고서다. 새가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준다는 걸 이 책을 읽고 깨달았다. 대구의 시조(市鳥)는 독수리지만 시청 앞에 설치한 상징물은 '검수리'라고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고, 일본식 한자 '백조(白鳥)'를 버리고 '고니'라고 제대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올해는 내가 사는 동네의 새부터 좀 더 유심히 바라봐야겠다. 마당에는 벌써 박새와 딱새, 뒷산에는 뱁새라고도 부르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직박구리가 보인다. 산까치라고 부르는 어치와 전깃줄에 앉아 있던 후투티, 그리고 앞산 숲속에 사는 딱따구리의 자태는 망원경을 마련해서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 내가 사는 골짜기의 가장 높은 허공을 지배하는 새가 매인지 황조롱이인지 그 숙제도 풀어야 한다.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새들은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3월 말이다. 내성천 흰목물떼새가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 때다. 작년에 자갈밭에서 본 알들은 부화에 실패해서 가슴이 아렸다. 강변의 모래톱에서 다시 새로운 알들을 만나면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겠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