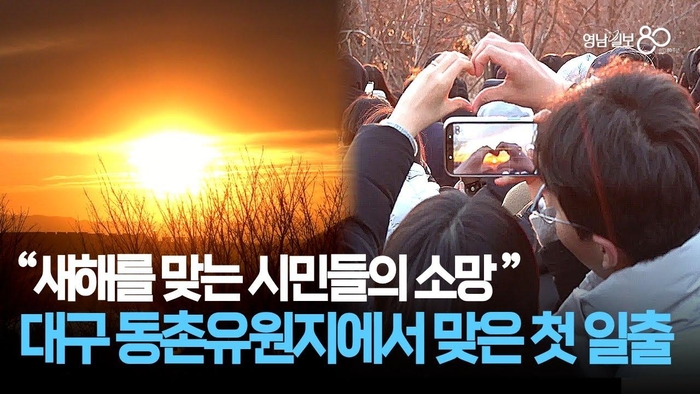마창훈
"그래, 밥은 묵고 댕기나?"
옛말에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랬다. 우리 선조들은 척을 지고 사는 이웃일지라도 그 상대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떠넣어 줄 정도의 넉넉한 아량은 품고 살았다.
좀 더 격을 높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윤리적 이해를 담은 인문학적 사고로 살펴본다면 '내 배가 불러야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그렇게 한숨을 돌려야 상대방 처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미운 놈에게 밥 한 숟가락을 허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이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동원해 어설프게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밥 한 숟가락은 나눠 먹을 줄은 알았다.
이처럼 옛 어른들이 가까이서 살뜰하게 챙겨야 할 이웃도 아닌, 미운 놈에게까지 밥 한 숟가락 남길 정도로 나눔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부족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안에 든 음식조차 빼앗고 싶을 정도로 미운 판국에 오히려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을까.
이 같은 선조들의 넉넉함 속에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과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
나와 다름을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이 쌓이는 것이 미움과 편견이다.
여기서 분출되는 증오가 세상을 향한다면 그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한 사건이 있다.
주변 누군가가 그에게 밥 한 끼 나누며 따스한 위로와 함께 그가 품은 분노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선조들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듯하다.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퍽퍽했던 당시에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끼니 걱정까지 해주는 그런 측은지심을 발휘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 정도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며 편을 가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방법을 체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선조와는 다른 우리들의 일상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치권의 소식은 불쾌지수만 높이고 있다.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간데없이, 천박한 표현과 고성으로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행태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세력 간의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좋은 사례가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진 민주당 내 여론전이다.
4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정말 목불인견이었다.
21세기에도 계엄이라는 현실을 직면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줘도 모자랄 판국에, 논공행상이라도 벌이려는 듯 자리다툼에 열심인 여당.
냉철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동안 박 의원이 쌓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은 격에도 맞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모두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마창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