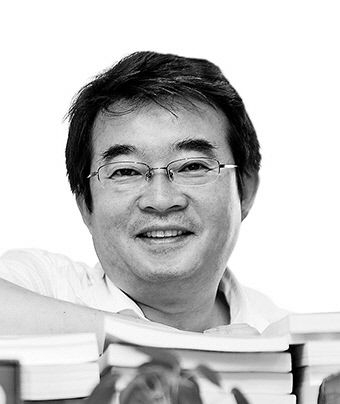
안도현 시인
대구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버스는 세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거창이나 지리산휴게소에서 끝없이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조망하는 일도 꽤 삽상한 일이다.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놓이기 전에는 경부선 회덕역에서 완행열차를 갈아타고 가야 했다. 예닐곱 시간은 걸렸던 것 같다. 1980년에 나는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으로 갔다.
고등학교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문학에 입문한 나는 대구와는 사뭇 다른 전주의 문학 풍토에 적잖게 당황했다. 대구는 언어를 절제하라고 가르쳤으나 전주는 언어를 내지르라고 주문했다. 대구에서는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에 심취했으나 전주에서는 서정주의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했다. 대구에서는 술자리 끝에 가곡이나 흘러간 '뽕짝'을 부르는 일이 대세였으나 전주에서는 판소리 한 대목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정양 시인을 만나 그이를 오래 따라다닌 일. 그것은 전주가 내게 준 행운이었다.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된 시인은 시인으로서 자신을 과시하는 일을 극도로 삼갔다. 그이에게는 가족사의 상처가 있었다. 1920년대에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아버지는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집단 학살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전북 김제 고향으로 귀국한다. 그는 식민지 하의 청년과 농민들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나서게 되고 일제 경찰에 두 차례 발각되어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러다가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 그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 이후 정양 선생님은 아버지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예언했던 날이 있었다. 그날 집안에 구렁이 한 마리가 찾아들었다. 이 이야기는 정양 선생의 입에서 "유난히 터놓고 지내는 사이"인 소설가 윤흥길에게로 전해졌고, 윤흥길의 소설 '장마'의 모티프가 되어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나는 무엇보다 시인으로서 정양의 시를 좋아한다. 바닷가 모래밭에 누군가 "정순아보고자퍼서죽껏다씨펄"('토막말' 한 구절)을 써놓고 간 이야기도 웃음을 자아내지만 2023년에 나온 시집 '암시랑토앙케'(몰개)의 질펀한 해학과 일탈의 언어를 흠모한다. 외동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사는 여산댁 외딴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19금'의 시처럼 아슬아슬하고, 고려공산당을 창립하고 부안에서 여생을 보낸 김철수의 '백비' 이야기는 역사의 상흔을 직격하듯 보여준다. 손택수 시인의 말마따나 "완결된 정제미를 중시하는 고전주의 미학"은 정말 발 들여놓기 민망한 시집이라 해야 할 것이다.
정양 시인은 1933년에 김기림이 신석정을 '목가시인'으로 부른 이후 신석정을 내내 그 규정에 가두어 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석정의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희생적 시정신의 상징쯤"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시인은 신석정 시의 역사성을 누구보다 앞서 밝히려고 했다. 정양 시인은 안타깝게도 올해 5월31일 오후 지병으로 눈을 감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그이의 헐랑한 빈집 같은 홈페이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양 시인의 마음의 길을 엿보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www.jyang.org)를 찾아보면 될 것이다. 특히 2005년 방북했을 때의 기록은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흥미로운 에세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