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은 저자가 4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강남의 실제 모습을 다룬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풍경.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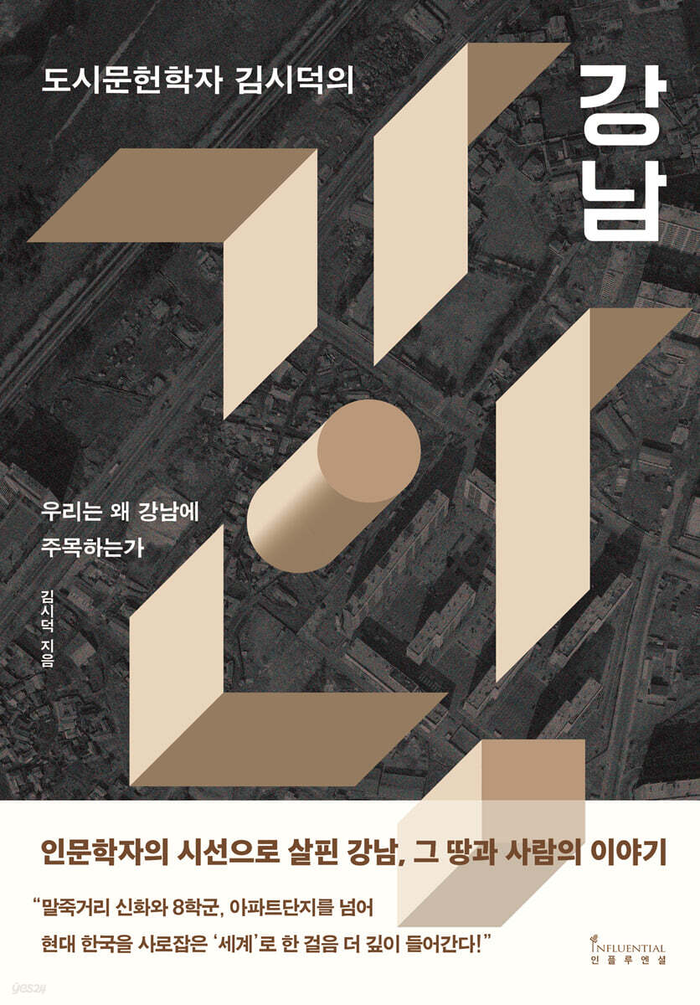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김시덕 지음/인플루엔셜/427쪽/2만4천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강남'이다. 강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구·송파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통한다. 거주자 규모로는 국내 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집값, 교육열, 철거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이슈를 주도하는 공간이다. 신간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은 저자가 4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강남의 실제 모습을 다룬다. 강남 3구 곳곳에서 살아본 경험에 더해 두 발로 누빈 답사 현장, 각종 문헌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전달한다. 인문학자의 고유한 시선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짚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다.
책은 난개발에 시달리던 이곳이 어떻게 경제적 성공을 거뒀는지, 강남적 삶의 양식이 현대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고 싶은 강남'과 '사고 싶은 강남'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탐구한다.
강남이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오래되지 않았다. 개발의 시작은 1968년 영동지구(서초·강남구)였다. 원래 정부가 전쟁에 대비해 인구를 분산하려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을 추진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간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때 재벌 기업부터 원주민인 농민, 강북에서 이주한 철거민 등 수많은 사람이 개발에 투자하면서 집값이 치솟았다.
저자는 강남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아파트, 산업, 교통을 꼽는다. 강남은 한때 섬유단지, 산업철도 유치 등을 고려했지만 이를 접고 대기업과 첨단 정보통신(IT)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와 백화점 등 유통 기능을 결합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자본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다만 과제가 없지는 않다. 이곳 지형은 수해에 취약하다. 이 탓에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데, 배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도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선거철마다 언급되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논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폭우를 대비한 대심도 유수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강남의 미래에 상당히 낙관적이다. '강남적 삶의 양식'이 전국 도시계획의 기본 틀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복합 쇼핑몰+수변 공간'으로 구성된 요즘 신도시의 모습은 강남에서 시작됐다. 반도체 벨트를 따라 경제·행정적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도 짚는다. 이로써 강남이 '확장하는 1극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제2의 강남은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다. 저자는 강남 3구가 사람과 자원을 외부에서 흡수하기만 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인 김시덕은 인문학자이자 도시 답사가이다. 서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책 '한국 도시 아카이브' 시리즈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한국 도시 아카이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철거되는 기억' 등 도시와 관련한 수많은 저서를 펴냈다.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K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엔 서울시문화상 학술 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