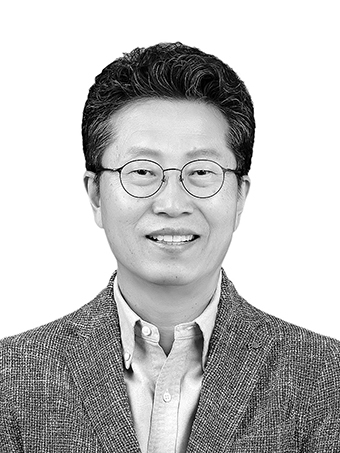
서민교 대구대 명예교수·(전)총장직무대행
최근 세계는 '총 대신 관세'가 무기가 되어버린 지경학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정학(Geopolitics)이 지리적 요인이 외교·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에 비해, 지경학은 국가의 전략적·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중 간 통상 분쟁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 경쟁을 벌였던 것과 달리, 최근 미·중 간 통상 분쟁은 미국이 고관세 정책 및 기술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희토류 등에 대한 자원 무기화로 맞서고 있다.
미·중 사이에 위치한 샌드위치 국가이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체제여서 누구보다도 지경학적 위험에 크게 노출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정부 차원에서 지경학적 이슈가 산업정책·AI·과학기술·외교·방산·기후 환경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만큼 축구의 리베로처럼, 경제와 안보를 넘나드는 유연한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안보의 시각으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시각으로 안보를 이해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둘째, 정부·학계·경제계가 각종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장단기 대응을 고민하는 지경학 학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의 '지경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인·학자·정부 관료 등이 함께 토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지경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학계·정부·산업계 간 교류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략 지역에 대한 지역학 연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각 지역의 언어와 정치, 문화에 정통한 전문 인재를 육성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LG가 트럼프 1기 시절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조 헤이긴을 영입한 바 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는 시나리오 경영기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다국적 공급처로 분산하고, 일부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경학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다. 지경학 시대의 위협은 예측이 어렵고 파급력이 크지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오히려 새로운 산업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정부·기업·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경학적 도전의 파고를 넘어야할 때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