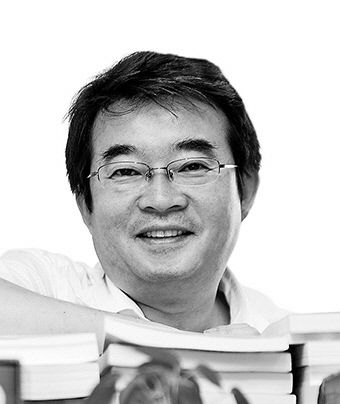
안도현 시인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지역에 국한되어 전개된 민중항쟁이 아니다. 아직도 전봉준을 비롯해 혁명을 주도한 몇몇 이름들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경북 북부 지역이 동학농민군의 주요 근거지며 전적지라고 말하면 대개는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1894년 갑오년 한 해, 상주와 문경, 예천 등 경북 서북부 지역은 동학농민군이 민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그 흔적이 늦었지만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예천 용문면 금당실은 『정감록』에 '십승지'의 하나로 적혀 있는 마을이다. 전쟁과 흉년 등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땅이라는 말이다. 금당실은 16세기 초부터 조성된 마을로 고택과 초가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송림이 매우 아름다운 전통마을이다. 잘 정비된 골목길과 돌담도 오래된 마을의 풍취를 멋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나는 용문면행정센터 바로 앞에 있는 용문정미소의 낡은 양철지붕과 부스러진 흙벽 앞에서 자주 발길을 멈춘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쓰러운 안간힘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금당실이 예천 동학농민군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였다. 1894년 3월 관동대접주 최맹순은 예천 소야(지금은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에 접소를 두고 교도들을 모았다. 옹기 장사꾼으로 위장한 그는 동학으로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문경과 예천 유천면과 용문면 등 인근 지역을 돌며 수만 명의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8월에 예천 읍내를 장악한 농민군은 금당실의 함양 박씨 유계소로 쓰던 가옥을 점거해 접소를 설치했다. 이를 금곡포덕소라고 부르고 접주는 권순문이 맡았다. 금곡포덕소는 예천 읍내 유림들로 구성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체포된 동학농민군 11명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8월 10일 유림들은 한천 모래밭에 이들을 생매장하는 참극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때부터 경북 북부와 충청도 지역 농민군들이 분개하여 예천으로 몰려들었고, 크고 작은 접전이 이어지게 된다. 금당실에 살던 전기항은 농민군의 '모량도감'을 맡아 군량미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풍채가 걸출해서 '전도야지'로 불렸던 그는 농민군의 관군에 패퇴한 뒤 백두대간 골짜기에 여러 채 움막들을 짓고 피신했다고 알려졌다. 전기항의 고손자 전장홍은 2021년 창립된 사단법인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최근까지 맡기도 했다.
볕 좋은 가을날 오후, 뒷짐 지고 금당실 골목을 걸었다. 예천군에서 새로 조성한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동학난 당시에 동학의 북접이 금당실 마을에 본부를 두고 관군을 격파해 버린 일이 발생하여 병과불입지지(兵戈不入之地)로서의 명성이 흔들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문장 때문이었다. 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철딱서니 없는 소리인가.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도 '동학난'이라는 봉건적인 명칭은 1970년 이후 사라졌다. 사리에 어둡고 우매한, 역사의식이라고는 머리털만큼도 없는 문장 앞에서 슬펐고 부끄러웠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2004년이다. 금당실에는 '십승지'라는 근거가 애매한 비석이 곳곳에 서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팻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금당야행'이라는 이름의 한 해 가장 성대한 축제에도 동학농민혁명은 없다.
애초부터 모르는 것일까, 애써 가리려고 하는 것일까. 모르면 모름지기 배워야 하고,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라면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