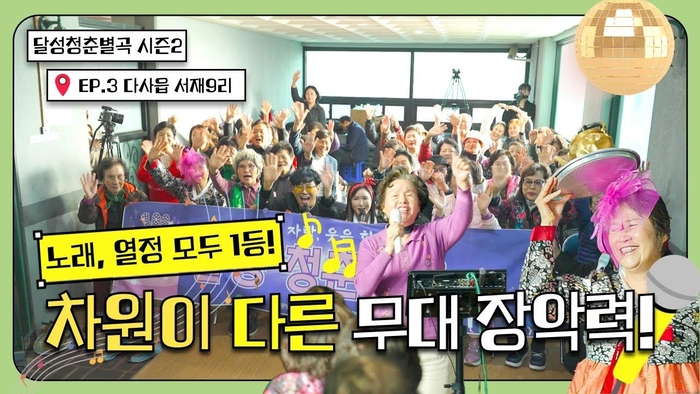배정순 〈전〉경북대학교 초빙교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병리를 임상적으로 진단할 때 '멘탈 디스오더 (Mental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더(order)는 '질서, 정돈, 규칙, 조화'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디스(dis)는 부정이나 반대, 혹은 거리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정신병리, 마음의 병은 질서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 정돈이나 규칙과는 멀어진 혼돈이나 무질서를 의미한다. 마음의 병은 결국 주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깨어지고 분열된 혼란의 상태를 극복하고 균형과 질서의 중심을 다시 찾는 것이다.
신체 건강 역시도 고유의 균형,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면역체계나 자율신경 등이 질서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각종 건강검사에서 보는 주요한 수치도 건강을 유지하는 표준질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그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균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영역의 균형과 조화 역시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하게 얽힌 그물망과 같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몫을 해내고 인정받고, 또 공정하고 조화로운 평가와 대가가 주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영역의 건강도 결국은 공동체의 질서가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다.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본 질서가 작동해야 하며 규범과 법이 그 상식을 보상하거나 보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중용의 덕을 중요하게 여겼다. 중용의 미는 인간 내면의 절제와 사회적 조화를 함께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 실천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는 '중용자잠'에서 하늘은 사람에게 선을 즐기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운 짓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본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도(道)'라고 정의하였다. 중용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중용은 유교의 핵심 덕목의 하나로, 조화와 균형의 도를 뜻한다. 무게 중심점은 사물이나 몸이 평형을 이루는 중심점이다.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심이 흔들리면 쉽게 기울거나 넘어지게 된다. 물론 중용의 미덕은 단순히 공간적인 중간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가장 알맞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 그에 따른 행동이 상황에 따라 정도에 맞고 조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도덕의 의미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고,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제대로 보고 판단하여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과소하지 않은 올바른 중간을 정하는 것을 덕이라 하였다. 논어에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여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며 중용의 미덕을 중요하게 여겼다. 중심점을 제대로 알고 중용의 미를 지킬 때 개인도 사회도 질서와 균형, 바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균형점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때와 장소,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형성해온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한 질서와 균형, 믿음이 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 더 조화로운 균형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중용의 미는 고전 속에 박제된 덕목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와 혼란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하나의 무게 중심이길 바란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극단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 중용의 지혜를 실천해보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