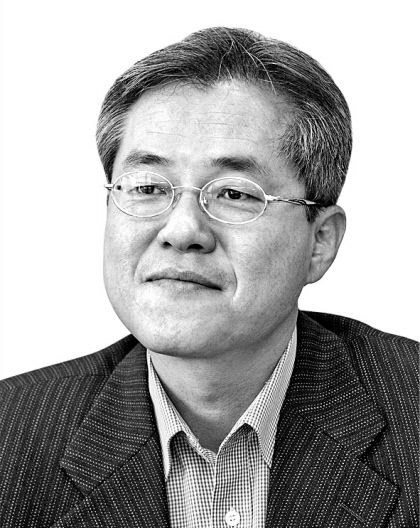 |
| 논설실장 |
시간이 나면 늦은 밤이라도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1만보 앱을 깐 탓도 있지만 걸으면 구경할 것이 많고 또 고급스럽게 말해 사색도 된다. 한때 살았던 중구 대봉동 소방도로를 지나다 가로등을 반사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가림막 위로 앙상한 골조가 보이는데 참으로 인상 깊어 한편 괴이할 정도였다. 재개발 현장이다. 저건 다른 건축물인데 왜 뜯어낼까? 며칠 뒤 영남일보에 기사가 떴다. 이 건물은 한양가든이란 19세대 주택단지로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고(故) 김석철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그는 서울 예술의전당, 서울대 캠퍼스를 설계했고,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국내 딱 2개밖에 없다는 그의 작품, 주택단지가 콘크리트 재로 변하는 현장을 나는 목도한 셈이다. 한양가든은 1982년 세워졌다.
동성로를 가끔 돌아보기도 한다. 내가 가장 늙은 축에 들었다는 생각에 위축도 되지만 어릴 적 살던 곳이라 추억이 있다. 그곳 골목은 대구에서 가장 핫하다는 클럽골목이 됐다. 그 가까이에는 대구시립도서관이 자리했다. 둥근 창문이 고풍스러웠던 이 도서관은 원래 일제강점기 대구법원 건물이었다. 오래전 철거됐다. 지금은 대형 놀이공간 건물에다 옆에는 40층 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황금빛 조명에 벽돌이 드러난 경북대 의과대학이 신호등 뒤로 서 있다. 내년이면 100년이 된다는 저 공간은 살아남았다. 그러고 보니 조깅하면서 즐겼던 신천의 경부선 철길 다리가 떠오른다. 역시 일제강점기 다리인데 런던의 그것처럼 아름다운 아취형 교각이었다. KTX 하중을 감안했는지 허물고 새로 세웠다. 정말 볼품없는 교각이다.
위로가 되는 것들도 있다. 삼덕초등 인근은 한때 개발 세력이 존재했다. 아파트 개발에 유혹됐다. 반대 시민단체가 나섰다. 주택단지로 존속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고 어쩌면 장기적 부동산 가치도 더 있을 것이란 논리가 통했다. 갈 때마다 주택을 개조한 예쁜 카페가 생겨난다. 왠지 즐겁다.
북성로 대구연초제조창은 10여 년 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허무느냐 마느냐의 논쟁이었다. 1923년 지어진 이 공장을 외국 전문가가 와서 둘러보고는 '넓고 깊은 공간'이 인상적이라며 전시공간이면 좋겠다는 안을 냈다.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만 살아남았다. 지금의 예술발전소다. 연초제조창 동쪽, 북성로 공구골목은 대구 근대화의 상징 골목이다. 100년 전 건물이 수두룩한데 대구 시민이 좋아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선다. 파리 유학을 갔다 온 한 후배는 파리는 더 이상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다고 했던가.
범어네거리에 50층 넘는 아파트가 사방을 포위할 모양이다. 누군가 팔자에 없을 질문을 한다. 50년, 100년이 지나면 저 건물도 허물어야 할 텐데 어떡하냐고. 대화에 끼어든 부동산 전문가가 말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땅값에 수렴하니까.' 낡은 건물은 매몰 비용을 뺀 땅값으로 떨어지고, 그 땅의 부가가치가 존속한다면 건물은 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천지에 널린 허연 아파트부지는 땅값에 수렴한 결과물이란 뜻이다. 도시는 공간의 집합체이다. 건물이 사라지면 그 속의 사람도, 기억도 함께 스러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산책길은 더욱 공허해질 게 틀림없다.
논설실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