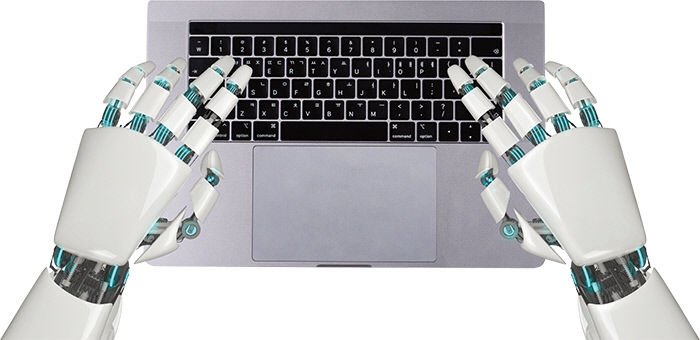 |
|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
대구에 영화 후반작업 시설이 들어섰다. 구체적으로는 촬영이 끝난 영상의 장면을 교정(주로 색보정)하는 DI(Digital Intermediate) 작업과 디지털시네마 시스템의 표준 상영 포맷인 DCP(Digital Cinema Package) 작업 등이 가능한 시설이다. 특히 색 보정은 연출자가 원하는 영화의 색감과 톤을 조정하는 작업인데, 이 과정을 통해 영화는 한 단계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영화는 기술집약적 예술이다. 영화의 제작과정은 사전제작(Pre-Production)-제작(Production)-후반제작(Post-Production) 단계로 나뉜다. 이 과정 중 자료 조사, 시나리오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전제작 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정에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많은 기술이 활용된다. 촬영이 이루어지는 제작단계에서는 촬영장비, 조명장비, 녹음장비 등이 주로 쓰이는데 렌즈에서부터 마이크까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가 없다. 후반제작 과정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DI작업 외에도 사운드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 작업 과정에서 배우들이 대사를 보다 선명하게 다시 녹음하는 후시녹음(ADR), 발자국 소리 등을 녹음하는 효과음 녹음(Foley) 등이 이루어진다.
제작을 아우르는 단계 외에도 우리가 완성된 영화를 접하는 과정인 상영 단계도 마찬가지다. 극장의 영사시스템은 200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확산과 더불어 필름영사기에서 디지털영사기로 대부분 교체되었다. 이제 필름영사기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 디지털영사기를 통해 상영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리적인 필름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0과 1로 조합된 디지털 파일만 있으면 된다. 홈비디오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VHS테이프와 DVD와 같은 물리적인 매체가 있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OTT, VOD 등 서비스에서 알 수 있듯 물리적 매체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영화 제작 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필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필름 카메라는 물론이거니와 필름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일반인이 영화를 찍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은 이러한 진입장벽을 거의 무너뜨리다시피 했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형 캠코더가 대량 보급되면서 일반인, 영화지망생, 전문 창작자 등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앞당기기도 했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장비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자 초급자에 대한 교육과 작품 제작에 대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한국 최초의 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액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50여 개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역시 그중 하나로 2007년 4월에 개관해 지금까지 약 16년간 운영되어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영화라는 예술이 특정 영역, 말하자면 장인의 영역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영역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늘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는 기술집약적인 예술임에도, 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해 온 예술이기도 하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영화가 가장 사랑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디스토피아 영화의 원형으로 알려진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 폴리스'(1927)는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무성영화이다. '메트로 폴리스'는 고도로 발달된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지하 세계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끊임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며 마치 기계부품처럼 살아가는 반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서 예술과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영화는 이 같은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기술이 발달한 미래 사회가 장밋빛 미래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기계화된 문명의 인간 소외와 노동 소외 등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 의식도 그 의미가 크지만, 또 한편 이 영화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영화가 구현해 낸 미래 사회의 이미지가 그 시대의 산물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트로 폴리스'는 영상물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최근 기술의 발달을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AI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영화계에서도 AI를 활용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AI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촬영된 영상의 CG와 편집 작업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영화가 많은 자본과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AI 기술은 돈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영국의 영화등급분류위원회(BBFC)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등급분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영상물 등급 분류에 AI를 이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요즘 가장 화제인 챗GPT를 만든 Open AI는 자신들의 임무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시스템)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신중하게 추구한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는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의 컴퓨터 마우스를 허공에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온다. 그 흔한 마우스를 다루는 것조차 한 노동자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이 장면은 인간이 기술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징후적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기술은 분명 필요하다. 또한 영화와 관련된 기술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또 한결같이 경고할 것이다. AI가 가져다주는 혜택과 더불어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윤리 의식이 무엇인지, 그 위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영화는 늘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