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백승운 문화부장 |
문화부로 오기 전 근무했던 부서가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이다.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해 콘텐츠화하는 영남일보 부설 연구원이다. 이곳에서 13년 가까이 일하며 180여 건의 스토리텔링 과제를 수행했다. 의뢰 받은 용역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과제가 '선산 장원방(壯元坊)'이다.
장원방은 옛 영봉리를 일컫는다. 지금의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와 노상리, 완전리 일대를 말한다. 조선시대 이 마을에서는 무려 15명의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선산 부사를 지낸 김치를 시작으로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정초, 김숙자, 하위지, 김종직 등이 이 마을 출신이다. 이 중 장원급제자가 7명, 부장원이 2명에 이른다. 예부터 '인재향의 으뜸'으로 꼽는 이유다. 이러한 영봉리를 조선시대에는 장원방으로 불렀다. '장원급제자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처음 장원방 스토리텔링을 의뢰 받았을 때는 막막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15명의 과거급제자가 나온 사실은 놀라웠지만, 현장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관련 문화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생가는 흔적도 없었다. 그들이 공부했던 곳도 구전으로만 전해질 뿐이었다.
효행이 지극했던 김치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내렸던 정문(旌門)은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단계 하위지가 공부했던 독서당(讀書堂)과 그가 수양대군의 횡포에 반기를 들고 한때 낙향해 거처했던 공북헌(拱北軒)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위지가 장원급제 후 금의환향할 당시 기념 식수로 심었다는 회화나무는 어느 민가의 담벼락에 끼여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나마 인근에 15명의 간략한 이력을 새긴 비석이 옛 명성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용역은 2년여에 걸쳐 진행했다. 2015년 초부터 스토리 발굴에 나섰다.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장원방 출신 인재들의 이력이 담긴 옛 문헌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을 훑어보며 과거 시험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허허벌판인 현장이었지만 수시로 들락거렸다. 흩어진 역사의 조각을 맞추면서 이야기의 줄기를 잡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장원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박은호 전 구미문화원장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
2년여에 걸쳐 발굴한 스토리는 용역 기간 중 영남일보에 두 차례 장기 시리즈로 연재됐다. 시리즈를 엮어 2권의 책으로도 펴냈다. 결과물이 세상에 나오면서 구미에서는 장원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6년 9월에는 시민과 출향인 200여 명이 '장원방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구미시에 제안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구미시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선산 장원방 사업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장원방을 콘텐츠화한다는 내용이었다. 2026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3만721㎡)에 장원방 기념관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구미의 대표 상품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협약식 이후 장원방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한다. "사업 자체가 보류됐다"는 말도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스토리텔링연구원을 떠나 문화부에 있지만 여전히 '선산 장원방'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스토리였고 파급력이 큰 콘텐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테마를 접목할 땐 대중성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구미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승산이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백승운 문화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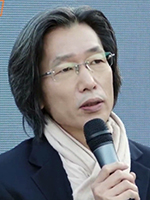
백승운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