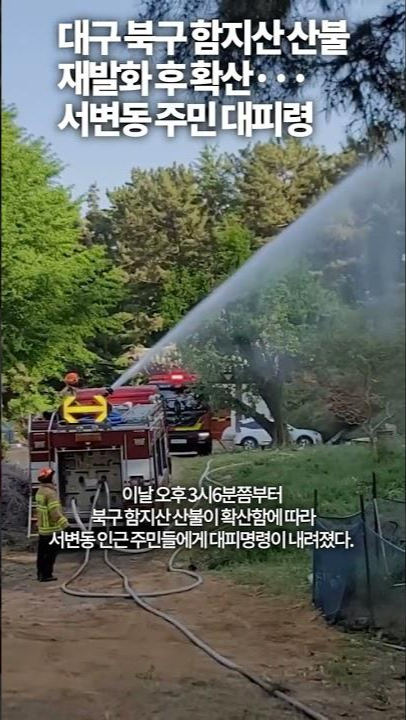![[민병욱의 민초통신] 詩人들이 그린 대통령](https://www.yeongnam.com/mnt/file/202502/2025021701000509000020891.jpg) |
|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
우리는 참 대통령 복이 없는 국민이다. 초대부터 지금까지 20대, 13명 대통령(3명이 중임)이 있었으나 5명이 중도사임, 암살, 탄핵 파면당해 자리를 떴다. 퇴임 후 4명이 감옥에 갔고 한 사람은 수사받다 스스로 삶을 던졌다. 민주화 이후에는 8명 모든 이가 본인과 가족 비리에 얽혀 곤욕을 치렀다. 흠 없이 존경받으며 직을 마치고, '걱정 없이' 여생을 누린 대통령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시인들은 우리 대통령이 약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욕심 없고 너그러운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길 바랐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5개월 앞둔 1997년 7월, 동아일보에 글 한 편이 게재됐다. 신문사에서 청탁한 원고가 아닌 듯 글은 39면 독자투고란 귀퉁이에 실렸다. 분명 '시'인데 '시'란 설명은 붙지 않았다. 제목은 '우리가 기다리는 대통령', 글쓴이는 '임보(본명 강홍기·충북대 교수)'. 이름 뒤에 '시인'이란 설명 역시 붙지 않았다.
#임보, '우리가 기다리는 대통령'
"수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라이트를 번쩍이며 리무진으로 대로를 질주하는 대신, 혼자서 조용히 자전거를 타고 한적한 골목길을 즐겨 오르내리는/ 맑은 명주 두루마기를 받쳐입고 낭랑히 연두교서를 읽기도 하고, 고운 마고자 차림으로 외국의 국빈들을 환하게 맞기도 하는/ 더러는 호텔이나 별장에 들었다가도 아무도 몰래 어느 소년가장의 골방을 찾아 하룻밤 묵어가기도 하는/ … /그러한 우리들의 대통령/ 당신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가." 시 중간엔 '의회 건물보다 문화관 도서관을 더 크게 짓고' '팔리지 않은 그림도 더러 사주며' '육자배기를 신명 나게 뽑아대고' '다스리지 않음으로 다스리며'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듯 그려냈다. 단 우리 세상에 그런 티 안 내는 대통령은 없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였을까. 이미 '우이동 시인들' 대표 시인으로 잘 알려진 그는 '시인'이란 티도 안 내고 단순 투고 형식으로 글을 보냈다. 나중에 입소문을 타고 넓게 전승된 '우리가 기다리는 대통령'은 그렇게 일반 독자의 편지들과 섞여 발표됐다.
#신동엽, '산문시 1' 석양 대통령
임보 시인보다 30년 앞서 현실에선 보기 힘든, '평범한 직업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노래한 시인이 또 있었다. 신동엽 시인이다. 장편서사시 '금강'과 '껍데기는 가라' 등 참여시로 이미 유명했던 그는 1968년 11월 '월간문학' 창간호에 '산문시 1'을 발표했다. 먼 나라 이야기에 정치를 절묘하게 접목한, 동화책 그림 같은 시였다.
"스칸디나비아라던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시의 중간엔 휴가 가는 총리에게 좋겠다 한마디 던질 뿐 건성으로 역장실로 들어가는 서울역장,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새 꽃 지휘자 극작가 이름은 훤히 아는 어떤 나라 시민들, 사람 죽이는 시늉 안 하고도 아름다운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과 전쟁 무기 미사일과 탱크를 죽어도 못 받는 중립국 국민의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그런 나라이니 자전거에 막걸리를 싣고 시인의 집에 놀러 가는 '석양 대통령'이 시인에겐 사무치는 그리움처럼 다가올 터이다.
#김수영, '그놈의 사진을 떼어…'
바라기만 할 뿐 현실에선 찾아지지 않는 대통령상(像)은 물론 현실의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서 비롯됐다. 1960년 4월26일, 무능 무분별 무책임한 대통령이 학생들의 '피어린 절규'에 못 이겨 하야를 천명한 그 아침 김수영은 격정적으로 시를 써 내려갔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 웅장한/ 기념탑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이제야말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놈의 사진을 태워도 좋다/ 협잡과 아부와 무수한 악독의 상징인/ 지긋지긋한 그놈의 미소하는 사진을 …/ 선량한 백성들이 하늘같이 모시고/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던 그 사진은/ 사실은 억압과 폭정의 방패였느니/ 썩은 놈의 사진이었느니/ 아아 살인자의 사진이었느니/ … "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총 맞고 죽어간 초등학생이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쓴 교과서가 데모의 배후"라고 절규한 시절이었다. '국부'라는 추앙까지 받은 대통령 아래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고등학생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르던 그 시절이었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쓴 시인이다. 그가 대통령 사진을 밑씻개로 삼겠다는 이 처연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김남주, '대통령 하나'
1991년 신동엽 문학상을 탄 김남주는 50을 채 못산 삶의 절반을 감옥과 병마에 갇혀 지냈다. 비상계엄으로 세운 유신정권, 긴급조치의 잔학성과 광주의 한에 몸서리치며 차곡차곡 시를 써 내려간 그는 시인보다는 전사(戰士)로 불리기를 원했다. 감옥에서 "펜과 종이가 없어 은박지에 칫솔이나 못으로 시를 쓴" 그도 나라의 아픔과 병통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걸 시 '대통령 하나'에 남겼다.
"…/ 나는 왜 나를 친애까지 했던 그들을/ 이를테면 이아무개 박아무개 전아무개 같은 이들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기꾼 폭력배 정상배 매국노 반역자…/ 그따위 이름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가/ 혹시는 내 입이 워낙 더러워서 그러는 것일까/ 혹시나 내 출생이 워낙 천해서 그러는 것일까// 나 태어난 이 강산에서/ 아름다운 이름의 대통령 하나 갖고 싶다/ 나 죽어 이 강토에 묻히기 전에 아름다운 추억의 대통령 하나 갖고 싶다/ …"
고통받던 시인이 끝내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추억의 대통령을 갖고 싶다고 절규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또 한 명 대통령의 불행을 보고 있다. 아니 한 명 대통령의 무도 무법 무능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울분을 못 이겨 몸서리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수많은 '헌정사상 첫 현상'들까지 지켜보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참 대통령 복도 없는 국민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