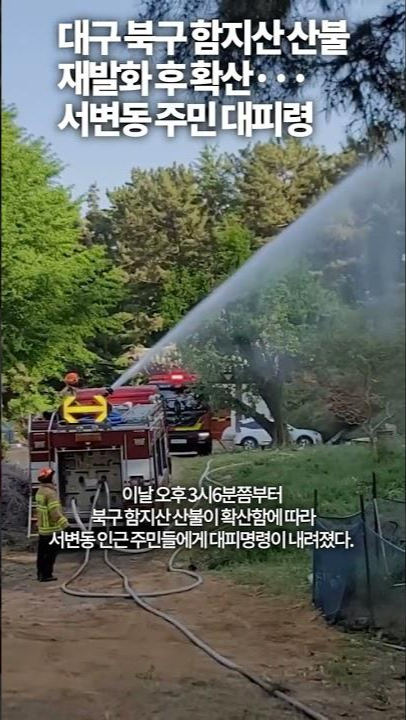![[더 나은 세상] 정면승부는 없다](https://www.yeongnam.com/mnt/file/202503/2025030501000129500005731.jpg) |
| 우광훈 소설가 |
지난주 토요일, 경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뭐, 딱히 여행의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항상 내 주위를 맴도는 유령 같은 것들, 떨칠 수 없는 불안이나 무기력함, 내적 부조리 같은 것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첨성대 앞 드넓은 잔디밭도, 황성공원 내 이경록 시비(詩碑)도 내 우울한 마음을 달래 주진 못했다. 난 여전히 목말랐고, 시야는 희부윰했으며, 불규칙한 이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여행의 운명이란 것 또한 난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난 텅 빈 상태로 대구행 기차에 다시 몸을 실어야만 했다.
아화역을 지날 때쯤, 뜻밖에도 티브이에서 본 적이 있는 격투기 선수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만두귀에 얼굴에 흉터가 잔뜩 나 있는 그는 프로전적이 10전이 넘는 베테랑 선수였다. 난 호기심에 못 이겨 결국 먼저 말을 건넸다. '케이지의 모든 문이 닫히고, 시작종소리가 울리면 무섭지 않느냐'라고. 그러자 그가 답했다.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죠. 하지만 거친 몸싸움과 함께 한 대 된통 맞으면 '아,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전 불타오르죠. 전 정면승부를 좋아해요. 그저 케이지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는 새끼들은 재미없어요."
이후,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정면승부'라는 네 음절의 단어 하나뿐이었다. 그 강렬하고 선동적인 단어는 동대구역을 벗어나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좀처럼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솔직히 고백건대, 정면승부란 것은 나란 인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난 언제나 신중과 관망, 그리고 인내를 핑계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나는 삶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소설가로서의 삶, 가장으로서의 삶, 아들로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난 그저 케이지 주위를 빙빙 맴돌며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재미없는 아웃복서였던 셈이다.
아웃복싱이 내 삶의 방식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어린 동생의 죽음 이후부터였다. 1993년 가을, 갑작스레 동생을 잃은 난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길로 빠져들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은 찰나와도 같고, 결국 우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권태와 부조리 속에 갇혀 결국 고통받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어느 성자의 고백을 신앙처럼 믿고 따랐다. 그래서 난 정중동이니, 물아일체의 현묘한 이치 같은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는 이들의 언어를 경계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 아니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약함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요,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다. 난 승부를 걸기 전에 이미 패배를 확신하고 있었다.
결국 나에게 있어 정면승부는 허무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그 어떤 승부에서 이겨본 들, 우린 다시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탐욕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기름진 무언가를 매일매일 입안에 쑤셔 넣어야만 한다. 계속 불어날 것만 같은 돈주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시지프스의 형벌과도 같은 일상을 견뎌내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 이 순간, 난 다시 한번 그에게 묻고 싶다. 그래도 당신은 정면승부를 선택할 것인가? 인파이팅도, 아웃복싱도, 그 자체로 비극인 생(生) 안에서?
우광훈 소설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