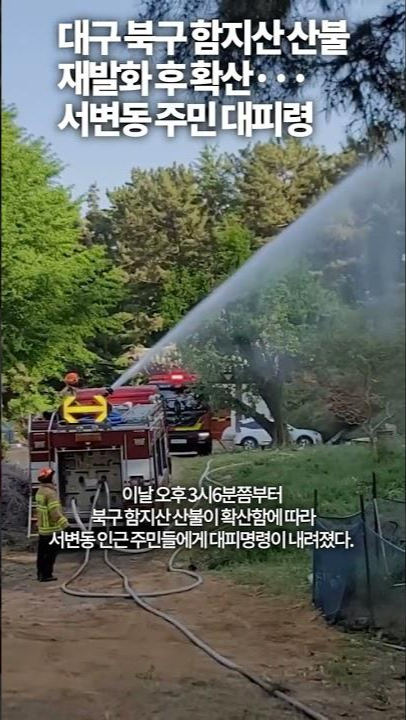![[정만진의 문학 향기] 천천히](https://www.yeongnam.com/mnt/file/202503/2025030501000151300006291.jpg) |
| 정만진 소설가 |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1989년 3월7일 29세 나이로 타계한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다. 유년의 소년이 비 오는 저녁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이고 있다. 시장 간 엄마가 늦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소년은 걱정이다.
일반인은 해가 저문 지 오래라고 하지만, '엄마 걱정'에는 '시든 지 오래'로 표현되어 있다. 시인의 수사법은 보통사람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외롭기 한이 없다'식 노랫말은 작사가가 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숙제를 천천히 하는 대목도 시인다운 감수성을 말해준다. 숙제를 천천히 한다고 해서 시간까지 천천히 흐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소년은 숙제를 천천히 한다. 시인은 성인이면서도 그같은 유년의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유년의 마음을 동심이라 한다. 동심은 어른에게도 본래 있었다. 그것이 사회화되면서 침전되었을 뿐이다. 힘든 삶을 살아간 '아주 먼 옛날'의 '엄마'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기억으로 떠오르는 성인은 동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동심의 세계에도 계산은 있다.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자매도 숙제를 '천천히' 한다. 하지만 '엄마 걱정'의 소년과 이유가 다르다. 숙제를 할 때에는 어른들이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매는 정밀하게 계산했다.
순자의 성악설, 1274년 3월7일 타계한 아퀴나스의 원죄론 등은 계산하는 동심에 주목한 인식이다. 불교는 어린 아이의 얼굴을 천진(天眞) 즉 하늘의 모습으로 보는데, 동심의 세계에 계산이라니!
그렇다고 어린 아이와 성인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동심을 간직한 덕분에 천천히 늙어가는 성인들도 많다. 그런 사람은 천천히 '천사의 얼굴(사도행전 6:15)'이 되어간다.
'열무 삼십 단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살지만 '찬밥 같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도 사회적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물론 그가 나 자신일 수도 있다. 그 역시 아름다운 일이다. 〈소설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