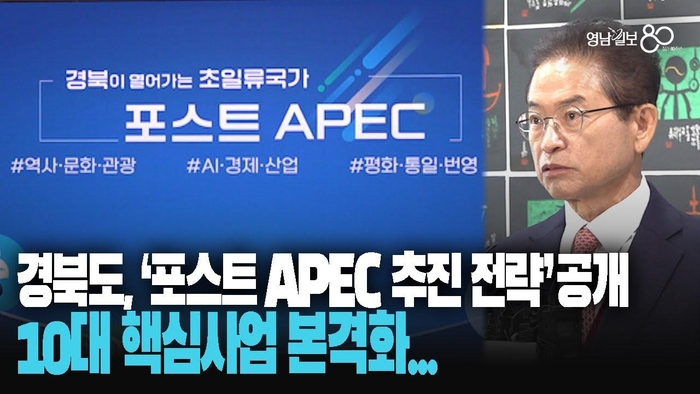![[甘川 百五十里를 가다 .29] 잊혀진 소왕국 ‘감문국’](https://www.yeongnam.com/mnt/file/201310/20131029.010130748280001i1.jpg) |
|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의 연못인 동부연당은 1천700여년 전 감천 주변을 지배하던 小國 감문국의 궁궐연못으로 알려져 있다. |
![[甘川 百五十里를 가다 .29] 잊혀진 소왕국 ‘감문국’](https://www.yeongnam.com/mnt/file/201310/20131029.010130748280001i2.jpg) |
| 향토사학계에 따르면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금효왕릉은 감문국 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김천의 옛 지명인 ‘금릉(金陵)’이 금효왕릉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있다. |
문헌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쇄를 담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역시 다양한 정치세력의 각축장이었고, 수많은 소국이 등장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고구려·백제·신라가 본격적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전, 김천에서 일어난 감문국(甘文國) 또한 역사의 작은 페이지를 장식했다. 비록 신라에 복속되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지만, 김천 곳곳에 분포된 관련유적은 감문국이 누렸던 국가의 지위를 짐작게 한다. ‘감천 150리를 가다’ 29편은 김천의 ‘잊혀진 소왕국’ 감문국에 관한 이야기다.
#1 감천 물길 위에서 태동한 小國
백두대간에서 발원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감천은 구미 선산에 도착하기 전, 옛 감문국의 영역인 개령·감문면 일대를 지난다. 감문국은 기원전 3~5세기경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소국이다. 3세기 초 신라에 의해 멸망 당했다. 감문국은 감로국(甘路國)으로도 불렸는데, 감문국의 국호 ‘감문’과 ‘감로’는 김천을 가로질러 흐르는 감천(甘川)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의견이 향토사학계의 중론이다.
감문국은 외부세력이 아닌 토착민에 의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유물과, 개령·감문면 일대에 흩어져 있는 지석묘는 토착세력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준다. 감천 역시 감문국의 훌륭한 건국 기반이었다. 감천 중하류의 개령·감문면 일대의 비옥한 평야는 농업 생산력을 높여주었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옛 문헌에는 감문국의 규모와 영역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다. 동사(東史)에는 “아포가 반란을 일으키자 ‘삼십인’의 대군으로 밤에 감천을 건너려 했으나 물이 불어나 되돌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0인을 대군이라 표현한 것으로 미뤄봤을때, 감문국의 규모는 600~700가구(인구 4천여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인문지리서 신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의 기록은 감문국의 중심지를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감문국의 영향력은 아포읍과 지금의 김천시내에까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감문국이 등장한 국내 최초의 사료(史料)는 고려 중기의 학자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저술한 삼국사기(三國史記)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조 조분이사금 2년(231) 신라가 이찬 석우로를 대장으로 삼아 감문국을 토멸하고 그곳을 감문군으로 삼았다”고 쓰여 있다.
#2 신라 발전의 계기 제공한 감문국
감문국은 ‘친(親)가야 반(反)신라 정책’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구했지만, 결국 신라에 의해 짓밟힌다. 신라의 왕족이자 대장군인 석우로가 이끈 군대에 의해 망국의 운명을 맞이했다.
신라의 입장에서 감문국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서쪽에 추풍령을 두고 있는 감문국은 신라가 금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교두보였다. 또한, 남쪽으로는 가야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었다.
게다가 신라가 감문국을 정벌하면서 백두대간이라는 자연적인 방어벽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남아있는 신라와 백제의 국경 나제통문(羅濟通門)까지 신라의 영역이 확대됐다.
감문국을 정벌한 석우로는 화려한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는 신라의 10대 왕 내해이사금(奈解尼師今)의 아들이었다. 각간(角干, 신라의 최고 관직 중 하나) 수로(水老)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볼때 신라에서 석우로의 지위는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문국 토벌대장의 직을 맡은 석우로의 성정은 매우 거칠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우로의 거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야사에 전해지는데, 석우로의 군대와 맞서야 했던 감문국의 입장이 얼마나 다급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야사에 따르면 감문국을 정벌한 후 높은 벼슬에 오른 석우로는 일본사신을 맞이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거나하게 술에 취한 석우로는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말을 이어간다.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다. 석우로는 “머지않아 너희 나라(일본, 倭) 임금을 잡아다가 소금 만드는 노예로 삼고 왕비는 밥 짓는 노비로 삼을 것”이라며 사신을 조롱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석우로의 군대가 어떤 방법으로 감문국을 토벌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신라의 침략에 감문국이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산 압독국(押督國), 의성 조문국(召文國) 등 경북 일대의 소국들이 이미 신라에 편입된 상황이었고, 감문국 역시 신라의 공격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천 곳곳에 남아있는 옛 산성은 신라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감문국이 마련한 자구책이었다.(산성의 정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으나 향토사학계는 감문국 유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감천유역 일대의 평야가 감문국의 경제적 기반이었다면, 산성은 유사시 피난처의 기능과 함께 방어시설의 기능을 겸했다. 개령면 감문산의 감문산성(甘問山城)이 대표적인 산성 유적이다. 감문국 궁궐지로 추정되는 개령면 동부·양천리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감문산 정상부에는 인위적으로 축조된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감문산은 성황산(城隍山)으로도 기록돼 있다. 성벽을 뜻하는 ‘성(城)’자와 방어시설인 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파놓은 수로나 웅덩이)를 뜻하는 ‘황(隍)’이 합쳐진 이름으로 보아 감문산성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감문면의 속문산성(俗門山城)과 고소산성(姑蘇山城)은 감문국이 외부의 침입에 맞서려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천을 대표하는 농악인 빗내농악은 감문국이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섰던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빗내농악은 감문국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생겨난 농악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들이 전투를 위해 진을 만들고 풀어내는 모습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삼한 통일에 나선 신라를 막아내기에 감문국의 힘은 부족했다. 결국 대장군 석우로는 감문국 정복에 성공했고, 감천변의 소국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3 ‘금릉(金陵)’이 이곳에 있었네
신라는 감문국 정벌을 계기로 한반도 남동부에서 확고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한다. 이후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는 천년을 이어간 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반면, 신라에 국운융성의 기회를 제공한 감문국의 흔적은 초라하게 남았다. 나라가 없어진 지 1천700년이 지났기에 온전한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김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은 옛 소국의 흥망성쇄를 아련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감문국 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금효왕릉(金孝王陵)은 감문국의 대표적 유적이다. 지리서 조선환여승람에는 “(김천시 감문면)삼성동에 큰 무덤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감문국 금효왕릉이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삼성리의 언덕에 위치한 금효왕릉은 높이 5m, 너비 10m의 규모로 일반 봉분보다는 훨씬 크다. 안타깝게도 능의 관리상태는 좋지 않다. 비탈진 농경지 가운데에 위치한 능 바로 옆에는 최근 쓴 듯한 일반인의 묘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능의 일부는 무너져내린 상태다. 능으로 향하는 국도변에는 흔한 안내판조차 없어, 일반인들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다.
삼성리 주민들도 금효왕릉을 잘 알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이 능을 ‘말무덤’으로 부르며, ‘말(馬)’의 무덤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향토사학계는 이를 달리 해석한다. ‘말’이란 음절은 ‘크다’는 의미도 있는데 ‘말무덤’은 큰 수장의 무덤이라는 설명이다.
금효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금효왕릉이 감문국 시조의 무덤이라는 설과는 반대로 감문국의 마지막 왕이 금효왕이라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김천의 옛 지명인 ‘금릉(金陵)’이 금효왕릉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금효왕릉은 신라의 감문국 점령이후 세워진 토착세력의 무덤이라는 설도 있다.
감문국의 도읍이 있었던 개령면 일대에도 유적은 산재해 있다. 왕비무덤으로 알려진 장부인릉(獐夫人陵)과 궁궐연못인 동부연당(東部蓮堂)은 대표적인 감문국 유적이다. 하지만 장부인릉은 봉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해 주민들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 다행히 소공원으로 단장되어 있는 동부연당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옛 소국의 영화로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김천=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도움말= 문재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참고 문헌= ‘김천시사’, 경북 고도읍 역사문화 자원화 포럼 2007년 자료집 ‘감문국 재조명을 중심으로’
공동기획 : 김천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