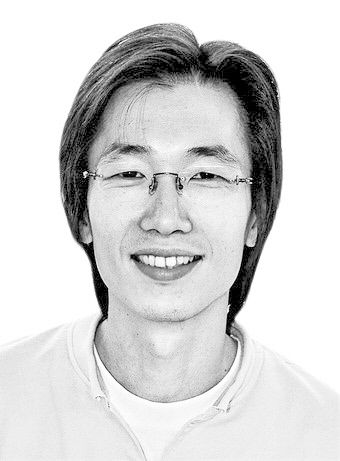 |
| 백승운 영남일보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장 |
퇴근길에 가끔 찾는 카페가 있다. 그날도 커피 한 잔을 들고 야외 테라스에 앉았다. 그때였다. '야옹'. 분명히 고양이 소리였다. 무심결에 옆을 돌아봤다. 테라스 옆 구멍 뚫린 벽이 눈에 들어왔다. 좁은 구멍 속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허리를 굽히고 귀를 기울였다. '야옹'. 분명했다. 고양이였다.
얼마 후 새끼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앙증맞았다. 눈동자는 빨다만 사탕처럼 빛났다. 걸음을 떼자 뒤꿈치를 감싸 들어 왔다. "녀석 겁도 없네". 발목을 파고드는 부드러운 감촉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다른 녀석이 또 보였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두 여섯 마리가 몰려들었다. 6형제였다(6남매, 6자매일 수도 있다). 잠시 후 어미도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길고양이였다.
필자 곁을 맴도는 6형제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제서야 녀석들이 지내 온 힘겨운 삶이 보였다. 눈에는 고름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뭉쳐 있었다. 검은 딱지가 들러붙은 얼굴은 엉망이었다. 살며시 몸을 어루만지자 갈비뼈가 도드라졌다.
'얼마나 굶었을까'. 편의점으로 달려가 주섬주섬 먹이를 사서 돌아왔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어미는 그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봤다. 새끼들이 배를 채우고 나서야 어미는 남은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애틋하고 애처로웠다.
그날 이후 '어쩌다 캣맘'이 됐다. 퇴근길에 맞춰 습관처럼 6형제를 보러 갔다. '나만 기다리는' 애처로운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다. 주위에서 먹이를 주지 말라는 요청이었다. 밤마다 울어대는 고양이 소리와 배변 탓에 피해를 보는 이들이었다. 양해를 구했다. 사정을 이해한 일부는 허락했다. 하지만 일부는 끝내 설득할 수 없었다. 이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죄인이 된 듯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저 여린 생명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다.
2주쯤 지났을 때였다. 녀석들이 드나드는 구멍이 벽돌로 막혀 있었다. 그 좁은 구멍은 유일하게 필자와 만날 수 있는 출입구였다. 6형제의 기척은 없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분노까지 일었다. 하지만 벽돌로 구멍을 막은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해야 했다. 그렇게 녀석들과 이별하고 말았다.
길고양이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동물복지와 혐오의 경계는 살벌할 정도다. 쥐약을 놓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니 말이다. 6형제 일을 계기로 알게된 이율리아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대표는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시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고양이는 이제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모두가 그들을 품어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지만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 희생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날 6형제의 울음 소리는 어쩌면 '같이 살고 싶다'는 외침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p.s- 6형제와 이별하고 며칠 후, 집 마당에 새끼 고양이가 들어왔다. 어미도 없이 혼자였다. 혹시 어미가 데려가지 않을까 해서 하루를 지켜봤다. 어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형제가 맺어준 새로운 인연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 식구로 받아들였다. 달밤에 만나서 이름은 '월이'라고 지었다.
백승운 영남일보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제보영상]대구 도로 한복판서 `싸움`…40대 남성이 70대 노인 폭행한 장면 SNS 공개돼 논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500152045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