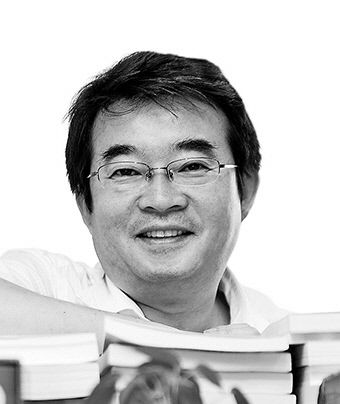 |
|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197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여름방학 숙제에 식물채집이 있었다. 식물의 뿌리까지 캐낸 다음에 깨끗이 씻어 말린 뒤 흰 종이 위에 붙여 제출하는 숙제 말이다. 해마다 열 종류쯤 되었던 것 같다. 그중에 아직까지 그 이름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식물이 '방동사니'다. 길쭉하고 반질반질한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올라오던, 잎사귀를 뒤로 젖혀 묶으면 왕관 모양이 되던 식물. 질경이가 아주 쓴 풀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그 이후 나는 식물을 잊어먹고 살았다. 식물보다는 동물원에서 만나는 동물들이 훨씬 신기했다. 식물은 그저 풍경의 배경이 되거나 자연물 중에서 미미한 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를 쓰면서 물고기들이 저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을 무슨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알게 되었다. 그때 봄날 밭둑에 드문드문 흐드러지는 하얀 꽃이 조팝나무 꽃이라는 것을 알았고,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에 나오는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 마타리를 알게 되었다. 식물을 찾아다니고 식물도감을 펼쳐보는 시간이 억새잎처럼 쭉쭉 늘어났다.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식물의 사생활' 서문은 나를 식물 가까이 바짝 끌어당긴 책이다. 식물은 볼 수 있고, 계산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시간을 잴 수 있고, 수를 셀 수도 있다는 유명한 몇 문장 때문이었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었다.
비록 얼치기이지만 지금은 식물에 관해 말해 보라면 몇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첫째, 식물도 사랑을 나눈다는 것. 동물의 암수처럼 식물도 암수가 있어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종족 번식을 위해 애를 태운다. 실제로 식물의 수분 과정을 현미경으로 보면 올챙이 형상의 수정체가 암술의 씨방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동물의 수정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걷지 못한다고 해서 식물이 하등생물인 것은 아니다.
둘째, 식물도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산에 많이 자라는 참나무류는 다른 나무에 비해 마른 잎을 늦게까지 떨어뜨리지 않는다. 새순이 돋을 때까지 잎을 달고 있는 감태나무는 겨울에 그 잎이 더 매끄럽게 느껴진다. 시계 덕분에 잎을 지상에 내려놓아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식물도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돕는다는 것.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리는 무성한 숲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고사리류와 이끼류가 보인다. 이들이 살아가도록 주변의 식물들이 습도를 조절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높은 산에 사는 함박꽃나무는 키가 큰 나무들이 반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생육이 왕성하다.
넷째, 식물도 자신의 나이를 안다는 것. 식물은 자신의 나이테를 몸속에 새겨두고 잊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가 큰 경기도 용문사 은행나무의 나이가 1천18살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우리는 1천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은행나무의 나이를 겨우 알았을 뿐이다.
이 밖에도 식물은 재채기도 할 것 같고, 서로 대화도 할 것 같고, 화를 내기도 할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다. 슬프면 우는 식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식물 앞에서 으스대거나 까불거나 잘난 체하면 안 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갖다버릴 때가 되었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제보영상]대구 도로 한복판서 `싸움`…40대 남성이 70대 노인 폭행한 장면 SNS 공개돼 논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500152045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