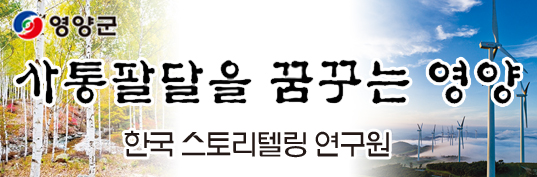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을 미술로 보지 않지만, 미술을 디자인의 한 형식으로 본다." 네델란드 디자인 그룹 익스페리멘틀 젯셋(Experimental Jetset)이 말했다. 이에 앞서 철학자 빌렘플루서(Vilem Flusser)는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대하여(About the word Design, 1993)'라는 글에서 예술과 기술의 배타적 이분화를 언급하며 두 영역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썼다.
'디자인은 어느 정도 예술과 기술이 (각자 가치 평가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동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준다'라는 비평은 디자인의 역할과 위상을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디자인과 미술 간의 복잡한 지형도 속에서 영국 디자인 비평가 릭 포이너는 '미술의 동생(2005)'이라는 글을 썼다. "우리의 목표는 미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에게 새로운 예술이라는 왕관을 씌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미술과 디자인은 가능성의 연속체로서 존재한다. 수많은 형식을 취하는 미술과 디자인의 양태 앞에서 그저 말로만 그럴듯한 융통성 없는 정의는 유효하지 않다." 미술과 디자인의 위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영국의 저술가 알렉스 콜스가 엮은 책 '디자인과 미술(Design and Art): 1945년 이후의 관계와 실천'(워크룸프레스, 2013)은 디자인과 미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36편의 글과 인터뷰를 다루고 있다. '디자인과 미술의 접점이 향하는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충실한 길잡이이자, 아직 이런 화두가 낯선 독자에게는 좀 더 수월하게 역사적 논의와 증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
| '정재완 북 디자인전'(2018년). |
지역에서 디자이너의 미술 전시(또는 디자인 전시)는 크고 작은 규모로 개인·그룹의 형태를 띠며 열린다. 대구시립미술관에서는 2013년·2016년 두 차례의 'DNA(Design & Art)'전시가 열렸다. 확장된 현대미술의 개념,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디자인의 미적·사회적 성취를 주목하며 '순수미술의 영역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차용하는 작가들과 공예·디자인의 영역에서 순수미술의 형식을 사용하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였다. 2018년 현대백화점 대구점 H갤러리에서 열린 '정재완 북 디자인전'은 입체로서의 책과 평면으로서의 지면을 나열하는 연출로 책의 구조를 전시 공간에 재현했다.
같은 해 경북대미술관에서는 '예술을 쓰다, 책을 그리다' 기획전이 열렸다. 전시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종합예술로서 책을 바라보며, 동시대 책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매해 여름 대구단편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diff n poster'는 디자이너가 단편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기획이다. 이 밖에도 디자인 전시는 가구와 세라믹 등 제품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 포스터 등 다양한 성격의 이미지 생산을 시도한다. 디자인이 미술에서 갈라져 나왔다거나 디자인과 미술이 전혀 다른 것(또는 닮은 것)이라는 저마다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미술을 향하고 미술이 디자인을 향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디자인과 미술의 관계 맺기 시도는 유효하다. 어느덧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는 진부한 논쟁은 더이상 (특히 관람객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 기획과 실천이 지역 문화예술계에 어떤 성과(또는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를 고민해볼 기회는 정작 마련되지 못했다. 여전히 대구의 문화예술을 말할 때, 디자인은 고려되지 않는다. 지역 문화예술인을 말하거나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논할 때 디자이너나 디자인 작품은 배제된다. 어쩌면 디자인을 상업 미술(미술이 아님) 또는 미술을 돋보이기 위한 부수적 산물쯤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시각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또 대개 디자인은 메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문화예술의 본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면 디자이너는 전시 포스터와 초청장을 디자인하고 책(도록)을 만든다. 작가의 작품을 재료로 전시장의 시각적 연출을 맡는 것이다. 영화나 음악 또는 뮤지컬 공연 때에도 비슷하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창작하는 결과물은 예술작품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술과 디자인의 보이지 않는 위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책 도록·포스터 등 디자이너 결과물
예술작품과 다른 하위 영역으로 치부
지역 예술 논할 때도 디자인작품 배제
보이지 않는 위계와 보수적 시선 깔려
메타적 성격 가진 문화 형태 인정을"
디자인이 부수적 산물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자체의 위상을 확실하게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예술출판은 작품 이미지를 모아놓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의 효용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때 디자인은 직접 발화하는 주체가 된다. 예술출판에서 책은 표현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 제도는 책의 내용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활자와 인쇄, 종이와 제본, 구성 방식과 레이아웃 등 책의 꼴 전체를 평가한다. 올해 선정된 사진책 '작업의 방식'(사월의눈, 2021)은 원고와 레이아웃의 순차적 위계를 무너뜨린 시도이다. 매년 10종의 책이 선정되어 독일 라이프츠히에 보내지는데, 2020년 디자이너 신신이 디자인한 엄유정 작가의 책 'Feuilles'는 세계 최고의 북디자인에 주어지는 'Golden Tree' 상을 받기도 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타이포 잔치)에서도 디자이너의 작품은 오롯이 주목받는다.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디자이너와 미술가, 기획자가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고유한 예술적 성취이다.
 |
우리 지역에도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예술의 산물은 셀 수 없이 많다. 가령 한국적 그래픽 미학을 추구했던 디자이너 이봉섭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광고 디자이너 이제석이 만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심 홍보장식물, 대구 최초의 아파트인 '동인아파트' 설계 도면 디자인, 북성로의 공구상/공업사 간판 디자인, 우후죽순 생겨나는 트렌디한 카페 브랜딩 등.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 미학 이외에도 작품 자체로서 여겨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카이빙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술과 디자인은 가족이자 절친이면서, 한때 영광을 누렸던 동지이자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였다. 산업화와 기술의 진화는 디자인이 (좀 더 친 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유망 분야라고 낙점하기도 했고, 기술의 포화 속에서도 미술이 (원본성과 투가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디자인은 동시대를 가장 투명하게 드러낸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릭 포이너는 좀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다. "디자인은 삶에 더욱 정교한 층을 구축하고 더욱 스펙터클하게, 더욱 구석구석 스며든다. 이제 미술보다는 디자인이 현 시대의 시각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디자인과 접촉하며 살아간다." 초학제·융복합이라는 화두 속에서 디자인이 갖는 메타적 성격, 협업의 덕목은 중요한 가치다. 디자인은 끊임없이 사물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미술과 대치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술에 편입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름답고 기능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할 뿐이다.
<북디자이너·영남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우동기 “이미 골든크로스 시작됐다” 단일화 없어도 승리 확신하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29.c59fdacb2e8145a89071d41b5d7c203b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