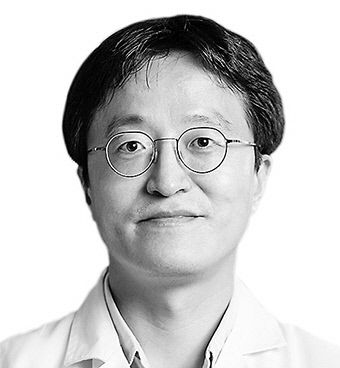 |
|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
1987년 노벨화학상은 특정 분자들이 서로 인식한다는 '분자 인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세 명의 화학자가 수상하였다. 그중 한 명인 프랑스의 장 마리 렌 교수는 물질의 복잡성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영역의 순으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물질 혹은 존재(thinking matter)'로 진화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궁극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문명의 진화와 함께했으며, 궁극적으로 화학 분자의 진화조차도 '지적인 진화'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체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숙고해볼 문제이다.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를 인위적으로 건드려 생명 현상조차 통제하겠다는 연구는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플라스틱의 분자조차 생애주기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평가되는데 이러한 복잡계의 인공적 진화는 예측이 쉽지는 않다.
19세기 미국에서 도로와 철도를 확장하며 국토를 개발할 때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도입하자, 존 헨리는 인간을 대표해 기계와 시합을 벌여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하였고 기어코 승리하였다. 하지만 그 승리의 끝에는 결국 그의 심장도 멎고 말았다. 이처럼 삶을 바꾸는 기술에 대한 기대와 반발심리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인공지능 기술도 결국은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변화의 구체적 예측과 대처 방식이 중점 문제일 것이다.
언어와 글자의 사용은 사고의 규칙과 함께 성장하였고, 종이와 인쇄 기술의 개발은 일부 지식층에게 국한된 고급 정보가 대중으로 흘러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 지식의 보급 주체도 여전히 소위 지식층이 점유하고 있었다. 결국 인터넷 보급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지식의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유도하였는데, 동시에 지식을 보급하는 주체도 제한된 지식층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놀랍게도 이공계 연구 생태계도 이 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인 신규 연구 결과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필자조차도 관련 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 내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따라잡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학습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 고전적 학습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 지능 기술의 현명한 보조는 부담감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어쩌면 인공지능의 의견을 '적극적 경청'으로 다시 논의한다면, 인간 학습자가 깊게 생각하는 과정이 결코 누락되는 학습 과정은 아닐 것이다.
한편 인공 지능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얼마나 성장하고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 지능의 보급이 부추길 에너지 사용의 급증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이다. 무수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 지능 기술은 기존의 검색 엔진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용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환경에 치명상을 줄 것이다. 정보 기술이 보다 선택에 조금 더 가깝다면, 환경과 에너지 기술은 필수다. 과거 중화학공업이 야기한 환경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와 기술이 뒤늦었다면, 정보기술이 야기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